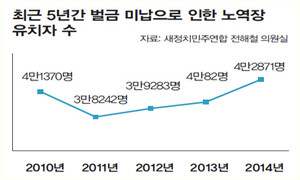*세월호 생존자 신민혁(가명)군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쓴 가상 이야기입니다.“8시52분이었어. 게임방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배가 기우뚱하다가 한순간 넘어가더라고. 오뚝이처럼 말이야. 배 안의 물건이 마구 떨어지고 사람들이 나뒹굴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
많은 친구를 잃어버린 오빠는 그날을 기억하기 싫어했다. 나도 오빠에게 그날을 묻지 않았다. 오빠의 마음을 들쑤시며 그날을 캐묻는 어른들과 같은 사람이 되기 싫었다. 그래도 그날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기는 했다. 즐겁게 수학여행을 떠난 언니·오빠들이 왜 배에 갇혀 돌아오지 못했는지, 아빠·엄마는 왜 1년째 거리에서 경찰과 악다구니를 쓰는지 나는 궁금했다. 달싹거리는 입술을 꼭 깨물며 참았다. 그런데 오빠가 느닷없이 먼저 말을 꺼냈다. 봄꽃은 흐드러지고 봄볕은 따사로운 2015년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아빠·엄마가 머리를 깎던 날이었다.
많은 친구를 잃어버린 오빠는 그날을 기억하기 싫어했다. 나도 오빠에게 그날을 묻지 않았다. 오빠의 마음을 들쑤시며 그날을 캐묻는 어른들과 같은 사람이 되기 싫었다. 그래도 그날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기는 했다. 즐겁게 수학여행을 떠난 언니·오빠들이 왜 배에 갇혀 돌아오지 못했는지, 아빠·엄마는 왜 1년째 거리에서 경찰과 악다구니를 쓰는지 나는 궁금했다. 달싹거리는 입술을 꼭 깨물며 참았다. 그런데 오빠가 느닷없이 먼저 말을 꺼냈다. 봄꽃은 흐드러지고 봄볕은 따사로운 2015년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아빠·엄마가 머리를 깎던 날이었다.

따사롭던 날 오빠가 입을 열었어
2014년 4월16일, 화창한 봄날이었다. 바다는 잔잔하고 태양은 눈부셨다. 전날 인천에서 출항할 때 자욱했던 안개는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밤 9시에 인천항을 떠난 세월호는 밤새 달려 아침 8시30분 전남 진도 맹골수도를 지나고 있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물살이 센 곳이었다. 배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확 돌았다. 급히 유턴하는 자동차 같았다.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놀다가 오빠는 느긋하게 일어났다. 지갑을 갖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 배가 출렁였다. “8시52분이었어.” 오빠는 그 시간을 정확히 기억했다. 배가 오른쪽으로 순식간에 회전했고 배는 왼쪽으로 기울었다. 그때 화물이 우르르 쏟아져내렸다. 원래 자동차나 화물은 배에 실을 때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묶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꾸역꾸역 하나라도 더 밀어넣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창밖을 보니 컨테이너 같은 게 바다에 떠다니는 거야.” 오빠는 신발과 양말을 벗고 벽에 튀어나온 부분을 밟고 올라가 복도로 나왔다. ‘기다려라’ ‘대기하라’는 방송이 나온 게 그때부터였다. “현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하게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면 위험하오니 움직이지 마시고 잡을 수 있는 봉을 잡고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도에 있던 친구들은 그 방송을 듣고 벽에 기대어 앉아 기다렸다. 큰 배를 타면 으레 있는 일이라는 듯 노래를 부르고 휴대전화 동영상을 찍었다.
“더 기울어졌어.”
“웃을 상황이 아냐! 실제라고!”
“구명조끼 꺼내야 될 것 같아.”
“물 들어오면 존나 재밌겠다.”
“셀카 찍어야지.”
“이거 뉴스 뜬다.”
“안 떠. 침몰 안 하면.”
“침몰하는데.”
“안 할 거야, 안 해야 해.”
배가 기울어졌을 때 창밖을 봤던 오빠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눈치챘다. 하지만 친구들이 겁먹을까봐 말하지 않았다. 그냥 혼자 방을 돌아다니며 구명조끼를 꺼냈다. 그걸 문 밖으로 던져 친구들에게 입게 했다. 장난치듯 구명조끼를 주고받았지만 오빠의 심장은 방망이질을 해댔다. 20분간 그러다 왼쪽 갑판을 얼핏 보았다. 바닷물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그때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렸다. “헬리콥터가 와!” 한 친구가 소리쳤다. “후유~.” 다른 친구들도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기다려도 경찰은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배가 자꾸만 더 많이 기울었다. 어른들이 먼저 탈출을 시작했다. 배에서 빠져나가려면 암벽등반을 하듯 올라가야 했다. 방송에선 ‘가만있으라’고 했지만 먼저 올라간 아저씨들은 탈출해야 한다고 했다. 커튼을 뜯어서 로프를 만들어 아래로 던져줬다.
“방송했으면 우리 모두 다 나왔을 거야”

‘그래, 탈출하자’, 오빠는 생각했다. “헬기 탈 수 있는 사람 손들어!” 오빠가 물었다. 몇몇 친구가 겁먹은 얼굴로 손을 들었다. 그 친구들의 허리에 커튼을 묶어서 한 명씩 올려보냈다. 그때마다 왼쪽 갑판을 보았다. 바닷물이 꾸역꾸역 밀려오고 있었다. 마침내 출입구 쪽까지 물이 찼다. 배 안으로 바닷물이 쏟아졌다. 오빠는 마지막 로프를 타고 탈출했다. “탈출하라고 미리 방송했으면 우리 모두 다 나왔을 거야.” 오빠는 슬퍼 보였다.
“선장이랑 경찰은 어디 있었어? 왜 탈출하라고 안 했어?” 나는 물었다.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이었다. 오빠는 얼굴을 손으로 비볐다. “몰라, 나도.”
오빠가 친구들을 커튼에 묶어 탈출시키던 그 시각, 선장은 이미 구조돼 있었다고 했다. 승객을 구조하러 온 경찰배를 가장 먼저 잡아탄 사람이 선장이었다. 선장은 “공황 상태에 빠져서” 승객을 버리고 도망갔다. 경찰배에 타서도, 병원에 입원해서도 ‘나는 선장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끝까지 모른 체했다.
공황 상태가 뭐지? 휴대전화로 국어사전을 찾아봤다.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름.’ 아니, 무서웠다고? 가라앉는 배에서 17살인 우리 오빠보다, 70살인 선장이 더 무서웠다고? 오빠는 태어나 처음 배를 탔고, 그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배를 탔는데? 묻고 싶은 질문이 입속을 맴돌았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장군이 무섭다고 먼저 도망치면 졸병은 어떻게 해야 하지? 장군이 도망친 것도 모르고 졸병이 열심히 싸웠다면 그건 용기 있는 걸까, 바보 같은 걸까?
선장은 재판을 받는 중이다. 그는 승객을 내보내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부하 몇 명도 그 명령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배를 탔던 승객은 단 한 명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오빠도 그랬다. 배에 있던 방송기계가 바닷물에 젖어서 고장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나왔다.
아빠·엄마는 선장을 “살인자”라고 불렀다. 침몰하는 배에 수백 명을 남겨두고 혼자 도망쳤으니 살인자가 맞다, 나도 생각했다. 그런데 첫 번째 판사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했다.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였기 때문이란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실수라서 36년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판사는 살인자라고 인정했다. 고층 빌딩에 불이 나서 소방관이 출동했는데, 그 소방관이 사람을 구하지 않고 먼저 헬기를 타고 탈출한 것과 같다고 했다. 살인자가 된 선장은 평생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경찰은 왜 언니·오빠들을 구하러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가라앉는 배로 들어가는 게 무서웠다면 소리라도 지르면 되지 않았을까. “밖으로 나오세요, 탈출하세요.” 경찰배에는 커다란 스피커도 달려 있었다.
“당황해서 방송하는 걸 깜빡 잊었어요.”
경찰배에 탄 경찰이 말했다.
“배 안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헬기에 탄 경찰이 맞장구쳤다.
“가라앉는 배 안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경찰들이 한목소리로 답했다.
어른들이 참, 뻔뻔하다. 우리 학교 운동장 2개 크기만 한 배가 뒤집어져서 가라앉고 있는데, 잊었어요? 몰랐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 거짓말을 믿으라고? “그게 진실일까봐 나는 두려워.” 오빠가 말했다. “그러면 나도, 너도 또 사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
나도 무서워졌다. 배가 침몰하는데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으면…. 나는 오빠의 손을 잡았다. 오빠도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아빠·엄마가 있는 광화문광장으로 걸어갔다.
“날고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니?”

“내 손 놓친 걸 미안해하고 아파하는구나.
네 잘못도 아닌데.
네가 학교 친구들과 촛불을 들었을 때, 여의도로 행진할 때 나도 함께했단다.
네가 든 노란 우산에, 네 가방에 매달린 내 이름표에, 국회 담장에 묶어놓은 깃발에 내가 있었어.
그만 눈물을 닦고 하늘을 봐.
리본으로, 나비로, 바람개비로 날고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니?
두고 봐. 나와 우리 모두가 언젠가 세상을 바꿀 함성으로 훨훨 날아오를 테니까.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내봐.”
-백승남, ‘사랑하는 너에게’()에서
글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일러스트레이션 김선배·조경희·김원주
일러스트레이션 김선배·조경희·김원주
맨위로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사법부’

한동훈 “윤, 계엄 안 했으면 코스피 6천”…민주 “안 놀았으면 만점 논리”
![조희대 대법원, ‘이재명 사건 배당 절차’ 조작 증거 나왔다 [논썰] 조희대 대법원, ‘이재명 사건 배당 절차’ 조작 증거 나왔다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7/53_17728408840037_20260306502691.jpg)
조희대 대법원, ‘이재명 사건 배당 절차’ 조작 증거 나왔다 [논썰]

나경원 “‘오세훈 징계 정지’ 원칙 어긋나…안 좋은 평가, 본인 반성부터”

60살 이상, 집에서 6천보만 잘 걸어도 ‘생명 연장’…좋은 걷기 방법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7/53_17728477491692_20260305504002.jpg)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

트럼프, 이란 초등학교 175명 폭사에 “이란 소행”…증거는 제시 안해

두바이 재벌, 트럼프 직격 “전쟁에 우릴 끌어들일 권한, 누가 줬냐”

말 바꾼 트럼프 “쿠르드 ‘이란 들어갈 의지'…나는 거절”

인천 빌라촌 쓰레기 봉투서 ‘5만원권 5백장’…주인 오리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