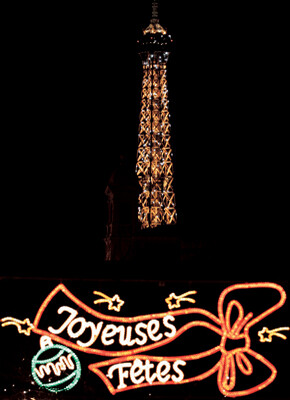한국어에 침묵의 묘미가 있다면 프랑스어엔 비판의 묘미가…개인주의와 다양함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절한 언어임이 틀림없어
▣ 파리=이선주 전문위원 koreapeace@free.fr
“프랑스어를 왜 배우게 되었느냐고요? 그건 순전히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도 짝사랑 때문에. 뒤라스, 사르트르, 카뮈, 데리다…. 그러고 보니 데리다는 그때까지 읽어보지도 않았네요. 어쨌든 그런 작가들의 글을 좋아해서 프랑스어에 관심을 가졌으니, 그야말로 가슴 아픈 짝사랑 아니겠습니까?”
“으이그, 입만 살아가지고…”
까르푸가 한국에 가서 산전수전을 겪기 한참 전에 프랑스에 온 나는 체류 초기 대형마트에서부터 문화적 충격에 시달렸다. ‘Chat’(고양이)라는 상표가 그려진 비누 앞에서 ‘프랑스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많이 기른다던데, 이거 혹시 고양이용 비누 아닐까’ 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설프게 알고 있던 지식에다, 한국식 반응이 보태져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온 저는 도저히 어르신에게 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싸가지 없게 내 것, 네 것 하지 않고 우리 것이라고 해요.”
한국식 문화 태도는 뼛속에 배어 있는 듯 불쑥불쑥 나타나 프랑스 문화에 적응하는 데 제동을 걸곤 했다. 그런저런 세월을 보낸 지금, ‘프랑스어’에 대해 글을 쓰려니 감회가 새롭다.
흔히들 프랑스어를 ‘아름다운 언어’라고 말한다. 프랑스어의 우수성을 들먹이기도 한다. 한데 사실 이런 표현 자체가 상당히 한국적이다. ‘우수하다’는 건 따지고 보면 우열의 개념인데, 도대체 무엇에 기반해서 ‘다짜고짜’ 프랑스어의 우수성씩이나 논한다는 말인가?
아나톨 프랑스는 “의심조차도 의심하라”고 말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오랜 프랑스 생활에서 느는 건 따지는 태도다. 우리 언어 문화가 침묵의 묘미를 가진다면, 프랑스어는 따져보고 헤아려보는, 말의 비판적 묘미를 가진다. 그렇다고 두 언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이런 성격이 적절히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한참 떠들고 있는 프랑스인 앞에선 ‘입만 살아가지고…. 아, 그걸 모두 말로 해야만 알아듣나!’ 싶어지고, 말을 얼버무리는 한국인 앞에선 ‘내가 자긴가. 말로 안 하면 어떻게 아누!’ 하고 싶어진다.
명료하지 않으면 프랑스어가 아니라는 말을 들어본 독자들도 계실 줄 안다. 볼테르도 “프랑스어의 뛰어난 점은 그 명료성에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언어가 한 사회 속에서 유통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그 사회와 함께 변해가는 ‘유기체’라는 점을 상기하면, 그 사회에서 가장 명료한 언어는 그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일 것이다. 모든 것엔 정답과 우열이 있다고 여기는 한국 문화와 달리 모든 건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프랑스에선 ‘사데팡’(경우에 따라 다르다)이란 표현을 즐겨 쓴다. 문화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당 사회에서 적절히 쓰일 때 그 묘미를 발휘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프랑어는 개인주의와 다양함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절한 언어임이 틀림없다.
우쭐대는 프랑스인이 조금 부럽기도
이런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프랑어의 ‘특수성’을 논한다면, 무엇보다 언어에 대한 지식인들의 역할을 꼽을 수 있다. 프랑스어의 아름다움은 프랑스 지식인들이 사랑하고 가꿔온 언어이기 때문이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뭐니?”라고 묻고는 ‘모국어’라고 말하며 우쭐대는 프랑스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조금 부러워지는 게 사실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내부 결속도 안되는데…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다른 세력 손잡아야”
![하루 5분 ‘한 발 서기’로 건강수명이 달라진다 [건강한겨레] 하루 5분 ‘한 발 서기’로 건강수명이 달라진다 [건강한겨레]](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14/53_17710435306389_20260211504219.jpg)
하루 5분 ‘한 발 서기’로 건강수명이 달라진다 [건강한겨레]

‘국회 위증’ 혐의 로저스 쿠팡 대표, 66억원 주식 보상받는다

이 대통령 “공직자는 24시간 일하는 것…퇴근이 어디 있나”

기상 악화에도 “치킨은 간 모양이네요”…이 대통령, 연평도 해병대 격려

전임자도 “반대”…이성윤 ‘조작기소 대응 특위 위원장’ 임명에 민주당 발칵

롯데 “나승엽·고승민 등 대만서 불법 도박장 출입…즉각 귀국 조치”

미국, ‘수주 동안의 이란 공격 준비’…이란 반격도 전면적·장기화 예상

‘마스가’ 청사진 공개…‘미 조선업 부활’ 계획, 초기 선박은 한국서 건조

이 대통령 “집 팔라고 강요 안 해…투기 대신 선진국 수준 시장 만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