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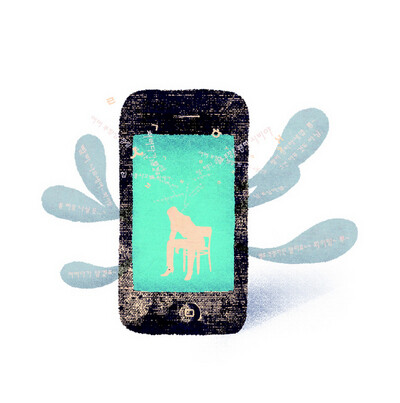
일러스트 조승연
나는 외롭지 않다. 친구가 많으니까. 그것도 전국 방방곳곳에. 아니, 전세계에. 손안에 세계의 친구들이 들어 있고, 난 언제나 어디서나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 때로는 실제 만나기도 하지만, 만나는 것보다 이런 짤막한 소통이 더 많다. 만나서 수다를 떨기에는 너무나 바쁘고,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귀찮기도 하고.
“늘 핸드폰을 쥐고 사네.”
회사 상사의 잔소리를 듣고 조용히 웃어넘기지만, 짜증이 나서 또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 토로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다. 친구들은 늘 나를 감싸주고 이해해주며, 내 편이 되어주는데, 심지어 유용한 정보까지 공유해주는데, 내 옆의 차장님은 뭐 하나 도움이 되는 게 없다. 이런 걸 세대 차이라고 하는 걸까? 뭐 하나 아는 것도 없으면서 시대에 뒤떨어져 잔소리해대는데, 그렇게 꼴 보기가 싫다.
[우리 차장님 또 잔소리 시작~ -_-]
잽싸게 글을 올려놓고 속속 올라오는 위로 댓글에 답을 하며 일도 척척 해내고 있다.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인다. 회사는 정말 꽉 막혔다. 조금 더 편하고 자유롭게 일하면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얼마나 좋겠냐마는, 아무래도 또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사들은 다 고리타분할 뿐이니, 잠자코 일하는 척하는 게 최고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겠지.
잠깐 일을 하다가 핸드폰을 열어보니 그새 또 많은 글이 올라와 있다. 친구들의 이야기에 항상 귀기울이며 꼼꼼하게 챙기는 내 모습에 다들 자상하다고 말한다. 실제로는 자상하다는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오히려 무심하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나지만, 여기서 나는 또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한다. 그래, 나도 자상한 사람이다.
이 세계의 장점에 대해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정치 이야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물건 구입시 유용한 정보들, 때로는 누군가를 찾거나 도와주는 일에 모두들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상적인 세계. 세상은 참 따뜻하다. 그리고 작은 일 하나에 고마워 하는 그런 세상. 친구들·가족들에게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과는 할 수 있다. 역시 사람이 그리웠나 보다. 정말 사람 같은 사람이.
“저기요, 앞 좀 보고 다니세요.”
“네, 죄송합니다.”
퇴근길, 그사이 올라온 글을 보며 답글을 달아주다가 마주 오는 사람과 부딪혔다. 앞을 보지 않은 건 마찬가지면서…. 생각해보니 화가 난다. 또 핸드폰을 들었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다. 내 잘못도 아닌데….]
역시나, 기다렸다는 듯 줄을 잇는 글에 나는 또 답글을 달아준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잠들 때까지 핸드폰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이 많은 친구들과의 소통 때문이다.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끊임없는 새로운 주제가 나온다. 신기하기도 하지. 무언가에 이렇게 집중해본 일도 없는데.
[요즘 연락도 없냐? 잘 지내?]
한창 폰을 가지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 녀석의 안부 문자가 왔다. 그냥, 확인만 하고 답은 하지 않는다. 지금은 그것보다 ‘그냥’이라는 아이디의 동생과 이야기하기 바쁘다.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기에 달래주는 중이다. 친구야 나중에 다시 연락하면 되겠지만 우울한 사람 달래주는 일이 우선이니까. 우선순위와 친밀도를 따지자면 지금 소통하고 있는 친구가 우위이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해 가는 골목길이 스산하다. 또 핸드폰을 들어 짤막하게 글을 남겨본다.
[역시 이 골목은 무서움…ㅋㅋ]
사진까지 첨부해볼까 해서 카메라로 전환해서 찍으려는 순간 뒤통수가 아파오면서 정신이 조금씩 흐릿해진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인 걸까? 눈앞으로 떨어지는 핸드폰이 보인다. 그러고 보니 아까 우리 동네 이름이 언급되면서 퍽치기가 유행이라는 말을 보았다. 당한 걸까? 친구들에게 알려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손가락을 움직일 수가 없다. 눈이 감긴다.
알고 있다. 그들과 소통할수록 주변과 단절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지금 날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작은 화면에 갇혀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도 그 안에 갇혀버렸다는 것을.
나는 외롭지 않다.

어느 날, 친하게 알고 지내던 동생이 “이런 걸 한다더라” 했을 때, ‘한번 해볼까? 글 쓰는 거 좋아하니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전송한 글이 이렇게 당선돼 돌아왔을 때는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글을 보내본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당선된 것도 처음인지라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던 감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받아도 되는 걸까?’ 하는 근심으로 변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었고, 누구에게도 숨기고 싶은 마음의 갈등으로 혼자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처음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옆방에서 과제를 마치고 막 자려고 누운 남동생이었습니다. 무덤덤했지만 따뜻했던, “그래? 잘됐네”라는 말이,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안도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공모 사실조차 몰랐던 가족이 당선 사실을 알고서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줘, 항상 혼자만 써내려간 글이 이제는 외롭지 않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나가는 제 글도, 그리고 앞으로 써나갈 글도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처럼, 그저 누군가에게 작은 미소를 주고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글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357343273_20260222501198.jpg)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어디서 본 듯한’....국힘 이정현 야상 점퍼 ‘시끌’

태진아 “전한길에 법적 대응”…일방적으로 콘서트 참석 홍보·티켓 판매

최시원, 윤석열 선고 뒤 “불의필망”…논란 일자 SM “법적 대응”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0/20260220502864.jpg)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이 대통령, 인천시장 출마 박찬대 글 공유하며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환영”

“당 망치지 말고 떠나라”…‘절윤 거부’ 장동혁에 쏟아지는 사퇴 요구

미, ‘무역법 301조’ 관세 예고…한국에도 새 위협 될 듯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1/53_17716543877486_20241013501475.jpg)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