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중숙의 사이언스크로키
생물은 환경 및 다른 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각자 살아갈 길을 찾아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특성을 만들어 살아가는 데 유용하게 쓰일 무기로 삼는다. 이에 관한 예는 너무나 많은데, 사실 생물의 모든 종 하나하나가 고유의 예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그 기능도 매우 정교하다. 오늘날 과학 발달에 힘입어 생물체의 기능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진 기계들도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아직 흉내는커녕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것도 수없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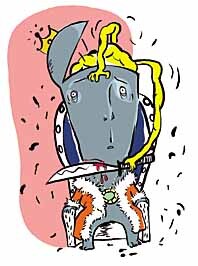
이처럼 다양한 생존 무기들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육체적 힘이다. 그리고 진화 역사상 수중 동물을 제외한다면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동물은 공룡이다. 물론 공룡도 본래부터 그렇게 큰 동물은 아니었으며, 처음에는 몸 크기가 1m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서히 몸집을 늘려가더니 마침내 전무후무한 최대의 육상동물이 되었다. 공룡은 이런 덩치와 힘을 바탕으로 1억년 넘게 지구를 지배했다. 그러나 이런 특성들이 모든 면에서 생존에 유리한 것은 아니었다.
현재 공룡 멸종에 관한 설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운석충돌설이다. 이를 보면 운석의 ‘충돌’이라는 직접적 피해보다는 그 뒤에 닥쳐오는 ‘먼지 겨울’이 더 치명적이다. 충돌 때 생성된 엄청난 양의 먼지가 하늘을 뒤덮어 햇빛을 차단함으로써 여러 해 동안 추운 겨울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커다란 몸집이 오히려 불리하며 작고 민첩한 동물의 생존 가능성이 더 커진다. 실제로 인류의 아득히 먼 조상인 초기 포유류는 바로 이 겨울을 버텨낸 작은 쥐와 같은 모습의 동물이었다. 마이크 타이슨은 헤비급 복서 치고 몸집이 작은 편이다. 그러나 그는 공룡처럼 우람한 체구의 복서들을 차례로 때려눕히면서 “덩치가 크면 쓰러질 때의 소리만 더 클 뿐이다”라고 거침없는 호기를 부렸다. 그의 말은 마치 거대한 공룡들의 갑작스런 몰락을 극적으로 표현한 듯한 흥미로움을 전해준다.
공룡의 멸종 후 지구상의 생태계는 이른바 춘추전국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생물의 종은 더욱 다양해졌지만 어느 한 종이 뚜렷한 패권을 잡지 못했다. 그러다가 약 300만년 전에 출현한 인류가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생물계의 족보에서 맨 끝에 이름을 올린 이 막내둥이는 육체적 힘이 아니라 정신적 힘인 ‘지성’이란 무기를 개발했다. 그리하여 역사상 최단 기간에 최고의 지배력을 확립했다. 그러나 이 무기라고 해서 완전하다는 보장이 있을까?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마틴 리스 교수는 과학의 발달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확률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환경파괴,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이용한 테러, 유전공학의 오류 또는 고의적 조작에 의한 치명적인 병원균의 유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기계들의 반란 등을 예시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위험들이 모두 내부 요소란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인류는 역사상 그 생존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자기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존재이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는 말이 있지만, 먼 훗날 인류 이후의 존재는 인류의 멸망을 ‘자살설’이란 명칭으로 부를지도 모른다.
고중숙 | 순천대학교 교수·이론화학 jsg@sunchon.ac.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3/53_17733793058302_20260313501532.jpg)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

트럼프 “이란 완전히 파괴 중…오늘 무슨 일 벌어지는지 보라”

이정현 국힘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생각한 방향 추진 어려워”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아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길”…60일된 딸 둔 가장 뇌사 장기기증

미 공중급유기, 이라크 상공서 추락…“적군 공격·오인사격 아냐”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이하상 “특검 안 나온 재판은 불법” 트집…재판장, 17초 만에 “기각”

“이정현 전화는 꺼져” 장동혁, 오세훈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