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의 이름으로 탈북 행로 되밟은 4인의 다큐멘터리 …‘진짜’ 주민등록증 품고도 아직은 불안한 여행하며 각자의 상처를 씻다
▣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 사진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설레지만 불안한 여정이었다. 탈북자로 걸었던 길을 새터민으로 다시 갔다. 아직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혹시나 중국 공안에 잡히지 않을까. 아픔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돌아보고 싶지 않은 마음과 그래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다투었다. 그렇게 신영옥(16), 정비나(19·가명), 전광혁(21), 정훈(19·가명)씨는 길을 나섰다. 그들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의 리포터를 맡은 영옥씨는 다큐의 시작에서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여행자이자 기록자였다. 자신들의 길을 스스로 기록했다. 광혁씨가 감독을 맡아서 여정을 기록했고, 영옥씨가 리포터로 여정을 안내했다. 비나씨와 정훈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들이 다니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셋넷학교’의 교사들이 길동무로 나섰다. 셋넷학교는 2005년 을 제작했다. 탈북인 양미씨가 자신이 살았던 중국으로 찾아가 4번이나 공안에 잡혀가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냈던 시절을 돌아보는 다큐멘터리였다. 2006년 8월, 이번에는 4명의 탈북인이 길을 나섰고, 기록은 가 되었다. 그들의 여정은 차마 응시하지 못했던 과거를 카메라로 들여다보는 치유 여행이었다. 박상영 셋넷학교 대표교사는 “맺힌 한을 풀어내는 씻김굿”이라고 말했다.
국경에서 밀려드는 체포의 공포
비로소 국경의 북쪽에 섰다. 두만강 너머 고향이 내려다보였다. 중국 투먼에서 아버지가 있는 고향을 보면서 비나씨가 말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한국에 다시는 안 갈 거예요”라고. 중국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가족을 따라 건넜던 강이다. 산 넘고 물 건너 찾아간 남한도 낙원은 아니었으므로 그리움과 회한이 동시에 밀려들었을 것이다. 비나씨는 옌볜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바로 앞에다 두고 고향에 갈 수 없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없다”고 울먹였다. 열 살 갓 넘어 부모를 잃고 혼자서 탈북한 ‘씩씩한 영옥씨’도 그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고향을 내려다보면서 “저기 하얀 길 있잖아요”라며 추억을 더듬었다. 고향을 그리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해주지 않는 남쪽 사람들의 각박한 마음에 대한 섭섭함도 내비쳤다. 나중에 셋넷학교에서 만난 영옥씨는 “건너가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그래도 누군가 기다릴 것 같다는 애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그들은 묻어둔 상처를 꺼내서 햇볕에 말렸다.
조·중 국경에 다녀오는 길에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졌다. 중국 국경수비대에 검문을 당한 것이다.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넘어갔지만 공안에 쫓기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다. 유난히 신변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광혁씨는 “검문을 받을 때 다리가 꺾였다”고 돌이켰다.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어도 여전히 체포의 공포는 그들을 괴롭혔다. 하지만 고통을 외면하면 고통은 더욱 커지는 법이다. 그들은 길 위에서 탈북자로 겪었던 고통을 응시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공포는 잦아들었다. 나중에는 중국 공안에게 다가가 농담을 할 정도로 용기가 생겼다. 비로소 상처의 딱지를 벗겨낸 것이다. 옌지(延吉)에서는 즐거운 추억에 잠겼다. 대부분 사춘기를 중국에서 보낸 그들에게 중국은 제2의 고향이다. 영옥씨는 어릴 때 다녔던 학교 앞 문방구를 찾아서 추억을 더듬었다. 옌지 서시장은 추억의 보고였다. 스무 살 안팎의 청년들은 예전에 먹었던 우유를 ‘빨면서’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비나씨는 나중에 “어릴 때 엄마와 함께 먹었던 순대를 다시 맛보아서 너무 좋았다”고 돌이켰다. 여행 기간 ‘20일, 치유할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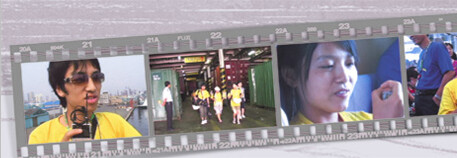
"며칠 굶고도 진수성찬 외면하는 기분"
이들의 여정은 ‘동북아 평화 대장정’도 겸하고 있었다. 옌지를 떠나서 베이징으로 향했다. 베이징에서는 외국인들을 만났다.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그들은 반드시 물었다. “남이냐 북이냐.” 질문을 받자 이들은 ‘노스’인지, ‘사우스’인지 헷갈렸다. 영어가 서투른 탓도 있지만, 그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들의 카메라는 그렇게 그들의 어제와 오늘도 함께 담아냈다. 다큐의 초반에 카메라를 피해다녔던 정훈씨도 베이징에서는 앞장서 외국인들에게 질문을 던질 만큼 용감해졌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감을 얻어갔다. ‘평화를 한마디로 무엇이냐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서 이어진 그들의 동북아 대장정은 베이징을 거쳐 울란바토르에서 끝났다.
돌아와 그들은 편집도 스스로 해냈다. 30시간에 이르는 기나긴 기록을 47분으로 줄여서 를 완성했다. 그렇게 돌아본 여정은 그들에게 그 후로도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았다. 영옥씨는 “여행이 덥고 힘들었다”면서도 “가기를 잘했다”고 돌이켰다. 그는 고향을 눈앞에 두고 가지 못하는 심정을 “며칠을 굶은 사람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다. 비나씨는 “연길을 떠날 땐 아직 나의 추억을 다 못 보았기 때문인지 너무 아쉬웠는데…”라고 여행일기에 썼다. 함경북도 은성이 고향인 광혁씨는 두만강에서 고향마을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 그는 14살부터 20살까지 중국에서 사춘기를 보냈지만 옌지에서 한 시간 떨어진 왕청에 살아서 제2의 고향에도 들르지 못했다. 광혁씨는 “언젠가 왕청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며 아쉬워했다. 고향이 황해남도 개성인 정훈씨는 “판문점에서 망원경으로 고향을 보았다”고 위안했다. 아직도 공포는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혼자서 (조·중 국경에) 가기는 무섭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 주제는 ‘남한에서 겪은 차별’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응시할 기억이 남았다. 영옥씨는 “중국 국경에서 하루 종일 걸어서 캄보디아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는데 대사관 직원이 ‘돌아가라’고 말했다”며 “그래서 또 하루를 꼬박 울었다”고 돌이켰다. 그제야 대사관 직원이 영옥씨 일행을 은신처로 안내했다. 언제나 유쾌한 영옥씨는 “그때 너무 걸어서 다리가 굵어졌다”며 웃었다. 내년에 대학생이 되는 비나씨는 “아직도 지하철을 타면 멀미가 난다”며 남한 생활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기도 했다. 의 감독을 맡아서 편집을 끝낸 광혁씨는 “작품을 끝내서 뿌듯했다”며 “기회가 닿으면 또 다른 작업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셋넷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박상영 교사는 “다음에는 남한에서 겪은 차별을 담은 영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영옥씨는 광혁씨와 연인 사이다. 다큐에서도 그들의 관계는 솔직하게 드러난다. 영옥씨는 광혁씨에게 “(중국에서) 첫사랑 만나지 마라”며 귀엽게 경고하고, 때때로 “놀아달라”며 칭얼거린다. 그리고 기나긴 여정의 끝에 정훈씨는 비나씨와 ‘각별한 친구’가 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에는 다투면서 의지하는 그들의 ‘귀여운’ 모습도 담겨 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곽종근만 포기…군 ‘내란 연루’ 주역 23명, 국방부에 항고

한미연합사단 한국 부사단장에 첫 여성장군 문한옥 준장 취임

홍준표 “구청장에 발리는 오세훈…‘서울시장 5선→당권도전’ 방향 틀었나”

“‘이재명 죽이기’ 쌍방울 변호인을 특검 추천…정청래 지도부 제정신이냐”

‘쌍방울 변호인’ 특검 추천 정청래 “검증 실패로 이 대통령에 누 끼쳐 죄송”

‘내란 재판’ 지귀연, 서울북부지법으로…법관 정기인사

‘명태균·김영선 무죄’ 판사, 기업서 국외 골프여행비 받아 약식기소

미국 민주당, 트럼프 정부 ‘고려아연 등 광물기업 지분 인수’ 진상조사

“그럼 평생 관저 살라는 거냐?”…‘대통령도 집 팔라’는 국힘에 민주 반박

“비관세 장벽 없애라”…미국, 정통망법·쿠팡 문제 등 전방위 압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