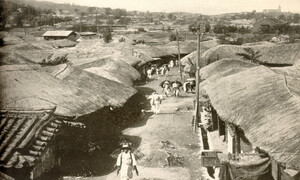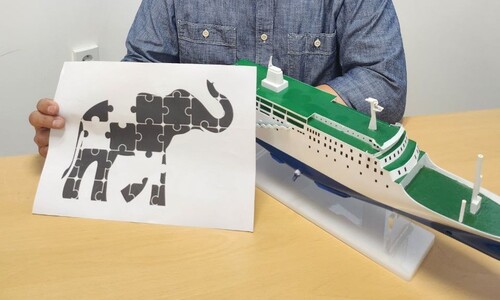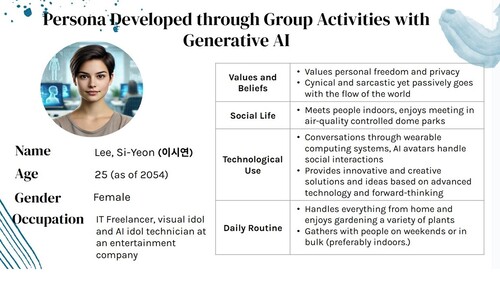| |
‘박꽃 같다’는 말은 소박하고 은은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쓴다. 그러나 그 앞에 ‘호’자를 붙이면, 뜻이 정반대가 된다. ‘호박꽃 같다’는 소리를 듣고 좋아할 사람은 없다. 북방 오랑캐를 뜻하는 ‘호’(胡)자는 북방에서 건너왔거나 그렇게 추정되는 사물이나 사람 앞에 붙이는데, 그 글자가 앞에 붙어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은 거의 없다. 참기 어려울 만큼 시끄러운 상태를 “호떡집에 불났다”고 하며, 용서할 수 없는 패륜아를 ‘호래자식’(후레자식)이라 부른다. ‘호’는 순우리말로 ‘되’다. 그래서 북풍을 ‘된바람’이라 하고 ‘호인’(胡人) 또는 ‘호로’(胡虜)를 ‘되놈’이라 한다. 되놈은 본래 중국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지만, 제 몫만을 악착같이 챙기는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을 욕할 때 쓰기도 한다. 심지어는 그 앞에 ‘똥’을 붙이기도 한다. 오늘날 한국인의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자리잡은 중국과 중국인의 이미지는, 대체로 좋지 않다.
중국인에 대한 이중적 사고
그러나 의식의 다른 한편에는 중국인과 혈연으로 엮여 있다는 생각도 자리잡고 있다. 모두가 동포요, ‘단군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순혈 민족주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중에는 자기가 기자(箕子), 공자(孔子), 맹자(孟子), 손자(孫子), 주자(朱子) 등의 자손이라고 믿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국인 성씨의 반 이상이 외래(外來) 성으로 알려져 있고, 그중 다수가 중국 성이다. 물론 이 경우의 중국인은 ‘호로’(胡虜)가 아니다.
여진족이 대륙을 정복해 청나라를 세우기 전에는, ‘중국인 또는 당인(唐人)’과 ‘호인(胡人) 또는 야인(野人)’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 청나라가 명나라의 복식과 두발을 폐지하고 중국인들에게 ‘오랑캐의 풍습’을 강요해 퍼뜨린 뒤로, 조선만이 ‘중화’(中華)의 정통을 이은 유일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조선 지식인이 늘어났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 중국은 ‘공자·맹자·주자의 나라’와 ‘오랑캐의 나라’로 분리됐고, 이런 분리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이중적 사고를 낳았다. 그러나 이런 이중적 사고가 일반화·대중화하기까지에는 그 뒤로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광고
언제부터 이 땅에 중국인이 들어와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중국인’이라는 자의식을 보존하며 한국인 사회에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별개의 ‘집단’으로 살기 시작한 것은 1882년부터였다. 이해 여름, 서울에서 군인 폭동이 일어나자 청나라는 조선 정부의 요청에 응하는 형식으로 군대를 파견했다. 광동수사제독 오장경이 인솔한 4500명의 군대가 서울에 들어와 남별궁·경모궁·동대문·용산 등지에 주둔하고 폭동을 진압했다. 이때 군용품 조달을 위해 40여 명의 상인들도 따라 들어왔다. 이른바 ‘재한화교’(在韓華僑) 사회는 이들로부터 시작됐다.
서울에 군대를 주둔시킨 청나라는 조선을 ‘근대적 속방’으로 만들려 했다. 그해 8월, 양국 사이에 ‘상민수륙무역장정’(商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되자 청나라 군대를 따라온 상인들은 조선 정부와 민간인을 상대로 영업을 개시했다. 뒤이어 많은 중국 상인들이 서울과 각 개항장에 몰려왔다. 1883년 말 서울과 각 개항장에서 개업한 청나라 상인은 210명 정도였고, 이듬해에는 서울에 353명, 인천에 235명으로 급증했다. 청상(淸商) 세력이 급신장한 배경에 오장경의 군대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한성화교중고등학교 뒤편 언덕에 있는 ‘오무장공사’(吳武壯公祠). 조선 전통 양식의 본당 건물과 솟을대문, 중국식의 재실(齋室)과 비각(碑閣)이 있다. 오장경과 임오군란 진압차 서울에 왔다가 사망한 청병(淸兵)을 합사했다. 오랫동안 재한화교 사회의 정신적 구심점 구실을 했으나, 화교 사회가 영락함에 따라 사당도 많이 퇴락했다. 전우용 제공
광고
광동 출신, 초기 화교의 중핵
근대 이후 중국은 인도와 더불어 세계 최대의 이민 배출국이 되었지만, 그 중핵은 ‘양동인’(兩東人)이라고 한다. ‘양동’은 광동(廣東)과 산동(山東)을 가리킨다. 그런데 두 지역의 이민 배출 사유는 사뭇 다르다. 태평양 연안 해상무역의 중심지인데다 마카오·홍콩과도 인접한 광동성 출신들은 주로 ‘상업이민’을 배출한 반면, 토질이 척박하기로 이름난 산동성은 ‘노동이민’인 ‘쿨리’(苦力)를 다수 배출했다. 중국은 나라가 큰 만큼 흉년이면 엄청난 규모의 유랑민이 발생했는데, 그 유랑민의 태반이 산동 출신이라고 할 정도였다. 처음 서울에 온 청나라 상인들의 출신지는 중국 전역에 걸쳐 있었지만, 광동 사람이 특히 많았다. 청나라 군대의 대장 오장경이 광동수사제독이었기에, 광동 출신 병사와 상인이 많은 건 당연했다.
1883년 총판조선상무위원공서가 설치돼 영사 업무를 개시하자, 청상들도 상업회의소 격인 중화회관을 지었다. 그 밖에 출신 지역별 친목회 격으로 광동회관·남방회관·북방회관 등을 만들었는데, 광동회관은 중구 소공로 현 플라자호텔 부근, 남방회관은 중구 서소문 입구, 북방회관은 중구 장충동 수표교 남쪽에 있었다. 북방회관은 산동·하남·하북·산서성 출신이, 남방회관은 강소·절강·안휘성 출신이 모인 단체였던 반면, 광동 출신은 자기들끼리만 독자적 모임을 만들었다. 재한화교 사회가 형성되던 무렵에는 광동 출신들이 재한화교의 중핵이었던 셈이다.
1884년 5월, 오장경은 위안스카이(袁世凱·원세개) 등에게 일부 병력을 맡긴 뒤 주력을 이끌고 귀국했다. 그러나 여독 때문이었는지 귀국하자마자 바로 사망했다. 오장경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평산 사람 우규명이 그의 공로를 기리는 사당을 지어주자고 상소했다. 고종은 그 말이 공의(公議)에 합당하다 하고 곧바로 사당 건립을 지시했다. 1885년 봄, 그를 기리는 오무장공사(吳武壯公祠)가 지금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주변에 세워졌다.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그의 제사는 조선 정부가 주관했으나 그 뒤로는 재한화교 사회가 맡았다. 오장경은 조선에 2년도 채 머물지 않았지만, 재한화교 사회의 기반을 닦았고, 그 때문에 지금껏 재한화교의 비조(鼻祖)로 인정되고 있다.
광고
‘뿌리’를 되새기는 사람들
1912년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 초대 대총통이 된 위안스카이는 옛 상관인 오장경을 추모하는 휘호를 써서 보냈다. 재한화교들은 그 휘호를 현판으로 만들어 오장경 사당에 걸었다. 이 때문인지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이 사당을 ‘원세개 사당’으로 잘못 알았다. 1969년 재한화교들은 명동에 있던 한성화교중학교를 연희동으로 이전하며 이 사당도 함께 옮겼다. 요즘도 재한화교들은 봄·가을로 이 사당에 모여 오장경을 추모하며 자기들의 ‘뿌리’를 되새기고 있다.
광고
한겨레21 인기기사
광고
한겨레 인기기사

이재명 선거법 ‘무죄’ 기대감…대법 속전속결 선고에 더 커졌다

박지원, 정대철에게 “너 왜 그러냐” 물었더니 대답이…

검찰, 윤석열 자택 첫 압수수색…‘건진법사 청탁’ 금품 흐름 포착

한덕수 부른 국민이 도대체 누군데요…“출마 반대·부적절” 여론 압도

검찰, 윤석열·김건희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김건희 일가 요양원, ‘럭셔리 호텔식’이라며 썩은 과일 제공?

김민석 “한덕수, 국정원 출신 통해 대선 준비…검찰 압수수색해야”

민주 총괄선대위원장 윤여준·강금실·정은경·김동명·김부겸·김경수·박찬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의혹 수사검사 고발…“정치적 기소”
![[속보] 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속보] 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30/53_17459839937251_20250430501911.jpg)
[속보] 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