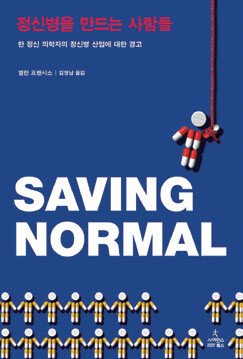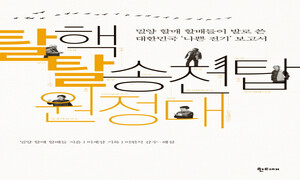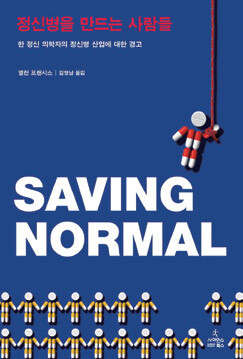
1
(김명남 옮김, 사이언스북스 펴냄)의 원제는 ‘세이빙 노멀’(Saving Normal), 곧 ‘정상인 구하기’다. 정신장애 진단의 교본으로 쓰이는 정신장애진단통계편람(DSM) 편찬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미국의 정신과 의사 앨런 프랜시스는 몇 해 전부터 일상의 모든 것을 질병화하는 DSM의 폐해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가 내부고발자가 된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15년 동안 소아 양극성장애가 40배, 자폐증이 20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인 소아 ADHD 진단을 받은 사람은 3배가 늘었다. 갑자기 비정상적인 정신질환자가 넘쳐나게 된 것은 누구의 탓일까? 지은이는 DSM이 개정될 때마다 일상적인 심리증상 다수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해 정신적 질병을 유행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DSM의 4번째 개정판, DSM-IV를 주도했던 그가 자기비판에 가까운 어조로 고백하는 최근의 거짓 유행병은 대부분 소아와 청소년을 겨냥하고 있다. 전체 어린이의 10%가 ADHD에 해당한다는 조사가 있다. 이런 조사가 사람들을 겁줄 때 반에서 제일 생일이 늦어서 발달이 덜 된 아이가 주의력결핍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는 감춰진다. 2013년 5월에 출간된 DSM-V는 ‘분노조절곤란장애’라는 항목을 신설했는데 발작적 짜증을 내는 것을 정신장애로 규정한 것이다. 자꾸 잊어버리는 건망증은 신경인지장애로 명명됐다. 문제는 의사들이 환자 상태를 잘 표현하고 다가갈 수 있다는 선의로 정신장애 항목을 늘렸더라도 제약회사나 진단검사 회사들은 선의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신적 문제로 싸워온 사람들에게 약은 선물일 수 있다. 그러나 비정상의 경계가 넓어져 어리고 미숙해 과잉행동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아이들과 수줍어하다가 사회불안장애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성인들이 정신과 앞을 기웃거린다. 심지어는 시험 전날 집중력을 높이려 ADHD 약을 먹는 학생들이나 뇌의 화학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우울할 때마다 약을 털어넣는 사람들을 막을 길이 없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대부분이 반강제적으로 쌓게 된 정신의학에 대한 교양과 심리치유 서적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불안하고 균형을 잃기 쉬운 내가 정상이냐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됐다. 슬픔이나 분노, 무력감 같은 인생의 정당한 감정을 다스리고 명명하려는 욕심을 가졌던 것은 정신과 의사들만이 아니었다. 상처를 스스로 핥고 자신이 가진 자원과 친구들을 동원해 그럭저럭 견딜 수 있는 힘을 병원과 정신분석가, 힐링 멘토들에게 내준 것은 누구였을까? 정신의학계 내부의 문제를 들춘 책이 남기는 충고는 지극히 상식적이다. 정신장애 진단은 반드시 한 명의 의사가 아닌 여러 의사에게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삶에서 다채로운 감정적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권리를 되찾으라는 것이다.
남은주 esc 기자 mifoco@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영상] ‘총·방망이 난무’ 내란의 공포 이기려…50만 시민 “힘내” 함께 불렀다 [영상] ‘총·방망이 난무’ 내란의 공포 이기려…50만 시민 “힘내” 함께 불렀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4/1228/3517353792869282.jpg)
[영상] ‘총·방망이 난무’ 내란의 공포 이기려…50만 시민 “힘내” 함께 불렀다

푸틴, 아제르에 ‘여객기 추락 사고’ 사과…우크라 드론 오인 격추 인정

“최상목, 윤 탄핵은 기정사실 발언”…기재부 “그런 적 없어”

경찰, 추경호 ‘계엄해제 방해로 내란 가담’ 피의자 조사

영원한 ‘줄리엣’ 올리비아 핫세 가족 품에서 잠들다…향년 73
![[영상] 부산 시민들 “내란 공범 나와라”…박수영 의원 사무실 항의 농성 [영상] 부산 시민들 “내란 공범 나와라”…박수영 의원 사무실 항의 농성](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1228/53_17353675159214_20241228500351.jpg)
[영상] 부산 시민들 “내란 공범 나와라”…박수영 의원 사무실 항의 농성

베트남, 마약 밀수 조직원 27명에 무더기 사형 선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민주, 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법 공포가 탄핵 잣대
![물에 빠진 늙은 개를 건져주자 벌어진 일 [아침햇발] 물에 빠진 늙은 개를 건져주자 벌어진 일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1226/53_17351971671475_20241226501571.jpg)
물에 빠진 늙은 개를 건져주자 벌어진 일 [아침햇발]

조갑제 “윤석열 탄핵 사유, 박근혜의 만배…세상이 만만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