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갈고리에 동료들의 시체가 걸려 있던 시절…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고 작가는 썼다. 레지스탕스로 활동했다가 독일군에게 붙잡혀 모진 고문을 받았던 장 아메리는 결국 살아서 2년 만에 강제수용소를 걸어나왔다. 그러나 20년이 흘러 이제 밖이 아니라 늙어가는 자신의 내부에서 죽음이 매 순간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을 때 그는 놀라고 몸서리친다.
투사였던 인간을 “극한의 공포이자 동통”에 떨게 만든 것은 늙음이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고문 앞에서도 그저 담담했던 젊은이는 광채를 잃어가는 눈, 핏줄이 불거지는 손, 축 늘어지는 배를 보면서 경악한다. 노화는 불치병이며 시간 앞에서 나는 그저 홀로 있다고 느낀다. “이렇게 해서 몸은 감옥이 되었다.”
새삼 아메리가 이 책 (김희상 옮김·돌베개 펴냄)를 처음 쓴 나이를 꼽아보니 1968년, 46살 때였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줄곧 스위스에서 독일어로 글을 쓰며 살았다. 오십이 되기도 전에 그는 동료들보다 쇠약해진 몸을 느끼고 자신 안에 켜켜이 쌓인 시간의 무게에 몸부림친다. 아픔과 질병은 몸이 쇠락하며 벌이는 축제다. 빠르든 늦든 몸의 노쇠는 누구나 피할 수 없고, 이는 곧 세상에 완전히 패배하는 날이 찾아오리라는 예고장이다. 자기 몸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뜻이다. 위장을 의식하면서 밥을 먹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위장이 건강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 바깥에 머무른다.” 이 말을 시간과 젊음으로 바꿔도 된다. 젊은 사람은 시간의 바깥에 머무른다. 달력을 떼어내며 시간을 의식하는 노인은 시간의 안쪽에 매여 있다.
지은이는 유럽을 휩쓴 문화적 변화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살아온 표시 체계가 붕괴돼가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시대를 부정하는 방어적 태도로 굳어질 수만도 없다는 간극 사이에서 고통을 느낀다. 결국 “그는 언제나 자신을 세계로 향해 던졌던 게 그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한 탓에 조촐한 공간으로만 만족해왔다. …도대체 나는 언제 사는 것처럼 살까?”라고 쓴 글을 읽는 것은 여간 쓸쓸하지 않다. 그러나 그는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처럼 나이듦에 대한 누구의 위로도 거부하고 자신을 벼랑 끝에 던지듯 쓴다. 죽음은 모든 미래의 미래이며, 우리가 떼는 모든 발걸음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행보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죽음을 피해 죽음으로 도피할까? 말미에 지은이가 던진 질문이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자기부정과 맞서 싸우는 것이 노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던 그는 1978년 잘츠부르크에서 스스로 목숨을 거두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시진핑, 이 대통령에 전기자전거 선물…‘황남빵’ 답례로 사과·곶감 [단독] 시진핑, 이 대통령에 전기자전거 선물…‘황남빵’ 답례로 사과·곶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107/53_17677974286315_20260107503909.jpg)
[단독] 시진핑, 이 대통령에 전기자전거 선물…‘황남빵’ 답례로 사과·곶감

수혜자는 오직 박근혜뿐…유영하, ‘대통령 예우 회복법’ 발의

고삐 풀린 트럼프 ‘돈로주의’…21세기판 제국주의 방아쇠

이번 주말 전국에 ‘눈앞 안 보이는’ 폭설 온다…시간당 1~5㎝
![[속보] ‘재산신고 누락’ 민주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속보] ‘재산신고 누락’ 민주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108/53_17678373541376_20260108501344.jpg)
[속보] ‘재산신고 누락’ 민주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유체이탈’ 윤석열, 이번엔 국무위원 탓 “‘계엄 창피할 수도’ 경고 안 해” [영상] ‘유체이탈’ 윤석열, 이번엔 국무위원 탓 “‘계엄 창피할 수도’ 경고 안 해” [영상]](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108/53_17678399102847_20260108501573.jpg)
‘유체이탈’ 윤석열, 이번엔 국무위원 탓 “‘계엄 창피할 수도’ 경고 안 해” [영상]
![[단독] “김병기, 경찰서장과 ‘흔적 완전삭제’ 텔레그램 통화”…아내 수사 관련 [단독] “김병기, 경찰서장과 ‘흔적 완전삭제’ 텔레그램 통화”…아내 수사 관련](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107/53_17677488214894_7217677486508688.jpg)
[단독] “김병기, 경찰서장과 ‘흔적 완전삭제’ 텔레그램 통화”…아내 수사 관련

“러·중 그린란드 포위”, “덴마크는 썰매로 방어”…트럼프 주장 사실일까?

장동혁 ‘반쪽’ 사과…정규재 “빵점”·조갑제 “조중동도 비판” 혹평

이 대통령 불만 토로…“무죄 나면 검찰 기소 탓해야지, 왜 항소 안 했다 비난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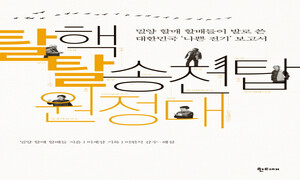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