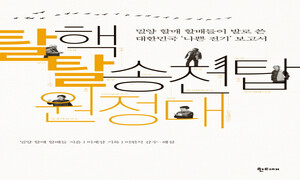독일 원자력윤리위원회는 2021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독일 정부에 건의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은 학계·산업계·정부 관료 등으로 위원회를 꾸렸다. 그런데 명칭이 원자력‘윤리’위원회다. 한국은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원자력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라든지, 다음 세대에게 원전 폐기물의 위험을 넘겨주게 되는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이 문제를 효율성의 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였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퇴퍼 교수의 말이다. 여기서 안전과 경제는 대립된 개념이 아니다.

한국은 어땠는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길어지자 ‘세월호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다’는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한국의 위험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자는 주장은 ‘경제’ 논리에 파묻혔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기억 투쟁’에 대해서도 비슷한 낙인을 찍는다. 정부를 상대로 지겹게 싸우면서 보상금을 많이 받아내려 한다는 낙인이다.
(한울 펴냄)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한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사회학 교수),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 등 8명의 연구자가 나눠서 글을 썼다. 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나? 왜 비슷한 재난이 반복해서 벌어지는가? 왜 나아지지 않는가?
이 책을 관통하는 열쇳말은 ‘공공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공공성 및 위험 관련 지표를 분석해서 나라별 순위를 분석해봤더니, 한국은 꼴찌였다. 안전은 공공재다. 공공성이 낮을수록 재난이 일어날 위험은 높아지고, 위험관리 역량은 낮아진다. 공공성이 낮은 사회에서는 위험에 공동 대응하기보다는, 누가 먼저 침몰하는 배 위에서 뛰어내릴까 하는 ‘경쟁’이 강화된다. 이른바 ‘위험의 개인화’다.
저자들은 한국 사회를 ‘이중위험사회’로 정의한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지하철, 세월호 등 아직도 과거형 재난이 끝없이 되풀이된다. 원전, 미세먼지 등 미래형 재난의 위험까지 겹쳐온다. 울리히 베크의 말처럼 “아주 특별히 위험한 사회”가 되었다. “재난은 자연재해나 기술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해 훨씬 더 큰 위기로 증폭된다.” 한국의 사회적 취약성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미국의 카트리나 재해, 독일의 원전 폐쇄 결정, 네덜란드의 북해 대홍수 등의 대응에 견줘볼 때 더 도드라진다.
세월호 이후에도 여전히 “재난은 우리 안에 있다”. 눈앞의 사건만 수습하려 든다. 보상과 인양만 해결하면 세월호 참사가 수습된다고 생각하는 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장덕진 교수는 “공존의 가치가 공유되고 사회적 합의의 틀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한국 사회가 세월호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자두농사 청년’ 향년 29…귀촌 7년은 왜 죽음으로 끝났나

‘도로 친윤’ 국힘…이철규 원내대표 밀며 “욕먹어도 단일대오”

후쿠시마 농어·가자미…오염수 방류 뒤 ‘세슘137’ 껑충 뛰었다

민희진, 1년 전 “어도어는 내 음악·사업 위한 회사” 인터뷰 재조명

“세빛섬 ‘눈덩이 적자’ 잊었나”…오세훈, 한강 토건사업 또?

‘학생인권조례’ 결국 충남이 처음 폐지했다…국힘, 가결 주도

류현진, 통산 100승 달성 실패…내야 실책에 대량 실점

의대교수 집단휴진에 암환자들 “죽음 선고하나” 절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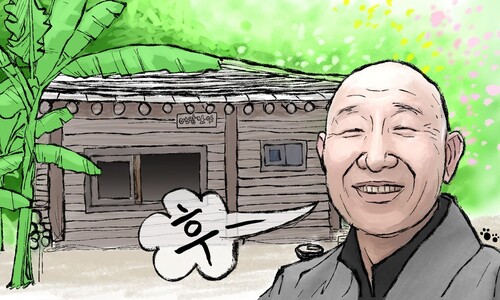
5평 토굴의 스님 “편하다, 불편 오래되니 ‘불’ 자가 떨어져 버렸다”

전국 대중교통 환급 ‘K-패스’ 발급 시작…혜택 따져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