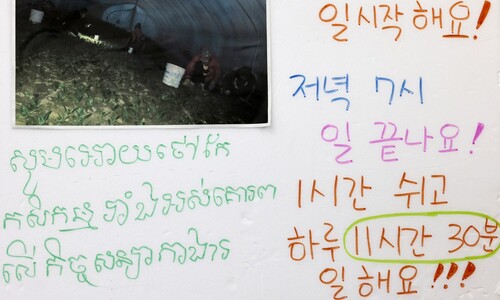아마존 정글 지역에 안데스산맥이 살짝 스쳐 지나가는 페루 북부 아마조나주의 마라뇬강은 산사람들과 정글사람들에게 모두 신성한 곳이었다. 그곳에선 그들의 두 신(神)이 하나가 된다.
감자 실은 트럭 짐칸을 얻어 탈 수도 있었지만 악명 높은 이 길만은 그나마 편안하게 버스로 가기로 했다. 144km를 가는 데 8시간 정도 걸리는 이 길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진다. 어설프게 만들어진 비포장도로는 차 한 대가 가기에도 비좁은 듯하고, 말라버린 땅으로 된 벽에서는 계속 돌들이 떨어진다. 가끔은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큰 사고가 나기도 한다. 이 최강 구불구불 도로는 해발 3678m까지 오르고 950m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500m까지 오른다. 시속 15km로 달리는 버스 안에서 사람들은 구토를 해대고 인디언 꼬마들은 버스 안에서 오줌까지 싸니 거북하기 짝이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순례자처럼 성스러웠다. 옆자리의 할머니는 가는 내내 묵주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인디언들은 궁상스러운 겉모습이 무색하게 신성한 눈빛으로 창밖을 보며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대지의 어머니에게 기도를 했다. 나는 가끔 졸다가 머리를 창문에 부딪쳤는데, 그런 일이 열 번 이상 계속되니 아예 잠잘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 초강력 멀미 속에서도 나는 마라뇬강이 주는 신성한 기운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지’가 안데스의 야이노족 유적지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경이로웠다.지와 다리오 제공
스페인 사람들이 강에서 원주민들을 만나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원주민들이 “페루”라고 대답했다는 장면을 상상했다. 원주민의 언어로 페루는 ‘강’이라는 뜻이었다. 원주민들은 강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강에 있다고 말했을 뿐인데, 스페인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 원주민들의 나라를 ‘페루’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데 선수다. 어쨌든 이것이 페루라는 이름의 유래다. 이 나라는 거대했다. 안데스산맥의 중심부를 갖고 있고 아마존이 시작되는 곳도 여기에 있다.
페루는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유적지나 다름없다. 우리는 안데스산맥을 타고 내려오며 작은 마을들을 지났다. 작은 팻말에 ‘잉카난’(Incanan)이라고 쓰인 곳을 수없이 만났다. 그 유명한 잉카 길이었다. 남미 전역을 정복한 그들이 걸었던 길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밭으로 가는 길이 되었다. 우연히 폐허가 된 야이노족(잉카 정복 이전의 부족)의 유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제사를 지냈다는 가장 높은 곳의 가장 커다란 원형 건물에 올라서 말없이 산을 내려다보았다.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 6일 동안의 고생은 가치 있었다(우리는 6일을 걸어서 그곳에 도착했다). 그들의 신이 태양이든 눈 덮인 산봉우리든, 그들이 있던 자리에서 똑같은 풍광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경이로움이 머리털까지 전달됐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비밀스러운 유적지를 찾는 것이 우리 여행의 핵심이었다. 잉카가 (혹은 잉카 전에) 남긴 유적은 페루 전역에 비밀처럼 숨겨져 있고, 공짜였지만 쉽게 도착할 수 없는 곳이기에 시간이 촉박한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매번 이 특별한 장소의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사람의 손길이 아닌 자연에 의해 훼손된 유적지 벽면의,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온 흔적이 오히려 아름다웠다. 나는 치유받고 용서받았고, 삶과 나의 존재에 대해 감사함을 가득 품고 내려왔다. 그들의 신이 나에게도 자비를 베풀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내려오는 길에 지나는 마을에선 잔치가 한창이었다. 오전 내내 굶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마법으로 우리의 상태를 꿰뚫어보고, 기꺼이 우리 배를 채워주었다. 그러고 보면 여행이란 마법과도 같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니 말이다. 그 마법이 여행만이 아닌 나의 일상에서도 계속되길 바라고 또 바랐다.
지와 다리오 ‘배꼽 두 개’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주가조작 수사’ 할 만큼 했다는 윤…검찰 쪽 “김건희 불러도 안 나와”

“피의자 이종섭 왜 호주대사로 임명했나?”라고 윤에게 묻자…

20km 걸어서, 41일 만에 집에 온 진돗개 ‘손홍민’

채 상병 특검 거부, 김건희 특검엔 “정치공세”…변화 없는 윤 대통령

전직 경찰 ‘김미영 팀장’, 필리핀서 영화 같은 탈주…보이스피싱 대명사
![[단독] 백제병원 ‘대리진료 사망’ 의사…재수사 끝 7년 만에 기소 [단독] 백제병원 ‘대리진료 사망’ 의사…재수사 끝 7년 만에 기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510/53_17152922047396_20240509504030.jpg)
[단독] 백제병원 ‘대리진료 사망’ 의사…재수사 끝 7년 만에 기소

윤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비서관 임명
![애착 넘어 혐오로 나아가는 정치팬덤 <span style="color: rgb(0, 0, 0);">[이철희의 돌아보고 내다보고]</span> 애착 넘어 혐오로 나아가는 정치팬덤 <span style="color: rgb(0, 0, 0);">[이철희의 돌아보고 내다보고]</span>](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510/53_17152941919675_20240510500137.jpg)
애착 넘어 혐오로 나아가는 정치팬덤 [이철희의 돌아보고 내다보고]

23년차 교사는 교권 침해 기사 쏟아지는 ‘스승의 날’이 두렵다

탐정 자칭 민간인이 이주자 불심검문·체포…불법 행위 방관하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