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청의 강제철거로 생활 터전(개포동 영동5교 아래)을 잃은 넝마공동체 주민들이 지난해 12월12일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한겨레 김정효
【열가】
[명사] 부유한 사람들이나 상류층을 지칭하는 넝마주이 은어. 넝마주이들에게 열가는 닿을 수 없는 현실 너머의 신분이며, 서울 강남은 오를 수 없는 열가들의 성이다.
【난장꿀임】[명사] 한뎃잠을 뜻하는 은어. 과거 넝마주이들에게 난장꿀임은 일상이었다. 강남구청의 넝마공동체 강제철거 이후 삶터를 잃은 이들이 다시 난장꿀임으로 내몰렸다.
[사용례] 그녀들이 종이처럼 구겨지고 있었다.
다리를 접고 다시 허리를 접었다. 고개를 접고 다시 가슴을 접었다. 몸을 접고 다시 접을 때마다 뼈와 관절 사이로 희망을 이분하는 선명한 선이 생겼다. 그녀들이 구겨지고 접힐수록 희망의 크기는 무한 이분됐다.
열가의 땅에 첫눈(11월18일)이 내렸다. 그 땅을 행정하고 자치하는 강남구청 앞으로 올겨울이 칼바람을 타고 처음 왔다.
“고마 무너지겠다.”
비닐이 바람에 출렁이자 그녀(77)가 걱정했다. 강남구청이 넝마공동체를 철거(2012년 11월15일·28일 두 차례 집행)한 뒤 1년 동안 그녀들도 출렁이는 연기처럼 살아왔다.
강제철거를 피해 영동5교 다리 밑을 비웠을 때(2012년 10월28일) 그녀들은 27년간 생을 의탁한 터전을 등지며 무서워 떨었다. 탄천운동장(강남구 대치동 1번지)으로 옮긴 컨테이너와 텐트를 용역들이 부수고 물·음식의 반입을 막았을 때 그녀들은 빗물로 쌀을 씻으며 서러워 울었다. 집을 잃고 찜질방→수서경찰서 민원실→관악구 노숙자 쉼터→용인시 교회→성남시 지역아동센터→신연희 구청장 자택(대치동) 앞을 떠돌았을 때 그녀들은 구민 취급도 국민 취급도 받지 못한다는 분노로 뼈가 시렸다. 노숙농성 시작(지난 6월12일) 뒤 구청이 관변단체의 집회 신고를 지원해 공동체 농성을 봉쇄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들은 구청의 냉혹함에 놀라 망연했다.
눈보라에 맞선 그녀들의 대응은 허허로웠다. 천막도 아니고, 움막도 아니며, 그녀들의 막(넝마주이 작업장)은 더욱 아니었다. 허술하고 엉성한 ‘비닐방’은 구청 앞 인도에 떨어진 커다란 누에고치 같았다. 냉혈이 흐르는 보도블록 위로 스티로폼을 깔았고, 스티로폼 주위로 종이상자를 한두 개씩 놓았다.
“우산들 좀 잘 받치보래.”
그녀(72)가 우산의 위치를 조정했다. 그녀들은 상자 위에 우산을 세워 골조로 삼았다. 펼친 우산 위로는 비닐을 둘러 지붕을 만들었다. 그녀들 삶의 무게를 지탱하기에 휘어진 우산살들은 너무 가늘고 허약했다. 구청과의 싸움이 버거운 그녀들에게 1년 동안 통통하게 살이 오른 추위가 달려들었다. 얇은 비닐벽 뒤에서 자동차들이 질주하며 날카로운 경적으로 울었다.
“밥이라도 든든히 묵어야제.”
그녀(71)가 밥그릇마다 갓 지은 밥을 수북이 퍼 담았다. 그녀들이 김치를 찢어 밥과 함께 씹었다. 거칠고 더운 밥이 그녀들의 언 몸을 녹였다. 비닐방 안에서 가스버너로 밥을 끓이며 그녀들은 놓을 수 없는 하루씩의 삶을 이었다.
그녀들은 그녀, 들로 이뤄져 있다. 공동체 철거 1년 뒤 남은 회원 26명(철거 당시 29명) 중 24명이 60대 이상이다. 수급자가 5명, 파산 진행 중인 사람이 4명, 기초노령연금 신청자가 2명이다. 5명의 남자들은 머물 곳을 찾아 노숙자쉼터·교회·공사판으로 흘러다니고 있다. 늙고 아파 갈 곳도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그녀, 들이 구청 앞에 있다. 싸워야 하는 농성이되, 살아야 하는 노숙이기도 하다. 발버둥치며 벗어났던 한겨울 난장꿀임을 구청이 다시 하게 만들었다. 그녀(67)가 그녀(67)에게 말했다.
“올겨울까지 거리에서 보낼진 몰랐제. 국가는 뭣이고, 정치는 뭣인가. 숨이 꺽꺽 막혀 죽을 것 같던 여름 뙤약볕이 차라리 그립네.”
그녀(73)가 기었다.
우리는 빈 몸으로 쫓겨 안 났나. 안경도 몬 쓰고, 신발도 몬 신고, 옷도 몬 입었다. 용역들은 남자들 러닝셔츠까지 다 벗겼다. 얼굴에 침까지 뱉었단 말이다.
허리 높이의 비닐방 안에서 그녀들은 일어설 수도 무릎을 세울 수도 없었다. 누울 수도 다리를 뻗을 수도 없었다. 아기처럼 네발로 기며 그녀들은 아득했다.
우리도 인간이다. 이렇게 기어도 강남서 느거하고 같이 사는 같은 인간….
1.5평 넓이의 비닐 덮개 아래에서 7명의 그녀들이 포개졌다. 인간의 몸이 인간의 몸과 겹쳐질 때 인간의 몸은 인간의 몸이 아니었다. 그녀들은 공간에 맞춰 스스로를 변태시켰다.
바람이 비닐을 때렸다. 우산 하나가 찌그러지며 비닐 한쪽이 가라앉았다. 우산을 바로잡던 그녀들은 체념했다. 비닐이 하강한 만큼 어깨를 구부려 땅과 밀착시켰다. 구청 용역이 비닐 한쪽을 들어 안을 살펴보고 갔다. “분해. 우리가 너무 약해서 분해.” 그녀(75)가 탄식했다.
술만 먹으면 휘두르는 남편의 칼은 그녀에게 공포였다. 낯선 여자를 데려와 자신을 쫓아낼 때도 버텼던 그녀는 갓 낳은 아이를 두고 죽지 않으려고 도망쳤다. 그녀는 넝마공동체에 와서야 지친 몸을 누일 수 있었다. 그녀와 같은 그녀, 들이 공동체에 의탁하며 버리려던 생을 구했다.
한 달에 1만원만 내면 먹고 잘 수 있는 데는 여뿐이다. 내가 고물 줍고 헌 옷 정리하는 만큼 돈도 벌 수 있고.
전쟁고아들과 근로재건대(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이 경찰 관할하에 편입시켜 관리하던 넝마주이 조직) 출신 남성들이 중심이 돼 만든 공동체였다. 삼청교육대 및 부산 형제복지원(박정희·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부랑인 선도를 위탁받은 시설로 불법감금·강제노역·구타 과정에서 12년간 513명 사망)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교도소에서 출소해 모라이 달러(밥 얻으러) 다니던 노숙인들도 많았다. 그들이 죽고 떠난 공동체를 가정이 해체된 그녀들이 찾아와 채웠다.
‘강남 망신시키는 인간들아.’
누군가 그녀들 곁을 지나가며 말했다. 평생 양아치(넝마주이의 속된 표현)나 양씨가문이란 소리를 들으며 그들과 그녀들은 살았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을 지탱하는 경우가 있다. 공기가 생명을 지탱하고, 사랑이 사람을 지탱하며, 부유는 빈곤이 지탱한다. 열가의 깨끗함은 넝마의 더러움이 지탱했다. 그녀들은 생각한다.
영동5교 완성 전부터 교각 아래 모여 살믄서 강남의 얼룩을 닦아왔다. 대치동과 개포동 개발 때도 열가들이 버린 고물과 헌 옷·음식을 걷어 재활용한 기 우리 공동체다. 강남을 ‘열가의 도시’로 반짝반짝 윤을 낸 우리가 다 떨어진 걸레처럼 버려졌다.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 사고 때 구청이 한 거 보래. 피해 주민들 임시 거처 마련한다고 LG전자 대신 나서서 특급호텔을 잡아 안 줬나. 우리만 강남 주민으로 안 보이는 기지.
‘가장 부유한 땅에서 사라져야 할 가장 가난한 자들’ 위로 어둠이 내렸다. 전깃불을 밝힐 수 없는 비닐 안이 어둑했다.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이 앉은 채 잠든 그녀들의 얼굴에 뿌려졌다. 뻣뻣이 굳은 그녀들의 작은 몸이 절반의 크기로 접히며 땅속 저 밑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멸치는 좀 남았십니까?”
비닐방 안으로 백발의 그(67)가 기어 들어왔다. 이문영 기자
*강남구청과 탄천운동장 관리업체는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넝마공동체를 상대로 11건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동체의 주거 공간과 작업장 문제 해결을 놓고 강남구청·공동체·서울시 간 세 차례 중재(10월28일~11월18일)를 시도했으나 구청의 대안 부재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1월25일로 예정된 마지막 중재까지 무산되면 공동체의 ‘집 없는 삶’은 2년째로 접어든다. 공동체는 겨울을 날 수 있는 공간과 영동5교 작업장 크기(400여 평)의 대체 부지를 요구하고 있다.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비공개회담 85%가 윤 대통령 발언”...이 대표 “답답하고 아쉬웠다”

“이태원 희생양 찾지 말자”는 전 서울청장…판사 “영상 보면 그런 말 못해”

‘김건희 디올백’ 목사 스토킹 혐의…경찰 “수사 필요성 있다”

4번 수술 끝 돌아온 교실서 ‘깜짝’…“이런 곳이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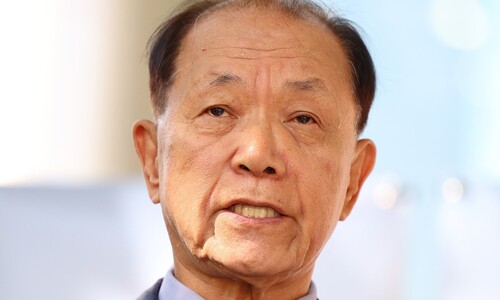
국힘 비대위원장 돌고 돌아 황우여…당내 일부 “쇄신 의문”

유아인 편집본 ‘종말의 바보’…이럴거면 빼지 말걸 그랬나?

류희림 방심위, 임기 석달 앞두고 ‘발언권 제한’ 규칙 개정 예고

720일만의 첫 회담, 빈손으로 끝났다

이 “R&D 예산 복원 추경을”…윤 “내년 예산안에 반영”

어도어 “이사회 개최 거부”…민희진 대표 해임안 주총 상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