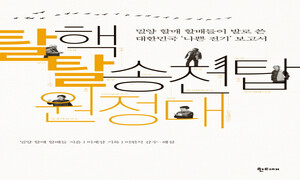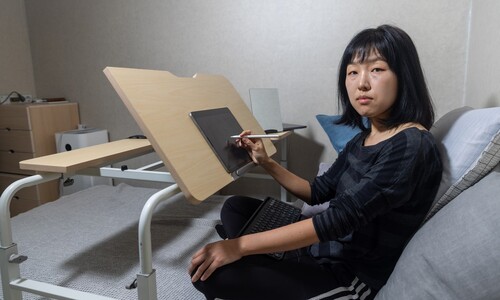오늘날 서로 다른 시각과 정치적 지향에 따라 과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만든 각자의 시나리오 때문에, 원시인들은 때론 과잉노동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게으른 좌파가 되고 때론 노동을 신성시하며 효율성을 추구하는 우파가 되기도 한다. 원시인이 한두 명이 아닌데다, 애초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선택을 했을지 고증으로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의 인류와 지금의 인류 사이 간극을 그냥 내버려둘 순 없는 일이다. 어니스트 겔너(1925~95)는 자신의 책 (1988)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늘 마주하고 있는 선택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해를 하려면 쓸모없는 예측도 필요하다.”
겔너는 이념이나 정치적 지향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학자다. ‘비판적 합리주의’를 내세웠던 그는 페리 앤더슨이나 에드워드 사이드 같은 좌파 학자들과 격론을 벌이는 한편 자신과 유사한 지점에 서 있는 듯 보이는 아이자이어 벌린, 칼 포퍼 같은 우파 학자들도 비판했다. 그는 런던정경대학에서 철학을, 케임브리지대학에선 사회인류학을 가르쳤고, 말년엔 조지 소로스가 만든 센트럴유러피언대학에서 민족주의연구센터를 이끄는 등 철학·인류학·사회학 같은 다양한 학문적 영역을 섭렵했다.
국내에는 주저로 꼽히는 (1983)가 번역 출간됐던 영향인지 ‘민족주의 이론가’로 널리 알려졌지만, 그의 다른 책들은 거의 소개된 바 없다. 그래서 (삼천리 펴냄) 출간은 겔너의 종합적인 학문적 면모를 소개해주는 계기이기도 하다. 마침 몇 년 전 영국 버소출판사에서 그의 평전이 나오기도 했다.
지은이는 역사를 수렵채취사회·농경사회·산업사회 3단계로 나누고, 인간의 활동도 생산·억압·인식 3가지로 구분한다. 이 요소들이 각각 어떻게 만나고 배합됐는지를 따라가며 근대의 탄생과 오늘날의 사회구조를 따져본다. 그러나 지은이는 “정확한 이행 경로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하며, 오늘날 인류가 살고 있는 세계는 수많은 가능성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그 속에서 필연성을 찾아내긴 어렵다고 말한다. 곧 인류 역사에 대해 “도토리가 참나무로 자라났다”는 식의 필연적 서술을 거부하며, 인류 역사의 이행은 우연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은이에게서 발견되는 지적 전통의 흔적은 주로 막스 베버나 에밀 뒤르켐의 사회학인데, 그 줄기는 ‘이성’이란 개념에 초점을 맞춰 인류의 역사를 합리성의 전개 과정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산업사회 이후 근대 인류는 ‘통합된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전의 인류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의 근본적인 격차가 있다는 지은이의 지적이다. 그래서 그는 “잠망경이 여러 개 달린 잠수함 같은 것을 상상해보자”며 독특한 방법론을 제안한다. 근대인이 원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원형 오피니언부 기자 circle@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32사단 신병교육 중 수류탄 터져…훈련병 사망, 교관 중상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10번째 재의요구권 행사

책은 버리고 ‘디올백’만 대통령기록물 보관? 검찰, 습득 주민 조사

강형욱 ‘직장 갑질’ 논란 확산…‘개는 훌륭하다’ 결방

징역 20년 구형 받은 습격범 “자연인 이재명에 미안”

“국민이 준 ‘채상병 특검’ 마지막 기회 걷어찬 윤, 확실히 심판해야”

김호중 팬들 “책임 통감하며 용서 구한다”

조국 “윤 대통령, 거부권 45회 이승만 독재 따라간다”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변호인 “권력자 칼춤에 해병대 다쳐”

‘사법방해’ 대명사 된 김호중…검찰총장 “구속 판단에 적극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