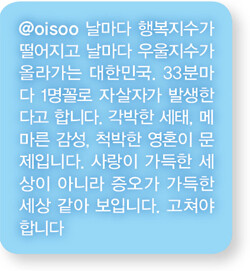지난 7월1일 오전(한국시각), 브라질 최초의 수도로 식민과 수탈과 근대화의 모든 영광과 오욕을 겪은, 그래서 ‘모든 성자와 모든 죄악의 도시’로도 불리는 항구도시 사우바도르에서는, 꼭 그만큼의 역사적 사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축구사에선 틀림없이 기억해야 할 일이 벌어졌다.
최상위 결정기관 역할 하는 IFAB
사우바도르의 폰테 노바 경기장에서 열린 2013 국제축구연맹(FIFA) 컨페더레이션스컵 3·4위전. 이탈리아와 우루과이가 맞붙은 전반 24분, 이탈리아의 알렉산드로 디아만티가 찬 공이 골대를 맞고 우루과이 골키퍼 페르난도 무슬레라를 거친 뒤 골라인 위에 주춤하던 순간, 이탈리아의 다비데 아스토리가 밀어넣었다. 공은 확실히 라인을 넘었다. 골! 그런데 누가 성공시킨 것인가? 처음 슛을 찬 디아만티에 의해 공이 라인을 넘어갔는가, 아니면 아스토리가 뒤늦게 밀어넣었는가. 곧 첨단 애니메이션 그래픽이 등장해 디아만티가 찬 공이 골라인을 완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흰색 선 위에 걸쳐 있음을 보여주었다. 득점자는 아스토리로 결정됐다.
이것이 왜 축구사의 중요한 한 장면인가. FIFA가 수많은 논란 끝에 역사상 최초로 실전에 투입한 ‘골라인 판독 기술’(GLT·Goal Line Technology)이 처음 적용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 한 장면을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얼마나 울었단 말인가.
2010년 10월,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골라인 판독 기술 기준을 발표했다. ‘공이 골라인을 넘어갔는지 1초 이내에 즉각적으로 판독해 곧바로 심판에게 알릴 것’. 이 분야의 첨단 기술을 보유한 10개 기업이 연구·개발에 돌입했으나 당시 제시된 개발 기간이 겨우 4개월 남짓했기 때문에 이듬해 2월의 테스트에서는 아무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IFAB는 1년의 연구·개발 기간을 더 주었고, 2012년 3월 9개 회사가 다시 테스트에 참가했다. 이를 스위스연방재료과학기술연구소(EMPA)가 테스트해 일본 소니사가 개발한 ‘호크아이’(Hawk Eye)와 독일-덴마크 합작회사가 설계한 ‘골레프’(GoalRef), 그리고 독일의 골컨트롤사가 개발한 ‘골컨트롤’(Goal control)이 기술 승인됐고 그중 골컨트롤이 2014 브라질월드컵 기술로 최종 낙점을 받았다.
축구의 제도와 규칙과 장비에 대해 최상위 결정기관 역할을 하는 IFAB가 이 테스트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IFAB는 FIFA(1904년)보다 훨씬 먼저 1886년에 설립됐다. 유니폼·축구화·축구공·잔디 같은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오프사이드, 페널티킥, 득점 인정 여부 등 사실상 축구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한다. IFAB가 늘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한때는 스로인 대신 킥인을 검토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한 번에 골문 앞으로 찰 수 있게 되자 ‘뻥축구’가 벌어졌다. IFAB는 곧 철회했다. 체력 소모에 따른 판단력 저하를 고려해 2명의 주심을 전·후반에 교체 투입하는 것도 고려했으나 ‘경기 흐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철회했다. 아무튼 축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IFAB가 골라인 판독 기술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곧 그러한 첨단 기술이 축구장에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FIFA는 이 기구의 결정을 받아들여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판독 기술 골컨트롤을 투입하게 된 것이다.
본질 침해하는가 아님 왜곡하는가
그동안 ‘심판의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전통적인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과 유로 2012에서 골 판정과 관련한 결정적 오심이 거듭 발생하면서 판세는 기술 도입 쪽으로 기울었다.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은 “기계에 대한 의존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계에 대한 의존을 불러올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범하는 실수보다 더 위험하다”면서 기술 장치 도입을 반대해왔다. 그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6심제다. 양쪽 골대 바로 옆 엔드라인에서 부심이 위치해 공의 골라인 통과 여부, 시뮬레이션 반칙, 페널티 에어리어 박스 내 파울 등을 판단해 주심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러한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2010 월드컵에서는 잉글랜드의 프랭크 램파드가 찬 공이 독일 골문 안에 확실히 떨어졌음에도 주심이 인정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했다. 유로 2012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슛이 잉글랜드의 골라인을 넘었음에도 이를 심판은 판정하지 못했다. 이 경기 바로 전날, 플라티니는 “6심제로 인해 유로 2012에서 심판들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됐다”고 인터뷰까지 했는데 그만 오심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FIFA는 판독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차기 FIFA 회장으로 유력한 제롬 샹파뉴 전 FIFA 국제국장, IFAB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그레그 다이크 잉글랜드 축구협회장, 휘스 히딩크 같은 유럽 축구계의 거장들이 기술 도입을 주장해왔다.
결국 이 방향이 순방향이다. 기술 도입은 시기의 문제였을 뿐 언젠가는 그렇게 될 일이었다. 다만 즉각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논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천천히 도입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축구장에 심판이 처음 등장한 것이 1874년인데 호각을 사용한 것은 1878년이다.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는 1970년에 도입됐고, 심판들이 긴급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헤드셋 장치도 2006년 독일월드컵 때 도입됐다. 프리킥 상황에서 공 위치와 수비진의 거리를 확실하게 하는 ‘배니싱 스프레이’는 2013년에야 도입됐다. 그러한 소도구를 도입하는 데 수많은 논쟁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중요한 것은 호각, 헤드셋, 배니싱 스프레이, 골컨트롤 같은 기술이 아니다. 호각이나 헤드셋이나 스프레이가 무슨 첨단 기술인 것도 아니다. 전파상이나 문방구에서도 살 수 있다. 문제는 어떤 도구나 기술을 도입했을 때 축구가 어떤 양상으로 변할 것인가, 그 변화는 축구가 가진 본질을 침해하는가 아니면 왜곡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세계 축구인들이 오랫동안 논쟁하고 검토하고 숙의했다는 점, 그것이 중요하다.
정윤수 축구평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협치 물꼬 대신 복장 터졌다’…윤-이 회담 뒤 격해진 여야

윤 대통령, 21개월 만에 기자회견 예고…또 ‘일방소통’ 나설까

법원, 정부에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제출하라”

“이거 봐~윤석열이! 내 말 들어” 백기완이라면 외쳤을 ‘따끔한 말’

2심 법원도 “윤 대통령 한식당 450만원 지출비 공개하라”

검찰, 이정섭 검사 자택 압수수색…포렌식 업체도

서울대병원·세브란스·고대병원 휴진…‘셧다운’ 없었다

“전신 중화상, 1살 하연이를 도와주세요” 소셜기부

‘아홉 살 때 교통사고’ 아빠가 진 빚…자녀가 갚아야 한다, 서른 넘으면

주택공급 통계서 19만건 누락한 정부…“전셋값 상승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