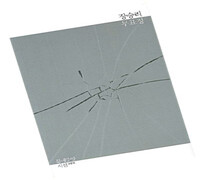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자서전 제목은 ‘이야기하기 위해 살다’이지만 소설가가 아닌 우리에게는 ‘살기 위해 이야기하다’라는 말이 더 실상에 가까울 것이다. 우리는 대체로 ‘나’라는 서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왔고 또 진행될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내가 ‘나’라는 서사의 주인공인 동시에 작가라고 믿는다. 그러다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서사의 흐름에 균열이 오거나 반전이 생기면 ‘다시 쓰기’를 해서 그 사건을 내 삶 안으로 통합해낸다. 예컨대 예기치 못한 이별을 겪고 나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라는 노래 제목을 떠올리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다.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는 소설 <칠레의 지진>에서 1647년 칠레 산티아고 대지진이란 불행 앞에 선 사람들의 심리를 그렸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가끔 타인의 삶도 나의 관점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하곤 한다. A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할 때, 우리는 ‘A의 서사’ 혹은 ‘A라는 서사’의 인과관계를 다듬어서 더 매끄러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타인의 재난과 관련된 것일 때 그것을 서사화하는 행위는 지극히 조심스러운 일이 된다. 자칫 비윤리적인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개는 서사화를 포기하고 그저 재난의 당사자가 무사히 그 사건을 자신의 서사 안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다. 지금 전세계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소한의 예의를 내던지는 이들이 있다.
“일본 대지진으로 사망·실종만 2500여 명, 연락 불통 1만여 명입니다.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시는 하느님께 조상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직 경기도지사가 트위터에 올린 문장이다. 최초의 반응이 공포와 안도인 것은 인지상정이다. 저런 끔찍한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나 그 느낌을 공적으로 발설하는 것은 무례하고 유아적인 행위다. 하긴 ‘한류 열풍 타격’을 걱정하고 ‘한국 기업의 반사이익’을 계산하는 이들에 비하면 차라리 양호하다 해야 할까. 타인의 재난 앞에서 나의 목숨과 재산을 먼저 챙기는 태도는 서사화에 미달하는 동물적인 반응이어서 정색하고 논의할 가치가 없어 보인다.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는 소설 <칠레의 지진>
그런데 더 심각한 사례가 있다. “일본은 집집마다 섬기는 신이 있다고 한다. 무신론자도 많다고 한다. 물질주의가 발달해서 하느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한다. 이런 것에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느님의 경고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서울 여의도에서 신도 수가 45만 명인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분은 타인의 재난에 ‘범죄와 처벌’이라는 인과관계를 부여해 서사를 만들었다. 자연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원시 신앙의 세계관에 근거하는 이 플롯은 세상의 모든 작가들이 마지막까지 피해야 할 최악의 플롯이다. 종교적 도그마는 훌륭한 서사가 지향하는 재난의 개별성을 완전히 뭉개버린다.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의 (1807)이라는 소설이 있다. 종교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경한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있어 남자는 감옥에 있고 여자는 막 처형되려는 참이다. 그때 1647년 칠레 산티아고 대지진이 일어난다. 지진 때문에 오히려 목숨을 건지고 해후한 두 연인은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된 아이러니 앞에서 죄책감을 느낀 나머지 위험을 무릅쓰고 생존자들의 기도회에 참석한다. 그때 누군가 그들을 알아보고 외친다. “저들 때문에 이 재난이 닥쳤다.” 광신의 난도질로 연인들이 도륙되면서 이 이야기는 끝난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 이 땅에 모종의 재난이 일어나 여의도의 그 교회마저 피해를 입는다면 그곳에서는 어떤 서사가 탄생할까?
‘우리 중에 다신교, 무신론, 물질주의에 빠진 죄인이 있어 하느님이 벌을 내린 것이다. 죄 없는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도 그들 때문이다.’ 이런 서사가 완성되면 현실에서 클라이스트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어떤 이들의 신은 마치 정기적으로 세금을 걷어가고 ‘나와바리’를 관리하면서 불복종에는 피로 보복하는 특수직종 종사자처럼 보인다. 그 신은 인간의 천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들의 배후에 있는가. 나는 인간이 더 인간다워지기 위해 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신이 더 신다워지기 위해 인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학의 임무 중 하나는 바로 이 저급한 이야기꾼들의 서사와 싸우는 것이다.
문학평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윤석열 탄핵 재판 선고 다음주로 넘어가나

삭발·단식·밤샘…“윤석열 파면” 시민들 총력 집회

전직 판사들 “윤 구속취소 무책임”…지귀연 결정 2가지 아킬레스건

휘성 비보에 예일대 의대 교수 “한국엔 이곳 터무니없이 부족”

도올, 윤석열 파면 시국선언…“헌 역사의 똥통에서 뒹굴 이유 없다”

여성경찰관, 트로트 가수 집 주소 알아내 찾아갔다 검거돼

홍준표 아들, 명태균에 “가르침 감사”…명, 홍 시장에 정치 조언?
![[단독] 홍준표 아들, 명태균과 직접 연락…“창원산단 만드신 것 축하” [단독] 홍준표 아들, 명태균과 직접 연락…“창원산단 만드신 것 축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311/53_17416827730809_4217416827598379.jpg)
[단독] 홍준표 아들, 명태균과 직접 연락…“창원산단 만드신 것 축하”
![[사설] 윤석열 석방에 온 나라 혼란, 헌재 파면 선고 서둘러야 [사설] 윤석열 석방에 온 나라 혼란, 헌재 파면 선고 서둘러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311/53_17416859407665_20250311503725.jpg)
[사설] 윤석열 석방에 온 나라 혼란, 헌재 파면 선고 서둘러야

“이승만 내란죄로 처벌했어야…윤석열 계엄과 성격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