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30일에 방송된 ‘나는 가수다’에서 이소라는 (이현우, 1991)를 불러서 7위를 했다. 애초 준비했던 곡을 리허설 시작 4시간 전에 포기하고 급히 준비한 곡이라던가. 순위에 연연했다면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순위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있었을 것이다. 바로 그날, 그녀가 하고 싶고 또 할 수 있는 노래여야만 한다는 것. 어떤 자리이건 어떤 장르이건 능란하게 소화해내는 이가 프로일 것이지만,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는 예술가일 것이다. 존재의 필연성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 말이다. 그들은 말한다. ‘난 그런 것은 할 수 없어요. 어제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일도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군요. 그러나 지금은, 지금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진심이 발생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다. 예술 창작자가 진심을 강조하는 모습은 너무 흔해서 진부하게 느껴진다. 진심을 다해 노래하겠다는 말도 별 감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진심이 아니면 부를 수 없다는 말은 좀 달리 들린다. 전자는 의지의 영역, 후자는 기질의 영역에 속할 것이다. 고통스러운 진심으로 부를 수 있어 택한 노래를 그녀는 조용히 불러나갔다. 몇몇 가수들은 관객에게 흥분제를 투여하고 싶어 했지만(쉽지 않은 일이고 그들은 잘해냈다), 그녀는 자신의 노래를 진통제를 먹듯 씹어 삼키고 있었다. 특히 3분30초 무렵에 “그대만을 사랑하는 걸”이라는 가사를 노래할 때 그녀는 마치 신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대목에서 나는 고통받는 예술가를 바라볼 때 느끼게 되는 가학적인 감동에 휩싸여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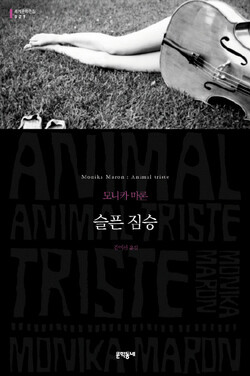
위에서 진통제 운운한 것은 그녀의 어떤 노래가 몇 년 전 내게 남긴 충격의 반향일지도 모른다. 7집(2008)에 수록된 ‘Track 7’(이 앨범의 모든 곡에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다)의 노랫말을 그녀가 썼다. “지난밤 날 재워준 약 어딨는 거야/ 한 움큼 날 재워준 약 어디 둔 거야/ 나 몰래 숨기지 마, 말했잖아, 완벽한 너나 참아/ 다 외로워, 그래요, 너 없는 난/ 눈을 뜨면 다시 잠을 자, 난, 난// 몸이라도 편하게 좀 잔다는 거야/ 나 몰래 숨기지 마, 난 있잖아, 술보다 이게 나아/ 다 외로워, 그래요, 너 없는 난/ 눈을 뜨면 다시 잠을 자, 난, 난.”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종류의 고통을 적어내려간 노랫말이라니.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녀는 고통을 잊기 위해 수면제를 달라고 탁한 목소리로 애원한다. 그리고 정확히 마지막 “난”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무너진다.
“완벽한 너나 참아”나 “술보다 이게 나아”와 같은 구절들은, 칼을 들고는 있으되 그 누구를 찌를 힘이 없어 허우적대다가 그만 제 몸에 상처를 입히고 마는, 그런 사람 같다. 이 문장들이 전달하는 뉘앙스가 이미 그렇듯이, 가끔 그녀는 관객에게 노래를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너무 오래 단둘이 있지 않기 위해서 무대에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그녀는 자신의 고통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그녀의 고통은 수다스럽지 않다. 비평가들의 말투로 말하자면, 진정한 고통은 침묵의 형식으로 현존한다. 고통스러운 사람은 고통스럽다고 말할 힘이 없을 것이다. 없는 고통을 불러들여야 할 때 어떤 가수들은 울부짖고 칭얼댄다. 그녀 덕분에 나는 고통의 예술적 위력에 대해 생각해야 했다.
문학의 경우는 어떨까. 이소라의 체념적인 고통의 노래들을 들으며 아니 에르노나 모니카 마론을 떠올리는 일은 창의적이지 않다. 자신을 떠난 연인을(이 연인은 주체를 짓밟는 ‘운명’과 ‘역사’의 은유이기도 한데) 잊지 못하는 여자의 고통을 한심하도록 솔직하고 무섭도록 담담하게 표현할 줄 아는 작가들이다. 분량을 고려한다면 아니 에르노의 (2002)은 ‘고통’이라는 단어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작품일 것이다. “나는 늘 내가 쓴 글이 출간될 때쯤이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글을 쓰고 싶어 했다.” 모니카 마론의 (1996)은 근래 읽은 고통의 기록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그렇듯 나도 젊었을 때는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닮아 있는데 그것은 이 소설들이 고통에 대해 말하는 작품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문학평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집념의 최가온, 눈발 속 가장 높이 날았다…금메달 확정 뒤 눈물 펑펑

‘충주맨’ 김선태 97만 구독자 남기고 떠난다…충주시 “갑작스러운 퇴사”

“이 꼬마가 9년 뒤 올림픽 금메달” 최가온 과거 ‘보드가족’ 영상 화제
![이 대통령 지지율 63% ‘새해 최고치’…경제·부동산 정책 영향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63% ‘새해 최고치’…경제·부동산 정책 영향 [갤럽]](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13/53_17709467626139_5417709467444852.jpg)
이 대통령 지지율 63% ‘새해 최고치’…경제·부동산 정책 영향 [갤럽]

이 대통령 “다주택자 성공은 이 정부 실패 의미” 연이은 부동산 메시지

김여정 “정동영 무인기 유감 표명 다행…재발 방지에 주의 돌려야”

“최가온 자랑스러워요”…환하게 안아준 ‘우상’ 클로이 김의 품격
![[속보] ‘돈봉투 의혹’ 송영길 항소심서 모두 무죄…“증거 위법 수집” [속보] ‘돈봉투 의혹’ 송영길 항소심서 모두 무죄…“증거 위법 수집”](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13/53_17709566544993_20260213501445.jpg)
[속보] ‘돈봉투 의혹’ 송영길 항소심서 모두 무죄…“증거 위법 수집”

국정원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지난해 연말부터 ‘서열 2위’ 부각”

‘박근혜 오른팔’ 이정현, 국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 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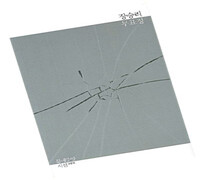















![[속보]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 [속보]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12/53_17708767345627_202602125028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