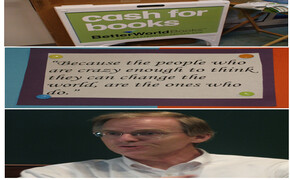대학 대동제(축제)는 즐겁다. 함께 떠나는 MT는 가슴 설렌다. 그러나 즐거운 시간을 소비한 대가로 남는 것은 수북한 쓰레기다. 영국 런던에서는 그런 점이 늘 가슴에 무겁게 남은 한 젊은이가 있었다. 조지프 올리버(25). 미술을 전공하던 학부 시절, 그는 뛰어난 감각을 인정받아 대학 내 파티를 늘 주관했다. 그의 가슴을 누르는 것은 파티의 결과물이었다.

눈이 가득 쌓인 런던의 거리에 찍힌 커브의 눈 스탬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였다. 대형 비닐 쓰레기봉투를 늘 70개 이상씩 썼다.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했지만, 사람들은 그냥 내던지고 버렸다.” 그때의 아린 경험들이 그를 친환경 엔터테인먼트 창업이라는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지난 5월 초, 런던의 ‘배시 크리에이션’(Bash Creation)에서 그를 만났다. 배시는 올리버가 2007년에 창업한 친환경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노란색 재킷 사이로 3개의 목걸이가 눈을 사로잡았다. 그가 하는 일은 “환경적으로 무해하고 탄소중립적인 나이트클럽이나 놀이 장소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시의 본사 겸 사무실인 ‘예술 전시관’이 대표적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력은 100%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로 해결한다. 2주에 한 번씩 회사 건물의 지하에서는 ‘클럽’이 열린다. 시끄러운 음악과 밤새 이어지는 춤은 여느 클럽과 다를 바 없다. 다른 것은 실내장식이다. 클럽의 모든 인테리어 자재는 공사 현장의 폐목재를 활용해 만들었다. 클럽 실내장식은 수시로 바꿔줘야 하기에 배시 건물 옥상에는 폐목재들이 늘 가득하다. 열정적으로 춤을 추던 클러버들이 지친 몸을 기대는 소파도 버려진 걸 리폼한 것이다. 클러버들이 지켜야 할 덕목은 또 있다. 병을 차거나 깨서는 안 된다. 새벽까지 클럽 바닥을 굴러다니던 병들은 다음날 아침 ‘런던 지역 재활용 네트워크’(LCRN)에서 재빨리 수거해간다(런던에서는 아직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
물론, 배시의 꿈은 모든 클럽과 놀이 장소가 이런 환경을 갖추는 것이다. 배시는 각급 학교나 커뮤니티, 동아리 등의 의뢰를 받아 친환경적인 파티장을 만들고, 파티가 끝난 뒤의 뒷정리와 재활용까지 모두 대행한다. 이 과정에서 파티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이다.
친환경이 이제 모든 기업들의 ‘상표’가 된 상황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고 물었다. 옆에 있던 대니얼 실버튼이 거들었다. “우리는 환경과 사회를 많이 고려한다. 환경과 사회에 대한 것은 우리 사업의 부가적인 부분이 아니라 본질이다.” 그는 테이블 위의 볼펜을 가리켰다. “이 볼펜은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 이 안에 든 잉크도 재생 잉크다. 칠판 페인트는 친환경 페인트다. 분필도 재생된 것이다. 이 회의실에 있는 책상·의자뿐만 아니라 사무실의 물품 대부분이 재생 제품이거나 중고품이다.” 환경을 하나의 부가적 수단이 아닌, 자신들의 정신으로 삼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커브에서 가장 선호하는 로그로 방식의 광고. 색색의 풀과 돌을 이용한 광고판이다.
그런 배시의 정신을 보여주는 또 하나는 배시엔 직위가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최고경영자(CEO)라고 해야 할 올리버의 명칭은 ‘내비게이터’. 길잡이란 뜻이다. 실버튼은 ‘크리에이티비티’(Creativity). 굳이 번역하자면 창조자쯤 될까. 이 밖에 ‘스트래티지’(Strategy·에리카 프로브스트), ‘커뮤니티’(Community·에마 로드리제스), ‘서스테이너빌리티’(Sustainability·클레멘트 메이어트) 등 각각의 분야로 호칭을 대신한다.
올리버는 배시의 역할을 “새로운 방식의 지역사업”이라고 표현했다. “우리가 소비한 자원은 쓰레기가 된다. 그 쓰레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알리는 캠페인과 이벤트, 그리고 그 직접적인 재활용 사업을 배시가 담당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는 일을 한다. 개개인의 습관이 달라진다면 세상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 습관 달라지면 세상 달라져”
배시의 관심이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있다면, 런던의 또 다른 거리에서 만난 ‘커브’(mindthecurb.com)는 환경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관심이 있었다. ‘남들과 조금 다른 가치를 가진 광고회사’ 커브의 이야기를 대표인 앤서니 갠조(27)를 통해 들었다.
기업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광고를 내놓는다. 시간이 지난 광고는 잊히고 쓰레기가 된다. 종이에 인쇄된 광고도, 거리에 세워진 광고판도. 그러나 커브의 광고는 다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된다.
커브는 지난해 8월에 문을 열었다. 초기부터 주목을 받은 커브의 광고 방식은 ‘환경 그 자체’다. 모래와 풀, 먼지, 도심을 뒤덮은 폭설이 커브의 광고판이다. 갠조는 그중 ‘로그로’(Logrow) 방식을 가장 선호한다고 했다. 공터나 정원 아니면 논밭에 색깔이 서로 다른 풀을 심고 돌을 얹어 의뢰인이 원하는 광고 이미지를 만든다. 보통 2개월 정도 지속된다. 그 뒤에 광고를 목적으로 심은 풀은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에 보탬이 되는 광고는 얼핏 듣기에도 새롭다.
갠조가 맨 처음 착안한 광고 아이디어는 ‘거리 청소’였다. 자동차 매연과 흙먼지로 거무튀튀한 길바닥을 광고판으로, 청소를 광고 도구로 이용한 것이다. 필요한 것은 비 오는 날씨와 청소용 솔뿐이었다. 비 오는 날 솔로 런던의 길바닥과 벽을 문지르고 다닌다. 먼지와 때를 벗기면서 글자와 로고를 만드는 것이다. 비가 걷힌 거리에는 기업의 로고와 광고 문구가 남는다.
지난겨울 런던을 강타한 20년 만의 폭설은 커브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눈이 갠 아침 갠조를 비롯한 커브 직원들은 커다란 스탬프를 들고 길을 나섰다. 2천 개가 넘는 로고가 주차된 차량과 우체통, 벽 등 런던 전 지역을 뒤덮었다. 갠조의 비장의 아이디어였다. 런던 사람들은 눈 위에 찍힌 수많은 로고에 관심을 보였고, 언론들은 일제히 커브 기사를 다뤘다.
부모님 집의 지하실에서 시작한 커브는 점차 커지는 중이다.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미국에도 진출했다. 갠조는 바빴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계속 블랙베리(전자우편 송수신이 가능한 PDA)는 삑삑거렸고, 휴대전화는 쉴 새가 없었다.

클럽 내부를 꾸미는 데 쓸 폐목재와 폐자재들로 가득한 배시의 옥상. 이를 실내장식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배시 직원들의 임무다.
올해 매출은 50만파운드(약 10억원)에서 100만파운드(약 20억원)를 예상한다고 한다.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12만파운드(약 2억4천만원)가량을 나무를 심는 데 쓸 계획이다. 이 활동은 7월에 시작한다. 커브의 광고물 하나당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기본으로 더 많은 방식을 찾는 중이다. 아직 첫돌도 맞지 않은 회사가 환경을 위해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놀라웠다.
물론, 친환경 광고를 하는 것이 커브만은 아니다. 광고업계에서는 이를 ‘내추럴 미디어’라고 부른다. 재활용이 되는 소재로 광고를 한다든지, 태양광발전 등을 통해 광고판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식이다. 여기에서 커브가 차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생각의 시작부터 달랐기 때문이다. 다른 광고업체는 기존 광고 방식의 연장선에서 친환경 광고를 생각했다. 하지만 커브는 처음부터 자연물을 이용한 광고만을 추구했다. 영국 언론에서는 이런 커브에 환경(eco)과 광고(advertising)를 합성한 ‘에코버타이징’(eco-vertising)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했다. 갠조는 “에코버타이징은 우리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단어다. 우리는 자연적 매체를 활용하는 것에 집중하는 기업이다. 커브는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광고를 한다”고 말했다.
그에게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요소다. 단돈 2천파운드(약 400만원)로 시작해 지금까지 커브를 키울 수 있었던 힘은 오로지 아이디어였다. 다른 기업에서 같은 방법으로 광고를 따라 한다면 커브만의 독창성은 금방 훼손될 수밖에 없다. 갠조는 현재 커브에서 하는 모든 광고 방식에 대한 특허를 출원 중이라고 했다. 갠조는 “커브는 광고업계에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을 보여주며 영감을 줬다”며 ““다른 기업이 우리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광고하고 싶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흐름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사회혁신기업이 가진 호혜성과 공개성과는 다른 측면을 보이는 지점이다. 물론, ‘모방’이란 또 다른 형태의 도둑질이니, 커브만을 탓할 수는 없어 보인다.
지속 가능성과 부가가치 창출
커브는 또한 의뢰 기업의 성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했다. 상대 기업이 도덕적 논란에 휩싸였다고 해서 광고를 거부하진 않는다는 의미다. 친환경 광고로 기업을 홍보할 뿐, 그 기업이 친환경적인지 아닌지는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갠조는 “우리가 사회적 목적만을 위한 단체였다면 지금처럼 널리 알려진 기업들과 일할 수 없었을 것이다. 21세기의 고객은 다양한 가치 가운데 좀더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것을 선호하고 있다. 결국 고객이 최고이기 때문에 기업은 좀더 친환경적인 것을 바라는 고객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기업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친환경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자평했다.
커브는 좀더 다양한 광고 방식을 통해 친환경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갠조는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닮고 싶다. 다국적이고 덩치 큰 회사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 창의성과 혁신성을 닮고 싶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말을 마친 그는 가벼운 목 인사와 함께 끊임없이 울려대는 블랙베리와 다이어리를 챙겨 런던 거리를 향해 걸어나섰다.

런던(영국)=글·사진 이미선 인턴기자 i79610@hanmail.net·임다희 인턴기자 dahee9928@hotmail.com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 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뒤 최고…“다주택 정책 잘했다” 62% [NBS] 이 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뒤 최고…“다주택 정책 잘했다” 62% [NBS]](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6/53_17720725126758_20260226501531.jpg)
이 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뒤 최고…“다주택 정책 잘했다” 62% [NBS]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안귀령 황당 고발’ 김현태, 총부리 잡혔던 전 부하 생각은?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농지 전수조사’ 준비 착수…매각명령, 매해 1000명서 대폭 늘 듯

이 대통령 “불법 계곡시설 허위보고한 공직자들, 재보고 기회 준다”

국힘,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 입장 정리

기초연금 개편, 차등 지급·수급자 감축 검토

국세청 직원과 싸우다 던진 샤넬백에 1억 돈다발…고액체납자 81억 압류

‘불륜 파묘’ 빌 게이츠 “러시아 여성 2명 만나…엡스틴 피해자 아니다”


![[함께하는 why not] 좋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여행](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resize/2009/0818/125049023993_2009081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