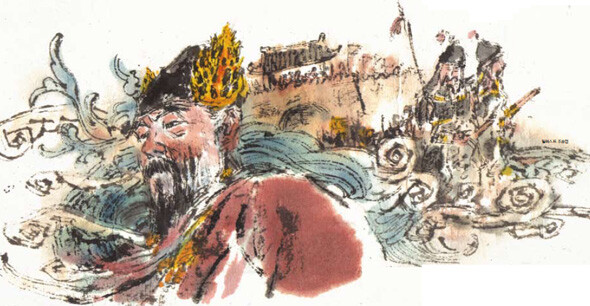어디에도 기록이 없다.
조선 중기 시인 민제인의
‘백마강부’란 시에
문학적인 수식어로
처음 등장할 뿐.
그리고 일제시대
대중가요 의
애절한 곡조가
백제 망국과 묘하게
어우러져 대중에게
역사로 각인된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전성기 때 느닷없이
망한 국가는
백제밖에 없다.
요절한 국가! 백제,
그리고 역사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의자왕!
이제 ‘삼천궁녀’와
‘호색한’으로 왜곡된
의자왕을 복권시켜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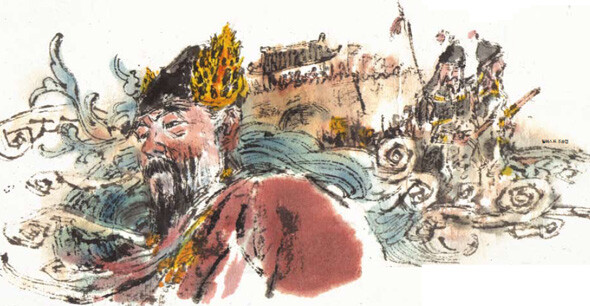
의자왕은 승리할 수 있었다. 일러스트 조승연
우리 역사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왕은 누굴까?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광활한 만주 벌판을 확보한 광개토대왕이 아닐까? 그런데 이 두 대왕에 버금가는 인지도를 자랑하는 왕이 있다. 백제 마지막 왕, 의자왕이다! 의자왕에게는 '대왕'이란 수식어는 없지만 '삼천궁녀'라는 수식어가 있다! 삼천궁녀와 의자왕!
삼천궁녀는 사서 어디에도 기록이 없다. 백제가 멸망하고도 1천 년이 다 된 조선 중기 시인 민제인의 ‘백마강부’란 시에 문학적인 수식어로 처음 등장할 뿐. 그리고 일제시대 대중가요 의 애절한 곡조가 식민지 조선의 비애와 백제 망국이 묘하게 어우러져 대중에게 역사로 각인된 것이다. 삼천궁녀는 없었고 존재할 수도 없다. 그러나 어쩌랴? 삼천궁녀의 허구성을 아무리 강조하고 의자왕은 당시 일흔을 바라보는 노인이었음을 상기해도 우리 머릿속엔 삼천궁녀의 치마폭에 휩싸여 방탕하게 놀고 있는 장년의 의자왕이 그려질 뿐! 그것은 망국의 왕이 안아야 할 숙명이었다.
우리 역사에서 660년 6월21일부터 7월18일까지는 가장 처절한 한 달이었다. 서해는 백제에 천연의 요새다. 서해를 건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틀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군수품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660년 당시 중국의 국력으로 대군이 바다를 건너 지속적인 군수품 보급 속에 백제 정벌을 감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버렸다. 당나라군이 산둥반도를 출발해 인천의 덕적도에 도착한 것은 660년 6월21일이었다. 5월26일 경주를 출발한 신라군 5만 명이 북쪽으로 진군해 지금의 경기도 이천에 도착한 것이 6월18일. 신라의 대군이 북상하는 걸 백제가 몰랐을 리 없다. 그러나 신라 경내에서 북상하는 경로는 당연히 고구려를 공격할 진군로였다. 비상경계령 속에 백제군은 신라군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당군은 6월21일 신라 함선 100척이 싣고 온 군수품을 보급받는다. 아무리 빨라야 6월23일께야 백제는 나당 연합군의 공격 목표가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군과 먼저 싸우자는 주장과 신라군과 먼저 싸우자는 주장이 대립하고, 의자왕은 결론을 못 내린다. 이 대책회의는 두고두고 의자왕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용된다. 그러나 의자왕의 주저함은 당연한 것이었다. 당시 신라나 백제가 동원 가능한 군대는 최대 5만 명이었고 실제 전투 병력은 3만 명 정도였다. 백제군 5만 명은 전통적인 5방 방어 체계에 따라 지방에 주둔했다. 당군이 어디로 상륙할지 모르는 상태였고, 동서 양쪽으로 진격하는 나당 연합군의 양동전도 백제군이 방어선을 구축하기 곤란하게 했다. 군대를 나누자니 그나마 부족한 전력이 더 부족해지고, 한쪽으로 집중하자니 다른 쪽에 치명적인 허점을 보이게 된다. 평생을 전장에서 단련된 백전노장 의자왕도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나당 연합군은 예측을 뛰어넘는 엄청난 속도로 진격하고 있었다. 당군은 뱃길로 하루면 백제의 어디든 상륙할 수 있었고, 신라군은 매일 20km를 강행군하고 있었다. 인민군이 한국전 때 서울에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오던 속도에 맞먹는 진군 속도였다. 삼국시대의 보편적 전술은 거점성 점령 뒤 주변을 평정하고 차근차근 진군하는 것이었다. 성을 두고 전진했다가는 보급로가 차단돼 싸우기도 전에 굶어 죽는다. 그러나 신라군은 고대 전투의 기본을 무시해버렸다. 수나라 100만 대군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요동에서 평양까지 늘어선 성을 도저히 뚫을 수 없었다. 그러자 별동대 30만 명으로 수도 평양을 직공하다 전원 몰살당한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될 것이다. 신라 5만 대군은 수나라 별동대가 사용한 전술을 구사했다. 이 전쟁의 목표는 영토 확장이 아니라 백제 멸망이었기 때문에 백제군의 중간 방어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사비성으로 내달리는 전술을 택한다. 짧은 시간 안에 의자왕을 체포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전술이었지만 당군 13만 명이 있기에 해볼 만한 작전이었다.
나당 연합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던 의자왕은 신라군 없이는 당군이 섣불리 싸우지 못한다는 것을 간파한다. 지방에 있는 5방군이 사비로 집결할 때까지 신라군을 사비 외곽에 묶어두기만 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의자왕은 계백의 5천 결사대에 신라군 저지 임무를 맡긴다. 서쪽의 13만 당군 때문에 더 이상 빼내는 것은 위험했다. 계백은 백제가 이기든 지든 자신들은 신라군과의 전투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충남 논산시 연산면의 황산벌에 진을 친다. 소수의 병력이 들판에서 대군을 맞이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지만 계백은 고육지책을 사용한 것이다. 10 대 1, 절대 열세지만 백제군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었다. 신라군의 진군을 막기만 하면 됐기에 계백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황산벌 전투 재현 모습.세계대백제전 조직위원회 제공
660년 7월9일부터 10일까지 황산벌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다. 그러나 5만 신라군은 죽기로 버티는 백제 5천 결사대의 철벽 방어선을 뚫을 수 없었다. 5천 결사대의 처절한 투혼은 신라군의 파상 공세를 네 번이나 막아냈다. 이렇게 되자 7월10일 사비 남에서 당군을 만나기로 한 김유신은 다급해졌다. 김유신은 어린 관창을 사지로 몰아넣어 신라군을 충동시키는 극약 처방을 내린다. 신라군은 진법이고 뭐고 필요 없이 일시에 5만 대군으로 백제군을 덮쳤을 것이다. 말 그대로 짓밟고 진군하지 않았을까? 이 전술은 아군의 피해도 막대하기 때문에 가장 하책이지만 당시 신라군의 처지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황산벌 전투는 우리 역사에서 극적인 긴장도가 가장 높고 장엄한 비장미가 넘친다. 논산시에서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대규모 황산벌 전투를 공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대단히 재미있고 스케일도 있는 공연이었다. 잘만 다듬으면 세계적인 공연예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백제 멸망 당시 황산벌 전투보다 더 큰 전투는 당군과의 전투였다. 계백의 5천 결사대는 백제 주력군은 아니었다. 의자왕은 주력군을 13만 당군 쪽으로 배치한다. 황산벌에서 전투가 벌어진 7월9일 당군은 금강 하구의 기벌포로 상륙했다. 최전방에는 버드나무로 짠 자리를 펼쳐든 신라수군이 앞장섰다. 당군은 백제군의 저지를 뚫고 버들자리를 딛고 갯벌을 통과해 상륙에 성공한다. 7월10일 백제군은 사비 남쪽에서 다시 한번 당군과 결전을 벌이지만 1만의 사상자를 내고 패퇴한다. 사실상 사비 방어선이 무너진 것이다. 7월11일 신라군이 당군과 합류하고 7월12일 사비의 외곽성인 나성이 무너지고 왕궁이 포위당한다. 결국 개전 5일째인 7월13일 의자왕은 사비 방어전을 포기하고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지휘부를 옮겨 2차 방어선을 구축한다. 그날 밤 사비도성은 나당 연합군에 함락됐다.
대규모 나당 연합군을 방어하기엔 웅진성은 효과적이었다. 지금 공주의 공산성인 웅진성은 험준한 벼랑과 백마강으로 삼면이 둘러싸여 농성전에는 적격이다. 또 예산의 임존성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도 유리한 상황이다. 임존성은 훗날 백제 부흥군이 나당 연합군과 3년 동안 싸울 때 마지막까지 버틴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의자왕은 웅진성에 총사령부를 설치하고 임존성과 함께 나당 연합군을 견제하면서 전력이 보존돼 있는 지방군이 나당 연합군을 4면에서 포위해 공격해오기를 기다렸다. 지형지물에 익숙한 백제군이 나당 연합군을 분산시키고 유격전을 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다급해진 것은 오히려 나당 연합군이었다. 개전 5일 만에 사비도성을 함락했지만 연합군 지휘부는 의자왕을 놓치는 결정적인 실패를 했다. 의자왕은 18만 대군을 깊숙이 끌어들인 뒤 웅진으로 피해버린 것이다. 나당 연합군에 또 하나 큰 위협은 18만 대군의 식량이었다. 전투 중에 사비도성의 백제군 군량은 불타버렸다. 그런데 신라에서 오는 보급품은 동쪽 백제 국경의 산성들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도성을 목표로 신속히 진군한 탓에 산성에 농성 중인 백제 병력이 건재했고, 이들은 연합군의 보급 통로를 봉쇄한다. 실제 훗날 백제 부흥군이 이곳을 차단해 사비의 2만 명도 안 되는 당군이 식량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고, 이 보급로를 뚫기 위해 당군 1천 명이 공격에 나섰다가 전멸한 적이 있다. 18만 나당 연합군은 의자왕을 웅진성에 가두었지만 그들 역시 사비와 공주에 갇힌 신세가 돼가고 있었다. 이제 시간은 의자왕의 편이었다.
의자왕이 웅진성에서 농성전을 이끌고 있을 때 웅진방어사령부의 실질적인 지휘관은 웅진방령 예식 장군이었다. 그런데 의자왕은 항전 10일째인 660년 7월18일 갑자기 항복하고 만다. 백제본기에는 의자왕이 항복하는 상황에 대해 “의자왕 및 태자 효가 제 성주들과 함께 항복했다”(王及太子孝與諸城皆降)라고 기록하고 신라본기에는 “의자왕이 태자 및 웅진방령군을 거느리고 웅진성에서 나와 항복했다”(義慈率 太子及雄鎭方領軍等. 自雄津城來降)고 돼 있다. 그런데 에는 그 대장 예식이 의자왕과 함께 항복했다(其大將植 又將義慈來降)고 했고 보다 200년 앞선 945년에 편찬된 에도 “그 대장 예식이 의자왕과 함께 항복했다”(其大將植 又將義慈來降)라고 기록했다. 특이하게도 의자왕이 항복하는 장면을 서술하는 데 모두 의자왕이 주체가 아니라 부하인 예식이 주체로 돼 있다. 사서는 중요한 사람 중심으로 기록한다. 특히 왕이 관련된 기사라면 당연히 왕 중심으로 서술한다. 모두 왕 중심이 아니라 예식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은 예식이 뭔가 특별한 역할을 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기록의 의자왕 항복 기사 바로 뒤 융의 기사를 보자. “其大將植 又將義慈來降 太子隆幷與諸城主皆同送款”(그 대장 예식이 의자왕과 함께 와서 항복했고 태자 융은 여러 성주들과 함께…)라고 태자 융이 주체로 기록돼 어색함이 없다. 그런데 민족사학자 신채호 선생은 에서 의자왕의 항복 장면을 독특하게 서술했다. “웅진성의 수성대장이 왕을 잡아 항복하라 하매 왕이 자결을 시도했으나 동맥이 끊기지 않아… 당의 포로가 되어… 묶여 가니라….” 의자왕이 측근인 수성대장 예식에게 잡혔다? 신채호 선생의 말뜻은 무엇일까?
‘又將義慈來降’을 분석해보자. ‘又’는 또, ‘降’은 항복하다. 그러면 ‘將’만 남는다. 모든 상황은 將이라는 글자에 정확히 담겨 있다. 그 대장 예식이 또 의자왕을 將해와서 항복했다? 將은 무슨 뜻일까? 將자에는 명사로서 ‘장수’, 동사로서 ‘거느리다’ ‘데리고 간다’라는 의미가 있다. 문장으로 봐서는 동사로 해석해야 한다. 예식이 의자왕을 데리고 와서 항복했다. 예식 장군이 의자왕을 데리고 가다? 왕을 데리고 가다? 무슨 뜻일까? 체포하다? 한문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중국 역사학자 바이근싱 산시대학 교수는 여기서 ‘데리고’는 ‘왕을 사로잡아서 당나라에 투항했다’는 뜻이라고 단언한다. 충격적인 해석이다.
그런데 이 해석에 힘을 싣는 한 점의 묘지명이 2008년 중국 시안에서 발견됐다. 묘지명의 주인공은 대당좌위위대장군이란 정3품의 고위직을 지낸 예식진이었고, 할아버지 예다와 아버지 사선 모두 백제 최고 직위인 좌평을 지낸 유력 가문 출신이다. 백제 614년에 태어나 672년 58살의 나이로 사망한 예식진은 백제 웅천, 즉 현 충남 공주 출신이라고 기록돼 있다. 바로 이 예식진이 웅진의 그 대장 예식이다. 웅진 성주 예식 장군은 18만 대군의 공격 앞에 고민 끝에 의자왕을 압박해 당군에 항복하고 그 공로로 당나라에 들어가 대장군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의자왕의 허망한 항복의 이면에는 하극상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많은 국가가 망했지만 모두 국력이 쇠해 망했다. 그런데 백제만이 전성기 때 느닷없이 망해버렸다. 요절한 국가! 백제, 그리고 역사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의자왕! 예나 지금이나 전력이 비교되지 않는 국가 간의 전투는 일방적인 결과를 낳는다. 굳이 의자왕의 책임을 묻자면 대국인 당나라의 비위를 거스른 정도가 아닐까? 망국의 책임이면 족하다. 이제 ‘삼천궁녀’와 ‘호색한’으로 왜곡된 의자왕을 복권시켜야 하지 않을까?
류지열 한국방송 PD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해찬 전 총리 위독…이 대통령, 조정식 특보 베트남 급파

한덕수 ‘호텔 헬스장·돈가스집’ 목격담…“지금 등심, 안심 고를 때냐”

정청래 “사과할 각오로 합당 제안” 수습 나섰지만…당내 여진 계속

이번 주말 ‘영하 18도’ 강추위…눈 내리고 시속 55㎞ 강풍 분다
![이제 뵈는 게 없어짐 [그림판] 이제 뵈는 게 없어짐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122/20260122503788.jpg)
이제 뵈는 게 없어짐 [그림판]

여야, 한목소리로 “이혜훈 장남 입학 경위·아파트 청약 부적절” 질타

이혜훈, “부정청약 아파트 포기할 뜻 있나” 묻자 “네” “네” “네”

군, ‘무인기 침투’ 30대 남성 “정보사 공작 협조자 맞다”
![[단독] ‘민희진 역바이럴 의혹’ 파장…“하이브 본사로 소송 번질 수도” [단독] ‘민희진 역바이럴 의혹’ 파장…“하이브 본사로 소송 번질 수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123/53_17691351620735_20260123501181.jpg)
[단독] ‘민희진 역바이럴 의혹’ 파장…“하이브 본사로 소송 번질 수도”

“탄핵 박근혜가 출구전략이라니”…‘쇼’로 끝난 장동혁의 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