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레이션/ 이우만
‘속솜허라!’ 속마음을 꺼내선 안 된다는 제주말이다. 4·3이란 거대 국가폭력을 겪었던 제주 사람들에게 이 말은 생과 사를 가르는 말이었다. 반세기 동안 금기어였던 4·3에 대해 자칫 가족사를 발설했다간 빨갱이로 몰리고,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의식이 지배했다. 누군가는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어야 했다. 당시를 살아낸, 산 자들의 트라우마는 그의 전 생애를 지배한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속솜허지 않고 용기 낸 그녀들</font></font>더구나 국가폭력으로 여성성을 훼손당하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의 가슴은 더 그랬다. 늙은 그들이지만 그 상처를 치유할 길이 어디 있겠는가. 다만 약간의 치유가 있다면 속솜허지 않고, 묻었던 말을 꺼내는 것임을 경험으로 본다. 억압된 분노의 말은 꺼내는 순간 공감을 얻는다. 그러면서 조금은 해방되리.
오랫동안 이 ‘속솜허라’는 말은 여성들을 짓눌렀다. 여성들의 몸에 가해진 치욕적 성폭력 경험이라면 더 그렇다. 지금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 여인들까지, 그렇게 겹쳐졌다.
그런 시대였다. 누구 할머니는 보쌈당해서 살았다는, 유린당해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도처에서 들리던. 자신에게 가해진 치욕을 밖으로 발설하는 것 자체가 인생을 송두리째 갉아먹는 줄 알던 시대였다. 얼결에 당하면 마음은 쿵쾅거리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다. 심한 언어폭력 앞에 “노!”라는 외침도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더구나 좁은 마을이나 지역일수록 저항은 쉽게 땅에 묻힌다. 창피하고, 아는 얼굴들이 두렵기 때문이다.
너무 놀라면 말문이 막히는 걸까. 힘이 센 남성, 직장에서 갑의 폭력을 당하는 순간엔 저항할 힘이 약하다. 화끈거리는 ‘속솜허기’다. 눈앞에서 폭력이 일어나도 두려움에 떨던 시절이 있었다. 분위기 망치지 말라며 손을 잡아도 크게 소리 내지 못하던, 남자들은 자신들의 추행을 묵인하던 그런 시대를 살았다. 그리고 나는 그때 어떻게 했는가? 그런 모습 앞에서 속솜허지 않았던가?
‘속솜허라’는 거대 국가폭력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지금 이 땅을 뒤흔드는 용기 있는 미투가 그렇다. 고통의 기억 끝에 미투가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메가톤급 미투가 이 땅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법조계, 문화예술계, 연예계, 언론계, 산업체 등 안전지대는 없었다. 우상의 얼굴이 괴물이 되고, 먹물들의 직장에서 묵인돼온 폭력이 노출됐다.
그건 속솜허지 않고, 용기 내 ‘미투’한 그녀들이 있어서다. 그녀들에게 고맙다는 격려가 이어진다. 어느 40대. “웃어주면 남자들이 자기에게 호의를 보이는 줄 알고 집적거렸다.” 30대. “지금 이런 유리천장을 깨준 선배들이 고맙다.” 20대. “쎈 언니들이 말해줘 시원하다.” 여고 2년생.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침묵하고, 말문 닫은 입들은 도처에 있다. 마트에서 일했다는 그녀가 말했다. “무거운 짐 들어주겠다면서 상사가 몸을 밀착시켰다. 기분이 나빴다. 생계가 걸려 있어 그냥 참았고, 두려웠다.” 서너 명 근무하는 일터의 그녀. “어느 날 나이 든 장이 불쑥 손을 잡고 어깨를 주물렀는데, 오래도록 기분이 상했다.”
아마도 속솜허지 않으려는 이 ‘미투’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늦었으나 털건 털고 가야 한다. 가해자였던 이들은 조마조마할 것이다. 오래된 과거라 말하지 말자. 과거에 침묵했기에 미투가 왔다. 누군가의 평생을 괴롭히고, 누군가의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했던 장면들 앞에 가해자들은 ‘모른다’고 잡아떼리라.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 성찰이 있어야 한다. 문제의식조차 없이, 타인의 삶에 평생의 상처가 될지 모를 행위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엇을 한다 하겠는가. 자신이 그 자리에서 검사라고, 예술가라고, 정치가라고, 직장의 선배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font size="4"><font color="#008ABD">다른 세상 위해 말문 터져야 </font></font>올해 서른 살인 후배가 그런다. “우린 일을 사랑하는 세대예요.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간다 해도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도 기본 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좀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 말문은 터져야 한다. ‘속솜허라’ 시대는 이제 그만이다. 그 시절을 겪었던 할머니들은 이제 말하리. 절대 “속솜허지 말라이.”(절대 조용해선 안 된다.)
허영선 시인·제주4·3연구소 소장전화신청▶ 02-2013-1300 (월납 가능)
인터넷신청▶ <font color="#C21A1A">http://bit.ly/1HZ0DmD</font>
카톡 선물하기▶ <font color="#C21A1A">http://bit.ly/1UELpok</font>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김건희, 명리학자에 ‘저 감옥 가요?’…첫 만남에 자택서 사주풀이” [단독] “김건희, 명리학자에 ‘저 감옥 가요?’…첫 만남에 자택서 사주풀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1117/53_17318286707807_20241117501548.jpg)
[단독] “김건희, 명리학자에 ‘저 감옥 가요?’…첫 만남에 자택서 사주풀이”

이재명 ‘선거법 판결’, 내년 중 확정될 수도…대법 ‘기한 준수’ 강조

이재명 산 넘어 산…‘의원직 상실형’ 이어 재판 3개 더 남았다

낙선한 이재명 ‘민의 왜곡’ 유죄…“그 논리면 당선한 윤석열도 처벌”

‘입틀막’ 경호처, 윤 골프 취재하던 기자 폰 강제로 뺏어…경찰 입건도

11월 18일 한겨레 그림판

화염 속 52명 구한 베테랑 소방관…참사 막은 한마디 “창문 다 깨”
![[단독] 용산-김영선 엇갈리는 주장…김 “윤·이준석에 명태균 내가 소개” [단독] 용산-김영선 엇갈리는 주장…김 “윤·이준석에 명태균 내가 소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1117/53_17318264838509_20241031504015.jpg)
[단독] 용산-김영선 엇갈리는 주장…김 “윤·이준석에 명태균 내가 소개”

곰인형 옷 입고 ‘2억 보험금’ 자작극…수상한 곰 연기, 최후는

한국 부유해도 한국 노인은 가난…78%가 생계비 때문에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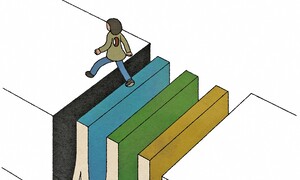











![[단독] 유명 명리학자 “김건희 여사, ‘저 감옥 가나요?’ 조언 구해왔다” [단독] 유명 명리학자 “김건희 여사, ‘저 감옥 가나요?’ 조언 구해왔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4/1117/20241117501460.jpg)
![[단독] 강혜경 “명태균, 김영선 고리로 입법도 기획” [단독] 강혜경 “명태균, 김영선 고리로 입법도 기획”](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1103/53_17306311865794_20241103501854.jpg)

![[단독] 명태균, 창원산단 부지 선정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했다 [단독] 명태균, 창원산단 부지 선정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1108/53_17310509570858_2024110750430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