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아빠가 엄마를 때릴 때마다 생각하곤 했다. ‘엄마는 왜 가만히 있지 않고 대들어서 일을 키워?’ 때리는 아빠보다 대드는 엄마를 비난하기가 더 쉬웠다. ‘왜 우리 집만 이 모양이지?’ 이런 꼬락서니로 살아간다는 게 부끄러워 친한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우리 집은 괜찮다, 나도 괜찮다는 가면만이 위태로운 정신을 지탱해주었다. 그 지옥 같던 시절,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많고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지, 어째서 피해자 비난이 더 쉬운지. 스무 살을 훌쩍 넘겨 인권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그 고통의 날들을 해석할 언어가 생겼고, 옹졸하고 무력했던 나를 끌어안을 수 있었으며, 엄마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있게 되었다. 사나운 빗줄기 속 인권이 내게 건네준 우산은 아늑했다.
벌레를 죽이는 건 쉬워서
돌이켜보면 나의 회복이 쉬웠던 이유는 가정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적 기준이 확립돼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금만 용기를 내면 누군가에게 내 상처를 고백할 수 있었고, 그 고백은 의심받지 않았으며, 시민으로서 내 지위도 흔들리지 않았다. 반면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 시민의 자리, 이웃의 자리, 심지어 인간의 자리로부터 추방될 위험에 놓인 이들이 있다. 무수한 의혹에 시달리기에 고통조차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존엄을 보장할 인권의 우산이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 바로 성소수자들이다. 최근에는 그들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폭력까지 조직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본격화된 성소수자 반대운동은 차별금지법,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시민인권헌장’ 등 새로 마련되는 인권 기준에서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심지어 교과서를 샅샅이 훑어 성소수자 관련 언급이나 차별 금지 내용을 죄다 삭제하도록 교육부를 압박하는 주도면밀함까지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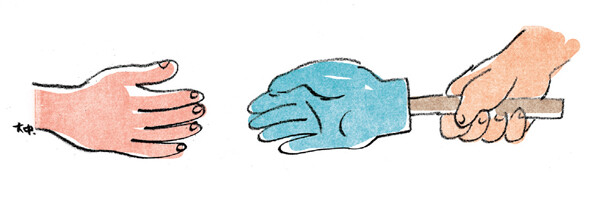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성소수자 반대운동은 차별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힌다. ‘차별 금지→동성애자 증가→에이즈 확산→100% 국민 혈세→세금 폭탄’, ‘동성애 합법화 시민인권헌장=개(犬)권헌장’이라는 어이없는 도식까지 유포한다. 이런 말들을 듣고 있자니 한나 아렌트의 말이 떠오른다.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개를 죽이기가 쉽고, 개보다는 쥐나 개구리를 죽이는 것이 쉬우며, 벌레 같은 것을 죽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즉 문제는 시선, 눈동자이다.” 성소수자를 병균과 동물에 빗대어 사람/시민을 차별한다는 혐의를 벗으려는 걸까. 누군가를 사람/시민의 자리에서 추방하는 순간, 누구라도 추방할 수 있는 세상이 찾아오기에 성소수자 반대운동의 확산은 모든 인간의 존엄이라는 인권의 토대를 허문다.
10명 중 1명꼴로 성소수자라지만 인권에 호의적인 이들조차 지금껏 성소수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다고 응답하는 사회다. 주변에 성소수자가 있음을 인식조차 하지 않았기에 커밍아웃을 받을 기회도, 성소수자 이슈에 상관할 필요도, 어쩌면 차별할 기회도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이성애 중심적 공기 속에서 성소수자들은 질식할 만큼 차별을 겪어왔다. 자녀에게 성소수자 친구가 생긴다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훅 물러선다. 관계망 속에 성소수자가 등장한 뒤에야 입장이 선택된다. 그 결과는 이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할 잣대가 되기에 충분하다. 하기에 인권 기준에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일은 문턱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 문턱조차 제대로 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실효성은 글쎄다 싶지만, 시민이 어떤 형태로든 인권의 저자가 되어보는 경험은 값지다. 인권의 저자 되기는 이웃의 존엄을 헤아릴 줄 아는 괜찮은 이웃이 될 기회로 초대받는 일이기도 하다.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인권을 삭제하거나 숨기는 순간, 인권의 이름으로 차별을 허용하게 되는 갈림길에 시민들이 서 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윤영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통일교 자금 수천만원 전달” [단독] 윤영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통일교 자금 수천만원 전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205/53_17649329847862_20251205502464.jpg)
[단독] 윤영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통일교 자금 수천만원 전달”

조진웅, 소년범 의혹 일부 인정…“성폭행은 무관”

쿠팡 손배소 하루새 14명→3천명…“1인당 30만원” 간다

전국 법원장들 “12·3 계엄은 위헌…신속한 재판 위해 모든 지원”

김상욱 “장동혁, 계엄 날 본회의장서 ‘미안하다, 면목 없다’ 해”

우라늄 농축 ‘5대 5 동업’ 하자는 트럼프, 왜?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법안 위헌성 커…심각한 우려”

김현지 “김남국과 누나·동생 사이 아냐…난 유탄 맞은 것”

조진웅 ‘소년범 출신’ 의혹 제기…소속사 “사실 확인 중”

김혜경 여사, ‘우리들의 블루스’ 정은혜 작가 전시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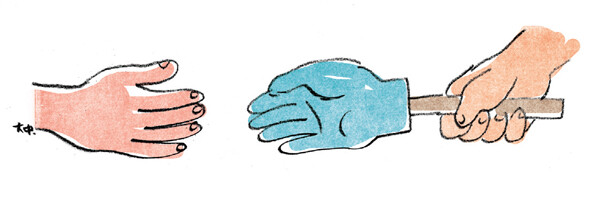















![[단독] 세운4구역 고층 빌딩 설계, 희림 등과 520억원 수의계약 [단독] 세운4구역 고층 빌딩 설계, 희림 등과 520억원 수의계약](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resize/test/child/2025/1205/53_17648924633017_17648924515568_202512045040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