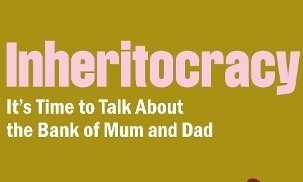“가브리엘, 오랜만이에요.”
약속한 서울 대학로 카페에 그가 먼저 와 있었다. “사진부터 찍을까요.” 마침 지난 12월1일 세계 에이즈의 날, 국제구호단체 ‘글로벌케어’가 대학로 거리에서 ‘편견을 버리면 길이 보인다’는 펼침막을 내걸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 앞으로 걸어가 사진을 찍었다. 그의 곁에서 함께 사는 친구가 손을 잡고 걸었다. 그의 잃어버린 시력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2003년 무렵, 에이즈인권모임에서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 어느새 7~8년이 흘렀고, 이따금 그를 보거나 그의 소식을 접했다. 최근에 나온 윤가브리엘(42)의 책 에는 지나온 일들이 그가 선곡한 노래와 함께 담겨 있다.
HIV 감염에 무릎 꿇지 않고

HIV는 어릴 때부터 중이염을 앓아온 윤가브리엘(뒷모습)의 청력마저 절반은 빼앗아갔다. 지난 12월1일 대학로에서 ‘글로벌 케어’가 세계 에이즈의 날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을 그가 지켜보고 있다.한겨레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가브리엘은 책의 서문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했다. “가족의 구박과 폭력 속에서 보낸 어린 시절, 견디다 못해 불 꺼진 지하 공장처럼 컴컴한 세상으로 뛰쳐나간 열다섯 살 때, 게이라는 정체성이 변태로 취급받는 세상에서 방황하던 이십대, 불시에 찾아온 에이즈란 병이 저 밑바닥 어딘가로 떨어지게 했던 서른 즈음, 딱딱한 병실 침대 속으로 꺼져버릴 것 같은 고통의 십여 년.” 이복형들의 폭력에 시달리던 열다섯 소년은 무작정 집을 나왔다. 전태일이 일했던 평화시장에서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를 들으며 1987년을 맞았다. 20대의 미싱사는 1990년대를 게이 친구들과 종로에서 보냈다. 새 천년의 시작이라고 세상이 들썩였던 2000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았다. 그렇게 ‘서른 즈음에’ 인생은 다시 시작됐다.
2000년 3월 동성애자인권연대의 문을 두드렸다.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에이즈는 무엇보다 인권의 문제”라고 말하는 활동가들을 보면서 감염인이라고 커밍아웃했다. 2004년에는 감염인·비감염인 활동가들과 함께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를 만들었다. 2003년 나누리+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그를 처음 보았다. 그는 “그때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다”고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불편한 곳은 없었다. 그에게 장애를 선물한 것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이 아니라 후천성‘인권’결핍증에 걸린 사회”였다.
광고
2004년 나누리+는 유엔의 ‘HIV/AIDS 인권 가이드라인’을 한국에 맞게 만드는 운동을 벌였다. ‘차별’이라는 사회적 질병에 맞서 싸우는 운동은 그렇게 시작됐다. 우선 한국의 에이즈 상황을 알기 위해 감염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당시에 들은 잊지 못할 증언이 책에 나온다. “실명 위기에 처한 분이 급한 수술이 필요한데 안과에서 에이즈를 이유로 입원을 거부해 감염내과 병실에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다 겨우 수술을 했지만 눈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분은 수술만 빨리 했어도 실명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고 울먹였다.” 가브리엘은 그렇게 단련되었다.
가브리엘을 아는 사람들에게 2006년은 잊지 못할 해였다. 그의 면역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시 그에게 의사가 했던 말은 이렇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백혈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 당장 약(에이즈 치료제)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 약을 끊으면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다시 망막에 와서 실명할 수도 있고 신경계에 와서 마비가 될 수도 있고 뇌에 와서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가망이 없을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하늘을 듣는다>
광고
그는 살아야 했고, 친구들은 살려야 했다. 성소수자를 중심으로 가브리엘 후원회가 조직됐다. 그는 “어떤 에이즈 약보다 친구들의 도움이 힘이 되었다”고 돌이켰다. 거대세포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날마다 360cc 주사제를 2시간 넘게 맞으며 버텼다. 나누리+와 친구들이 한 달에 200만원 넘는 약값을 후원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에이즈 약에 내성이 생긴 그에게 ‘푸제온’이 절박했다. 2003년 미국에서 출시된 푸제온은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이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는 푸제온을 한국에 공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정한 가격이 로슈가 요구한 가격에 미치지 못해서였다. 한국 정부가 책정한 약가는 연간 1800만원이었다.
나누리+ 활동가 등이 외국 구호단체를 통해 어렵게 구한 푸제온을 투여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석 달이 되어갈 때 ‘와우’ 탄성을 지를 일이 드디어 생겼다. 의사는 면역력이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억제될 만큼 올랐으니 주사를 끊자고 했다. 1년9개월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시련은 시력을 앗아갔다.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이미 그의 눈을 공격했고, 오른쪽 눈의 망막이 손상돼 시력을 잃었다. 왼쪽 눈에도 이상이 생겼지만 서둘러 수술을 받아 시력을 완전히 잃는 일은 간신히 막았다. 그러나 그해 겨울에 그는 눈이 오는 광경을 볼 수 없었다. 그의 책에는 “로슈가 2004년 (푸제온을) 국내에 시판하려고 허가받았을 때 정한 가격으로 공급해 내가 쓸 수 있었다면 시각장애는 안 생겼을 수도 있었다”고 나온다.
그는 2008년 한국로슈 앞에서 아픈 몸으로 12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환자복을 입고 그는 “사람들은 에이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을 수 없어서 죽는다”고 절규했다. 당시 어렵게 성사된 한국로슈 사장의 면담은 에 아프게 기록돼 있다. “내가 푸제온을 쓰지 못해 죽을 고비를 겪으며 실명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보낸 그 고통을 얘기하려고 입을 떼려는데 로슈 사장이 벌떡 일어나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렸다. …우리는 모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찌 이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가. 아니 무시가 아니라 짓밟은 거였다.”
고통의 과정을 거쳐 긍정으로
광고
그러나 동성애자에 감염인에 장애인, ‘다중 소수자’ 가브리엘은 절망하지 않는다. “10년 넘게 투병하는 동안 가장 높은 면역력을 유지하고 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것도 감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잘 적응하고 있다.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늘 남의 도움을 받고 살 수는 없기에 아플 때마다 돌봐주던 쉼터를 나와 옥탑방 하나를 얻어 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쉼터에서 살았던 시간이 더 길었던 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혼자만의 여유, 편안함이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며 웃는다. 그리하여 가브리엘은 “모든 일들은 고통의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다”라고 썼다. 눈을 잃고도 그는 여전히 희망을 본다.
가브리엘이 전하는 희망의 노래는 12월8일 저녁 8시 서울 홍익대 앞 롤링홀에서 열리는 출판기념 북콘서트에서 육성으로 들을 수 있다. 여기에 그가 “열아홉 시절부터 흠모하고 존경해온” 가수 한영애씨가 희망의 화음을 더한다. 를 펴낸 도서출판 사람생각은 책 수익금을 인권센터 건립기금으로 내놓고, 가브리엘은 인세를 성소수자 단체와 감염인 단체 등에 기부할 생각이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광고
광고
한겨레 인기기사
![[속보] 법원, 윤석열 21일 공판 법정 촬영 허가 [속보] 법원, 윤석열 21일 공판 법정 촬영 허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17/53_17448739210023_20250411502045.jpg)
[속보] 법원, 윤석열 21일 공판 법정 촬영 허가

한덕수 ‘알박기’ 막은 변호사 “교과서 남을 판례…9대0 결정 의외”

한덕수 자충수…재판관 2+1 ‘묶어팔기’ 실패, 국힘 경선엔 찬물

병원 휴직한 ‘저속노화’ 교수…전국 팀장들이 봐야 할 영상 ‘과로 편’

권성동에 손목 잡혀 끌려간 기자…“힘으로 제압 의도 분명히 느껴”

내란 내내 헌재 문 두드린 김정환 변호사 “포고령 딱 보니 위헌”

권성동, 질문하는 기자 손목 잡아채 끌고가 “지라시 취재는 거부”

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수업 거부에 ‘백기’
![[뉴스 다이브] 헌재에 진압당한 ‘한덕수의 난’…폭싹 망했수다 [뉴스 다이브] 헌재에 진압당한 ‘한덕수의 난’…폭싹 망했수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17/53_17448706596052_20250417502676.jpg)
[뉴스 다이브] 헌재에 진압당한 ‘한덕수의 난’…폭싹 망했수다

윤석열·김건희, 관저서 7일간 물 228t 썼다…“수도요금 미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