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배 어디 계신가요?’
1월9일 오후 3시께 의 민완 기자인 김완이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급히 저를 찾았습니다. 방송사들이 프리랜서 스태프 등에게 몇 달씩 밀린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했음을 고발한 제1195호 표지이야기와 관련된 새로운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김완 기자는 ‘상품권 페이’의 주요 사례로 지목된 SBS의 한 예능 PD가 기사 제보자에게 전화해, 고압적 태도로 온갖 짜증을 내는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엔 평생 단 한 번도 을의 위치에 서보지 않은 ‘슈퍼갑’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안하무인입니다. 그렇기에 너무 뻔한 치명적인 실수를 쉽게 저지릅니다. 이 PD 역시 제보자가 ‘음성을 녹음하고 있다’고 경고하는데도 “CP(책임PD)한테 사인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상품권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팀도 다 그렇게 한다”며 ‘상품권 페이’라는 불법 관행이 회사 공식 결재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자백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SBS는 이튿날인 11일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외부 인력에게 용역 대금의 일부가 상품권으로 지급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이다. (중략)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사과문을 내놓고 맙니다.
방송사 쪽에선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이 입장문에서 제 눈길을 잡아끈 것은 ‘용역 대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실제 방송 현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스태프는 외주제작사 소속의 ‘프리랜서’입니다. 방송사는 스태프를 도급업체에 적을 두도록 해 직접고용을 피합니다. 그러므로 방송사가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은 임금이 아닌 ‘용역 대금’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생각해봅시다. 도급회사 소속의 방송사 스태프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이는 도급회사 사장이 아닌 방송사의 PD입니다. PD가 언제까지 나오라면 나와야 하고, 뭘 찍거나 만들라면 따라야 합니다. 건전한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방송사 PD와 스태프들 사이엔 엄연히 사용-종속 관계가 존재합니다.
한 사람이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6년 12월 내놓은 근로기준법 관련 판결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 대법원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은 이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한다면, 방송사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이며, SBS가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은 ‘용역 대금’이 아닌 ‘임금’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한류’라는 화려한 불빛을 떠받쳐온 것은 상품권으로 밀린 임금을 받으며 묵묵히 일상의 노동을 감당했던 방송노동자들입니다. 지난해 말, 공정노동을 위한 방송작가 대나무숲 등의 ‘방송제작스태프 계약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31.5%가 자신의 노동조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특별한 근로계약 없이 방송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일해 얼마를 받는지도 모른 채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몇 달 지나 상품권으로 받는 사회. 이게 멀쩡한 사회인가요?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윤석열, ‘사형’ 훈장으로 여길 것”…서울대 로스쿨 교수 경고

국세청, 체납자 1조4천억 ‘면제’…못 걷은 세금 줄이려 꼼수

“임무 완수, 멋지지 않나”…김용현 변호인, 윤석열 구형 연기 자화자찬

골든글로브 거머쥔 ‘케데헌’…이재 “거절은 새 방향 열어주는 기회”

‘뒤늦은 반성’ 인요한 “계엄, 이유 있는 줄…밝혀진 일들 치욕”

“머리 터지는 느낌”…미군, 숨겨둔 ‘음파 무기’로 마두로 잡았나
![[단독] ‘검찰도 내사 착수’ 알게 된 김병기, 보좌관 폰까지 “싹 다 교체 지시” [단독] ‘검찰도 내사 착수’ 알게 된 김병기, 보좌관 폰까지 “싹 다 교체 지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111/53_17681320293875_20260111502187.jpg)
[단독] ‘검찰도 내사 착수’ 알게 된 김병기, 보좌관 폰까지 “싹 다 교체 지시”

미국 연방검찰, 연준 의장 강제수사…파월 “전례 없는 위협”

관세로 장사 망치고, 공무원들은 내쫓겨…‘일상’ 빼앗긴 1년

중수청, 사법관-수사관으로 ‘이원화’…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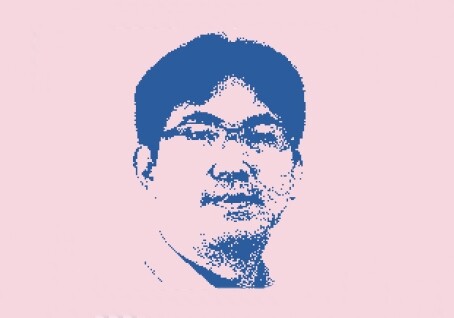















![[단독] 서울시가 세운3-2·3구역 용적률 올리자, 한호건설 예상수익 1600억→5200억원 [단독] 서울시가 세운3-2·3구역 용적률 올리자, 한호건설 예상수익 1600억→5200억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109/53_17679679801823_20260108503886.jpg)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