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계를 상상해보자. 책장을 내가 넘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넘겨주는 것이다. 내가 빨리빨리 읽고 싶다고 해서 결코 마음대로 책장을 넘길 수 없다. 천천히 내용을 음미하며 읽을 수 있도록 기계가 책장을 넘겨준다면, 우리는 좀더 타인의 글을 정성 들여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미국 드라마 를 보다가 실제로 이런 기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수백 년 전의 고서를 소중하게 보관하기 위해 특수 유리장에 책을 펼친 채 넣어두고 무려 2시간마다 딱 한 장만 읽을 수 있도록 페이지가 천천히 저절로 넘어가게 만든 기계장치였다. 입맛 따라 골라 읽을 수도 없고, 무조건 우직하게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꼼꼼하게 다 읽어내야 하는 것이다.

사진/ 정용일 기자·그래픽/ 장광석
내 마음대로 읽는 속도를 정할 수 없고 아주 천천히 그 책이 보여주는 페이지대로 읽어야 하는 철저히 타율적인 독서. 나는 그 독서기계가 그 순간 살짝 탐이 났다. 소셜미디어가 급증하면서 누구나 1인 미디어 하나쯤은 갖게 되었지만, 글을 많이 쓰는 대신에 우리는 한편 한편의 글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느려터진 독서기계를 바라보며 점점 더 속독과 발췌독에 길들어가는 나 자신의 메뚜기식 독서에 제동을 걸고 싶어졌다. 그렇게 천천히 타인의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글을 읽는다는 행위는 마침내 글을 쓰는 행위와 비슷해지지 않을까. 타인이 그토록 어렵게 쓴 글을 나는 너무 쉽게 읽는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남이 쓴 글을 천천히 읽으며 가슴에 새기는 일은 내가 직접 글을 쓰는 행위만큼이나 힘겹지만 뿌듯한 그 무엇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서로의 글을 그렇게 천천히 읽어준다면, 서로의 언어를 그렇게 소중히 다뤄준다면, 이토록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찢는 오해와 갈등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소셜미디어가 급증함으로써 대중의 글쓰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글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고, 글의 본뜻을 깊이 있게 우려내 삶의 자양분으로 삼는 글쓰기와 글읽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 우리는 글을 어렵고 쓰고, 어렵게 읽었다. 그만큼 글쓰기를 소중하게 여겼고 글 속에 사람의 혼(魂)이 담겨 있다 여겼던 시대였다. 인터넷이 확산되자 사람들은 좀더 많은 글을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어렵게 쓴 글을 쉽게 읽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조차도 지나, 쉽게 쓰고 더 쉽게 읽는 시대가 와버렸다. 글쓰기도 쉬워지고, 아니 쉬워진 것처럼 보이고, 글읽기는 더더욱 쉬워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빠른 리액션과 경쾌한 글쓰기만이 지닌 장점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깊고 진중하게 세상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영역이 줄어든다는 점이 문제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오래 글 쓰는 사람, 글 한 줄을 쓰는 데도 며칠 밤을 새워야 하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가 평가절하되는 것이 문제다. 그리하여 나는 더더욱 진지한 글쓰기, 심각한 글쓰기를 응원하고 싶어진다. 한 줄을 쓰더라도, 한 문단을 쓰더라도, 마음에 남는 글쓰기, 억지로 읽으라고 권하지 않아도 한참 동안 보고 또 보고, 곱씹고 또 되뇌고 싶은 글을 보고 싶다.
그리하여 요새 유행하는 대중적 글쓰기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는 장삿속이 아닌 ‘누구나, 글을 쓴다면 제대로 써야 한다’는 책임감의 문제를 제기한다. 누구나 책을 낼 수 있고, 누구나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나 글을 쓴다면 그 글의 무게만큼 엄연히 세상살이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글의 무게만큼 삶의 무게도 등에 져야 함을 깨달을 때, 그저 ‘직업이나 이벤트로서의 글쓰기’가 아닌 ‘삶으로서의 글쓰기’가 시작된다.
글쓰기의 좋은 점 중 하나는 글을 통해 저절로 자신을 비추는 마음의 거울을 하나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마음의 거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옛날에 쓴 내 글을 보면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놀랍다. 부끄러움은 ‘그때는 이렇게밖에 못 썼구나’ 하는 자괴감 때문이고, 놀라움은 그때의 순수함을 지금의 내가 잃어버렸다는 깨달음 때문이다. 글쓰기는 그렇게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이 되어 스스로의 상처를 진단하고 치유하고 마침내 극복하게 한다. 그러므로 글쓰기는 우선 ‘나’라는 최고의 독자를 향한 경의의 표현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도 읽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야말로 글쓰기의 최대 난적이다. 내 안의 용과 밤새도록 싸워 이길 때, 마침내 오롯한 글 한 편이 간신히 태어난다.
나는 ‘대중적 글쓰기’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게 따로 존재한다면, 그래서 더 쉽고 더 느슨한 잣대를 ‘대중적 글쓰기’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반칙이다. 대중적 글쓰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는 그것이 누구를 향한 것이든, 누가 쓰는 것이든, 어렵고 힘들고 진지하고 아픈 것이다. 그 짙은 어둠을 뚫고 나온 글쓰기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중적 글쓰기’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쉽게 쓰인 글’이 문제다. 글쓰기의 잣대는 어디까지나 ‘우리 마음을 얼마나 진실하게 움직이는가’여야만 한다.
좋은 글쓰기의 최고 비결은 좋은 독자가 되는 것이다. 좋은 글을 읽었을 때, 자꾸만 다시 읽어보고 싶고, 다 외웠으면서도 또다시 보고 싶은 그런 설레는 마음, 그 뜨거운 문장들에 남은 작가의 입김이 아직까지도 나를 ‘글 쓰는 사람’으로 만든 원동력이다. 일단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든 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계 앞에 앉기 전에 우선 얼마나 많은 고민과 구상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느냐가 진정한 글쓰기의 재능인 것 같다. 글을 쓸 땐 인터넷도 휴대전화도 텔레비전도 모두 꺼버리고 오직 ‘나’와 ‘글’만이 남게 된다. 그런 집중력이 글쓰기의 진정한 희열이다. 이 복잡한 미디어 세상에서 그렇게 온전히 ‘나’의 목소리에 젖어들 수 있는 초월적 집중의 시간은 축복이다. 남들이 뭐라든 당신이 가장 쓰고 싶은 것을 쓰면 된다. 오히려 더 큰 적은 ‘남들이 뭐라고 할 거야’라고 생각하며 미리부터 쉴드를 치며 글쓰기를 미루는 자기 검열의 시선이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가장 깊고 은밀한 외침을, 당신 안에 깃든 가장 눈부신 희열과 분노와 열정의 시간을, 글쓰기라는 모닥불의 장작으로 완전히 연소시킬 때, 글쓰기는 더 이상 ‘노동’이 아닌 ‘삶을 바꾸는 예술’로 승화될 것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중동 에너지 시설 잿더미로”…이란, 미 하르그섬 공격에 보복 예고

한국 야구, 도미니카에 7회 콜드게임 패…WBC 4강행 무산

트럼프 ‘이란 석유 수출 터미널 있는 하르그섬 파괴’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이 대통령 “‘이재명 조폭 연루설’ 확대 보도한 언론들 사과조차 없어”

이정현 “조용히 살겠다…내 사퇴로 갈등 바라지 않아”

“국내 선발 3~4명뿐인 KBO의 한계”…류지현 감독이 던진 뼈아픈 일침

“이정현 전화는 꺼져” 장동혁, 오세훈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두 차례나 ‘공천 미신청’ 오세훈…조건인 ‘선대위’ 위원장 후보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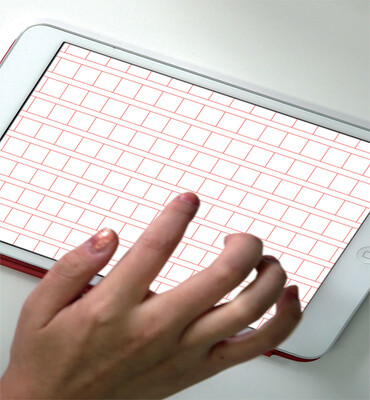
![[손바닥문학상 우수상] 기호수 K](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5/1226/53_17667484171233_20251225502218.jpg)

![[손바닥문학상 우수상] 클럽 273의 드랙퀸 김동‘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5/1219/53_17661471260474_20251218503915.jpg)
![[손바닥문학상 대상] 숨은 글자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5/1218/20251218503891.jpg)


![[알림] 손바닥문학상 내일 마감…K를 기다립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5/1024/53_17612776205304_20251023504599.jpg)
![선한 손길의 사회 세계[손바닥문학상 우수상]](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5/0108/53_17362924777621_20250103502651.jpg)
![매생이 전복죽[손바닥문학상 우수상]](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1220/53_17346834967603_20241220502540.jpg)
![마늘장아찌[손바닥문학상 우수상]](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1213/53_17340774377124_20241213502302.jpg)
![새로운 시선으로 말하는 ‘오래된’ 세계[심사평]](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1213/53_17340773224237_2024121350229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