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광덕의 구시렁 경제. 사진 <한겨레21> 김정효 기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왜곡될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것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곧 나에게로 와서 내가 부른 이름대로 모습을 바꾸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을 오규원 시인이 패러디한 앞 두 구절이다.
대상의 의미를 규정하는 이름엔 부르는 사람의 주관과 이해가 투영되게 마련이다. 대중적 말길의 소통이 쉽지 않은 경제용어는 굴절의 각도가 더 커진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해 각계의 반응을 전달하는 기사 중엔 아직도 ‘경제계’라는 표현이 제법 나온다. 그런 기사의 상당수는 ‘삼성그룹 고위 간부는 이렇게, LG그룹 관계자는 저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끝난다. 노동자 혹은 민주노총의 반응은 빠져 있다. 그렇게 쓰면 경제계가 아닌 ‘재계’의 반응이 된다. 또 경제계의 반응으로 자주 인용되는 ‘경제 5단체’란 이름은 아예 공식용어의 지위를 굳혔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이들 5개 단체는 ‘사용자 5단체’ 정도로 부르는 게 제격이다.
인지언어학을 창시한 조지 레이코프는 언어의 본질을 해독하기 위해 ‘프레임’이라는 분석 도구를 사용했다. 그는 제한된 범위의 정신 구조인 프레임이 ‘사실’을 이긴다고 봤다. 미디어에 의해 되풀이되는 프레임과 은유는 대중의 머릿속에 성공적으로 주입된다는 것이다. 경제용어를 작명할 만한 지위에 있는 집단은 기존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가하기도 한다. 그들은 대중이 그 의미에 익숙해지게 한 뒤 이해관계를 관철한다.
1997년 외환위기 뒤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구조조정’(restructuring)이란 말은 기업의 사업이나 조직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뜻한다. 당연히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수반해야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구조조정은 노동력만의 구조조정, 즉 감원과 동의어가 된다. 나아가 ‘구조개혁’이라는 당위성을 가진 용어로 승격되면서 노동자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의 궁극적 지향인 경영혁신이란 개념은 사라졌다.
시카고 학파의 ‘노동+유연화’란 접합의 기술도 기발하다. 중학교 1학년생에게 ‘노동 유연화’가 무슨 뜻일 것 같으냐고 물어봤더니 “일만 계속하지 말고 쉬엄쉬엄 맨손체조를 하면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란 나름의 해석이 돌아왔다. 은유를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 창출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며 기업 구조조정 개혁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취할 것”이라면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8월7일치 보도)윤 장관에게 기업의 구조조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통한다. 그리고 구조개혁과 유연성의 프레임을 해체하면 ‘정리해고’라는 실체가 드러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발언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을 부르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것은 …효율성 향상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내어 “윤 장관의 발언은 ‘노동 유연성’ 때문에 해고된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사용자 위주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8월13일치 보도)노동시장도 다른 생산물이나 생산요소 시장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균형점을 찾는다. 따라서 시장이 유연하려면 노동의 공급뿐만 아니라 노동의 수요도 유연해져야 한다. 그런데 노동력의 수요자인 자본의 유연성은 왜 촉구하지 않는 걸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방해하는 자본의 경직성은 왜 탓하지 않는 걸까?
(윤증현 장관이) 인간으로서의 노동자를 무슨 밀가루나 과일, 야채와 같이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는 상품과 똑같이 바라보니 그런 발언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진보신당 8월12일 브리핑 중)노동자를 물화시키려는 자본 진영의 언어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억압기구로 작동하고 있다.
‘네가 노동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노동은 다만 왜곡될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것에 지나지 않았다./ 네가 유연화란 이름을 불렀을 때 노동은 곧 네에게로 가서 정리해고로 모습을 바꾸었다.’
한광덕 기자 kdhan@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손웅정 “합의금 수억원 요구” VS 피해 아동 쪽 “2차 가해”
![[단독] 손웅정 고소 학부모 “지옥 같은 시간…피해자 더 없길” [단독] 손웅정 고소 학부모 “지옥 같은 시간…피해자 더 없길”](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626/53_17193813456914_20240626502217.jpg)
[단독] 손웅정 고소 학부모 “지옥 같은 시간…피해자 더 없길”
![[단독] ‘회수’ 출발 직후, 윤 개인폰 전화한 국방차관…추가통화 확인 [단독] ‘회수’ 출발 직후, 윤 개인폰 전화한 국방차관…추가통화 확인](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4/0620/20240620503710.jpg)
[단독] ‘회수’ 출발 직후, 윤 개인폰 전화한 국방차관…추가통화 확인

찢어질 듯한 포 소리…연평도 주민들 “이러다 일 날까 두려워”

“민주당 상임위원장 때문에 제 명에 못살겠다”…국민의힘 원내수석실 ‘문전성시’

참사 석달 전 “아리셀 3동 위험”…소방당국 경고 있었다

손웅정 고소 아동 쪽 “손 감독 자기미화에 피해자들 비통함”
![[사설] 선서·증언 거부하고선, ‘청문회가 위법’이라는 이종섭 [사설] 선서·증언 거부하고선, ‘청문회가 위법’이라는 이종섭](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625/53_17193078293547_20240625503311.jpg)
[사설] 선서·증언 거부하고선, ‘청문회가 위법’이라는 이종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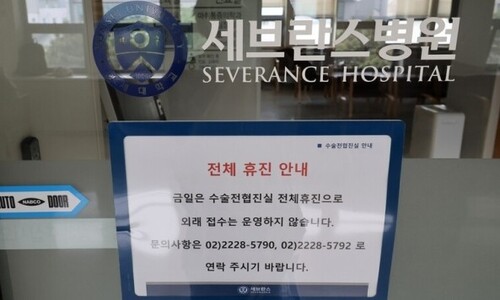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강행

부처님 보고 절에 가면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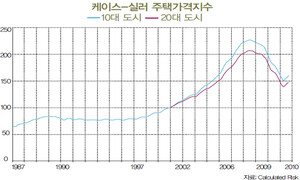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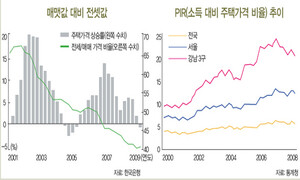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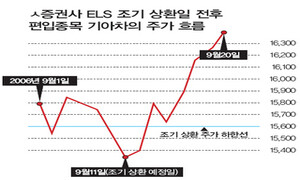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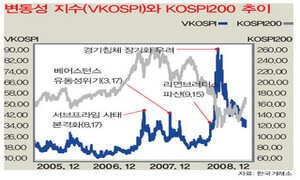


![비가 와도 들이붓고 철근 자리에 철근이 없고 [순살 아파트 붕괴 1년] 비가 와도 들이붓고 철근 자리에 철근이 없고 [순살 아파트 붕괴 1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621/53_17189607450976_202406205041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