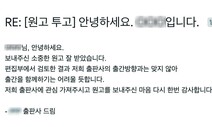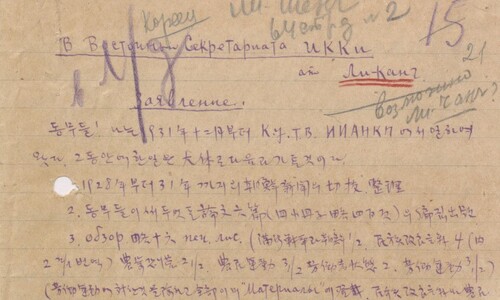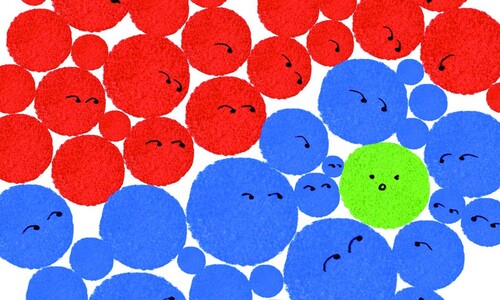앞만 보며 달리는 친구가 있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내달리는 그를 우리는 ‘경주마’라고 불렀다. 경마에 쓰일 목적으로 생산되는 말로 쓰임이 확실한 동물. 조직에 충실한 경주마였던 그는 많은 일을 해냈고 빨랐고 거침이 없었다. 문제는 대화에 있었다. 한마디를 던지면 열마디를 했고 A를 B로 왜곡하거나 자기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곤 했다. 소통이 버거워 직장생활이 힘들다 느낀 건 그 친구와 함께 일한 그때가 처음이었다.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L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정용실 아나운서가 대화 될 법한 편집자를 소개해달라고 하여 나를 추천했다는 것이었다. 일을 벌이고 싶지 않았으나 마음 써준 L선생님의 부탁도 있고 하여 햇살 좋은 봄날 그를 만났다. 서글서글한 눈매에 화사한 얼굴, 누구와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이끌 만큼 사교적이고 지적이었다. 반면 나는 상대의 눈을 멍하니 응시할 뿐 일에 관심도, 의욕도 없었다. “그러지 말고 얘기해봐요, 고민이 뭡니까?” 훅 들어오는 절묘한 한마디. 상대를 꿰뚫어보는 힘에 순간 눈이 번쩍 뜨였다.
오랜 직장인, 여성, 인터뷰어, 커뮤니케이션 전공자 정용실 아나운서는 그 친구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했다. ‘공감’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가 대화를 하나의 기술, 테크닉 정도로 여긴다는 거다. 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너와 나, 우리 관계’에 있는데 오로지 전달할 대상, 이기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철커덕 채워버린 마음의 눈가리개 때문에 옆과 뒤를 살필 수 없는 거라고. 고개가 절로 주억거려졌다. 지금까지 고민이 사르르 풀리는 느낌이었다. 이후 나는 틈만 나면 정용실 아나운서의 강연을 들었고, 가벼운 한마디에도 귀 기울였고, 글을 찾아 읽었다. 인생 선배의 조언은 날카롭고 때론 달달했다. 말과 글은 그 사람의 인품에 잣대가 된다고 했던가. 정용실 아나운서의 대화, 듣기, 소통, 태도에는 늘 ‘공감’이 자리했다. 만남이 계속될수록 우리 이야기는 풍부해졌고 깊어졌다. 한 권의 책이 될 만큼.
광고
개인적 고민을 매개로 출간하게 된 <공감의 언어>는 내 편집자 생활을 통틀어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다. 대화가 차가운 설득의 도구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수단으로 변모하는 이 시대에 적절한 화두였다고 생각한다. ‘따스함, 호기심, 경청, 감정, 자존감, 독서, 몸짓, 소통, 신뢰’ 등 공감의 열쇳말로 삶의 문제를 통찰하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인생을 힘껏 살아내도록 북돋워주었으니까. 또 평범한 여성, 힘겨운 직장인, 유능한 방송인으로 살아오며 몸으로 겪어 터득한 저자만의 삶의 태도와 행복 가치를 내 삶에 적용해보도록 도와주니까 말이다. 실로 10년의 공부, 3년의 집필 기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책이었다.
책은 우리 일상의 발견과도 같다. 기획이란 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거창하게 나올 것 같지만 의외로 소소한 궁금증, 고민, 취향에서 비롯된다. 위로받고 싶거나, 사회 이슈가 궁금하거나, 식물·그림·요리 등을 좋아하거나,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다른 게 있다면 남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새로운 시선을 발견하고, 독자의 욕구를 파악해 충분히 만족시켜줘야 한다는 거다. 우리는 그것을 ‘콘셉트’라고 한다. 만약 어떤 책을 읽고 ‘새롭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구나’ ‘감동적이야’ 중 적어도 하나의 감탄이 나온다면 그 책의 콘셉트는 성공적이라 하겠다. 이제 남은 일은 더 많은 독자에게 가닿는 것뿐이다. 갑자기 궁금해진다. <공감의 언어>를 읽은 사람은 어떤 감탄을 했을까? 그 친구는 읽었을까? 아니, 선물할걸 그랬나?
글·그림 오혜영 출판 편집자
광고
한겨레21 인기기사
광고
한겨레 인기기사
![[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김건희 재수사는 [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김건희 재수사는](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03/53_17436480392434_20250403501711.jpg)
[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김건희 재수사는
![[속보] 윤석열, 내일 탄핵심판 선고 출석 안 한다 [속보] 윤석열, 내일 탄핵심판 선고 출석 안 한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03/53_17436499709716_20250403501937.jpg)
[속보] 윤석열, 내일 탄핵심판 선고 출석 안 한다

한국 상호관세 26%…‘FTA 비체결’ 일본 24%보다 왜 높나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중국 34%, 일본 24%
![[속보] ‘당원 매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속보] ‘당원 매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03/53_17436479501121_20250403501763.jpg)
[속보] ‘당원 매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엄마는 총 맞아 으깨진 턱과 손으로 언니를 업고 왔다 “꼭 알려, 살아서…”
![윤석열 선고 D-1…“파면하라” 57%, 중도층은 65% [NBS] 윤석열 선고 D-1…“파면하라” 57%, 중도층은 65% [NBS]](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03/53_17436474430033_20250403501654.jpg)
윤석열 선고 D-1…“파면하라” 57%, 중도층은 65% [NBS]

윤석열 파면되면 방 뺄 준비해야 하는데…“김성훈이 말도 못 꺼내게 해”

국방부 “대통령 복귀해 2차계엄 요구해도 불응할 것” 재확인

4·2 재보선 민주당 거제·구로·아산서 승리…부산 진보교육감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