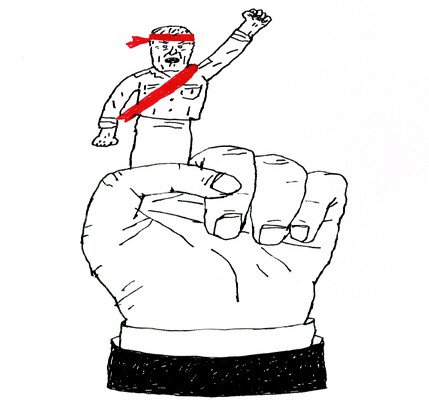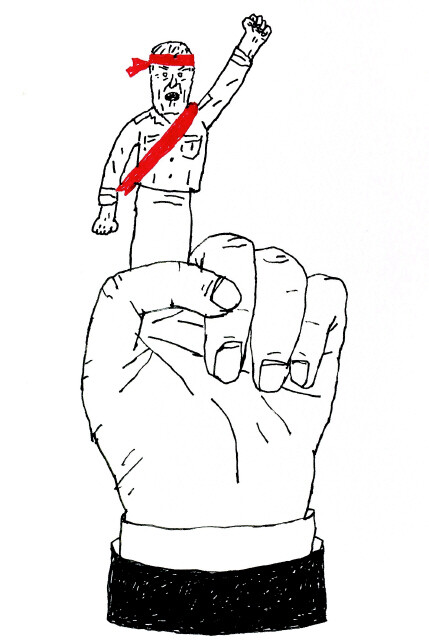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라는 말은 서러움과 경고의 여운을 남긴다. 몇 살을 경계로 노인이 되는 것일까…. 자각 못하는 새 중년이 되었다. 그렇게 노년도 올 것임을 깨달았다. ‘밝고 빛나는 청춘’일 때는 몰랐다. 소리 없이 사라지고 나서야, 청춘에 대한 찬사가 클리셰가 아님을 깨달았다. 한 발짝 늦게 알고 깨닫는 새, 노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 소멸의 대가로 경험과 지혜를 선물받는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단편 ‘황혼의 반란’을 보자. 사회학자와 정치인들이 나서 “사회보장 적자는 노인들 때문이며, 의사들이 노인을 살리는 것은 공익은 뒷전이고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한 이윤 행위”라고 비난한다. 정부는 노인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생명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법적으로 제한되고, 수용소로 끌려가기에 이른다. 잡혀가기 직전 탈출한 주인공에 의해 반란이 조직된다. 그러나 정부의 바이러스 유포로 반란은 좌절된다. 살해당하는 순간 주인공은 말한다. “너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이다.”
“65살은 괜찮아요. 70살은요? 손해의 시작이죠.” 손익분기점 위에 놓인 순간 늙음은 손해의 시작이다. 노인의 지혜는 계산에 포함되지 못한다. 생산으로부터 배제된 인간에 대한 경멸이 담겨 있다. 생산의 가능성을 가졌으나 아직 성장 중인 아동에 대한 오래된 ‘하대’ 역시 그 때문 아니던가. ‘인간’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물론 소비할 수 있는 노인은 예외다. 노인이라 불리지도 않는다. ‘박근혜’ ‘이건희’ 등의 고유명사는 ‘노인’이라는 일반명사에 포함된 적이 없다. 그들의 손익분기점은 늘 충만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노년은 폐지를 수렴하거나 가족에게 부양 책임이 된다. 육아와 가사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남성 노인일 때는 어휴, 말도 하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까? 충만함보다 박탈감이 앞섰기 때문일까? 애국심을 2만원으로 충분히 보상받았기 때문일까? 연일 신문 기사에 오르는 ‘어버이’들을 보며 만감이 교차한다. “나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툭 튀어나온 말에는 혐오감이 담겨 있다. 캠페인 할 때 나이 든 남성 노인이 다가오면 본능적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은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무조건 욕설, 멱살이라도 잡히는 모욕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런 노인들에게 벌어진 일이다. 추문은 연일 이어진다. 아직 납득할 만한 해명조차 듣지 못했으나 새로운 사실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청와대,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진 커넥션. 서로 간의 변명은 책임 전가로 이어진다.
노인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사회였다면, 추잡한 스캔들 한가운데서 ‘어버이’이라는 이름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가 나서 국민을 이리저리 찢어놓으려 그 어버이들을 앞세우는 꼴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오! 마이 어버이’들이 연출하는 블랙코미디는 최악의 예능이다. 베르베르의 같은 소설에는 이런 말도 나온다.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도서관이 되었을 그들의 자리를 훼손하는 국가와 돈 있는 자들의 탐욕을 단죄해야 한다. 노인들의 명예를 살해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에서 을 선물하세요 :) ▶ 바로가기 (모바일에서만 가능합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의령 벌초” 전재수, 통일교 행사날 부산 식당 결제 드러나 [단독] “의령 벌초” 전재수, 통일교 행사날 부산 식당 결제 드러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215/53_17657761954787_20251215501954.jpg)
[단독] “의령 벌초” 전재수, 통일교 행사날 부산 식당 결제 드러나

내란 특검 “김건희, 계엄 선포 뒤 ‘너 때문에 망쳤다’며 윤석열과 싸워”

유시민 “민주당 뭐 하는지 모르겠다…굉장히 위험”

전두환 주먹 가격에 “숨 안 쉬어져”…손자 전우원 웹툰 눈길
![‘글로벌 CEO’의 돈줄 [그림판] ‘글로벌 CEO’의 돈줄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215/53_17657954103211_20251215503456.jpg)
‘글로벌 CEO’의 돈줄 [그림판]
![[단독] “김건희 방문 손님, 이름 안 적어”…금품수수 경로된 아크로비스타 [단독] “김건희 방문 손님, 이름 안 적어”…금품수수 경로된 아크로비스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215/53_17657844889345_20251215502935.jpg)
[단독] “김건희 방문 손님, 이름 안 적어”…금품수수 경로된 아크로비스타

‘권력 독점’ 노린 윤석열, 취임 초부터 이미 계엄 계획했다

‘대선 승리한 날의 이재명’…미 타임 ‘올해의 사진’에 꼽혀
![이재명 ‘감옥 문턱’까지 갔던 날의 비밀이 밝혀졌다 [논썰] 이재명 ‘감옥 문턱’까지 갔던 날의 비밀이 밝혀졌다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213/53_17655824504471_20251212503120.jpg)
이재명 ‘감옥 문턱’까지 갔던 날의 비밀이 밝혀졌다 [논썰]

특검 “대법 계엄 관여 무혐의…조희대·천대엽 동조 사실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