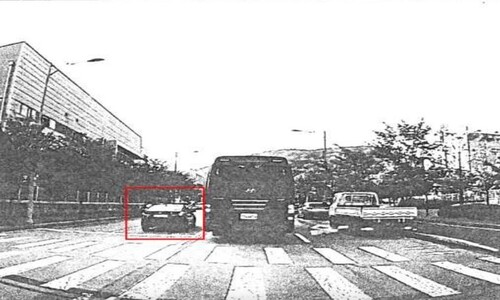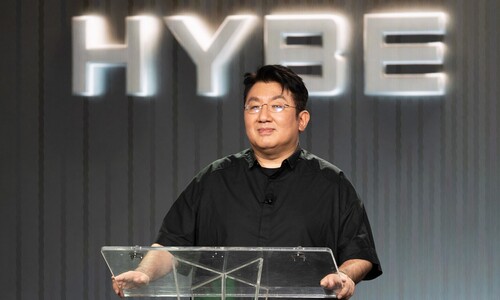‘책값이 비싸다’는 말을 이따금 듣게 된다. 비싼 게 어디 한두 가지인가. 대다수 서민들의 얄팍한 지갑에 비해 각종 일상생활 물가와 교육비, 병원비, 거기에다 세금까지. 저렴한 것이라고는 도무지 찾기 어려운 세상이다. 책값만 비싸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책값은 책에 대한 의미 부여와도 연관된다. 옷값이나 이발·미용료, 술값을 비롯한 오락유흥비에 대해 느끼는 가격 저항과 책 한 권 살 때의 가격 저항은 사람마다 다르다. 절대적인 책값 수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같은 책을 두고도 동일한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책값 부담의 강도는 ‘책을 뭘로 보느냐’에 대한 가치판단과 깊게 연관된다는 것이다.
‘책을 뭘로 보느냐’에 대한 가치판단
책의 평균 가격(정가)은 약 40년 전인 1975년에 1276원이던 것이 2013년 상반기에 1만9673원으로 15.4배 올랐다. 같은 기간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66.5배(4만6천원→305만7천원) 오르고, 일간지 한 달 구독료는 25배(600원→약 1만5천원) 올랐다. 이 통계는 책값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준다. 가장 큰 이유는 책이 지상 최대의 다품종 상품이라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행되는 신간만 해도 5만 종이 넘는데, 이 책들은 유사 상품(책)끼리 엄청난 가격경쟁을 치르며 발행된다.

책값에 대한 한국인의 불만은 사회적으로 열악한 독서 환경 탓도 크다. 한 대형 서점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 한겨레 신소영
교보문고에 의뢰해 최근 5년새(2009년 상반기 대비 2013년 상반기) 도서 분야별 가격 추이를 알아보았다. 전체 책값 평균은 20.6%(1만6307원→1만9672원) 올랐고, 가장 대중적 분야인 소설은 14.2%(9222원→1만535원) 올랐다. 같은 기간의 물가지수 상승률은 약 10%로, 가구당 월평균 경상소득 상승률 10.9%(2009년 2분기 339만6010원→2013년 2분기 376만5732원)를 웃도는 수치다.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책값은 최근 5년간 다른 물가보다 2배 정도 올랐다. 그런데 같은 기간 통계청 가계수지 통계의 서적구입비 항목을 보면,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책구입비 증가율은 -20.1%(2009년 2분기 1만8782원→2013년 2분기 1만4912원)로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소비침체율과 가격상승률이 거의 비슷하다. 연평균 책구입비의 60%를 차지하는 학습도서 구입비까지 포함된 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책을 사는 데 인색해지고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난다.
발행되는 책의 종수는 늘어나고, 1종당 발행부수 및 판매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보통 수천 부 발행하는 초판 1쇄를 기준으로 책값은 책정된다. 2012년 기준 1종당 평균 발행부수는 2185부에 불과했다(대한출판문화협회 자료). 그런데 구매력 위축으로 단위 발행량이 적어지더라도 고정비용은 큰 변화가 없어서 책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무늬만 도서정가제’도 책값 인상의 유력한 원인이다. 신간(발행 18개월 미만인 도서)의 직간접 할인율 19%와 구간(발행 18개월 이상인 도서)의 무제한 할인율은 출판사의 책값 책정 때 할인을 감안한 거품가를 구조화한다. 그런 경향이 최근 수년간 강화된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이를테면 처음부터 1만원을 붙이면 될 소설책에 1만2천원의 정가가 붙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도서정가제를 제대로 해서 거품 가격 구조를 청산하자고 말하는 것이다.
책값만은 싸야 할 것 같은 이상한 믿음물론 책값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만은 출판·독서 문화 선진국 시민들이 느끼는 책값 감각에 견줘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 탁도 크다. 문화 선진국들에서는 집 가까이에 무료로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많고, 페이퍼백이나 문고본과 같은 저렴한 책이 흔하며, 중고책방 또한 많다. 다양한 대체 수단이 존재하는 선진국과 그것이 부재한 나라 사이의 ‘책값 경제 의식’이나 ‘체감 책값 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도서관에서 책을 얼마든지 빌려 볼 수 있는 나라에서는 책값이 싸니 비싸니 하는 말을 찾아보기 어렵다.
책값을 결정하는 방정식은 복잡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언어권(출판시장) 인구수와 구매력이 반영된 발행부수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정을 보면, 경제력과 출판시장 발달 수준이 낮은 나라의 책값은 다른 물가보다 더 비싸다. 책을 많이 읽고 많이 구입해야 책값도 싸진다. 페이퍼백 같은 저렴한 책으로 출판사들이 박리다매를 하기 위해서는 책 소비층이 두꺼워지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물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리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책값이 비싸지는 나라, 아니 자꾸만 비싸지는 것처럼 인식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제적·문화적으로 불행해지고 있다는 유력한 징후다. 다른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그래도’ 책값만은 싸야 할 것 같은 이상한 믿음도 재고돼야 한다. 이래저래 책값 싼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책 생태계에 생존의 젖줄을 댄 사람들과 독자가 힘을 모아 만들어야 할 지적 공유 자산이기도 하다.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채상병 전우, 윤 대통령에 편지…“특검법 수용하십시오” [전문] 채상병 전우, 윤 대통령에 편지…“특검법 수용하십시오” [전문]](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507/53_17150449280078_20240507500988.jpg)
채상병 전우, 윤 대통령에 편지…“특검법 수용하십시오” [전문]

검찰 선배 민정수석 부활은 수사 방어용? 윤 “역대 정권도”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되나…내일 3번째 심사

군과 10년 싸운 윤일병 유가족…“박정훈 대령 같은 수사대장은 기적”

이스라엘군, ‘피난민 140만명’ 라파흐 국경 넘었다…지상전 수순

달러값 더 뛰면 ‘제2의 아시아 외환위기’ 올 수도

‘손님 쫓아내는 술집’ 유랑길 오른 사연…다큐 ‘유랑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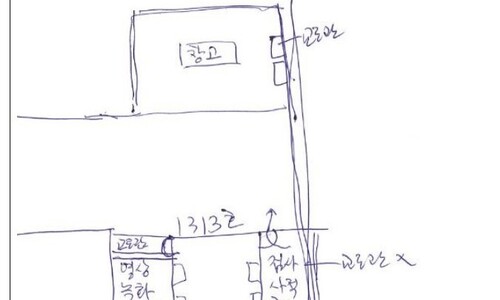
‘검찰청 술판 회유’ 이화영 고발사건, 상급 경찰청 이관 수사

‘환율 방어’에 외환보유액 60억달러 급감…한은 “대외충격 대응 충분”

연이율 최대 5.5% ‘아이 적금’ 들까…60살 이상 최대 10% 상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