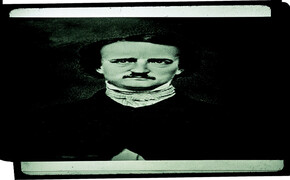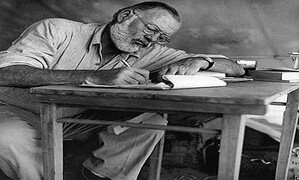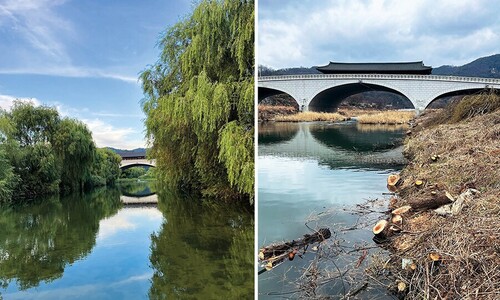한겨레 박미향
천상병 시인은 막걸리를 좋아하기로 유명했다. 막걸리를 조금씩 삼키며 글줄을 쓰는 그의 모습은 보지 않았으나 눈에 선하다. 배가 든든하고 기분이 좋은 것이라면 벌써 어릿하게 취했을 터인데 취한 기분을 모른다는 시인의 목소리에 덩달아 얼큰하게 기분이 들뜬다.
막걸리는 곡물과 누룩, 물을 섞어 만든 전통 발효주다. 전국 각지의 소문난 막걸리를 찾아 여행하고 기록한 여행작가 정은숙은 (한국방송출판 펴냄)에서 다음과 같이 막걸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곡물을 쪄서 만든 고두밥을 잘 식힌 뒤 잘게 부순 누룩이나 물에 불린 누룩을 섞어 물과 함께 술독에 붓는다. 술독을 25℃ 전후의 온도에 놓아두면 빠르면 4~5일, 늦으면 7~10일이 지나면 발효가 끝난다. 이때 발효한 술을 어떻게 채주하느냐에 따라 청주와 탁주로 나뉘는데, 맑은 청주를 떠낸 뒤 가라앉은 술지게미가 섞인 술을 탁주라고 한다. 탁주는 다시 탁주, 막걸리, 재주, 회주, 탁배기 등의 이름으로 나뉜다. 막걸리는 탁주 중 술의 양을 늘리거나 도수를 줄이기 위해 찬물을 넣어가며 거른 술을 말한다. 그러나 넓은 범주에서 탁주나 막걸리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니 둘 사이의 경계가 분명한 건 아닌 모양이다.
막걸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듣자 하니 그 비슷한 술로도 궁금증이 뻗어간다. 동동주는 막걸리의 형제일까 쌍둥이일까, 아님 사촌쯤 될까. 정은숙은 한국전통주연구소 박록담 소장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동동주라는 부모로부터 청주, 탁주, 막걸리, 소주라는 자식이 태어난다.” ‘부모 술’ 동동주는 밥·누룩·물을 섞어 술독에 뒀다가 3일째 정도에 열었을 때 만들어지는 술이다. 전분이 분해돼 가벼워진 고두밥이 술독 안에 동동 떠올라 있는 상태에서 마시는 술이 동동주다. 그러므로 본디 동동주는 아직 술지게미가 생기기 전 맑은 상태의 술에 밥알이 떠 있는 모양의 술이다.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경기도 화성의 민속주인 ‘부의주’다. 개미가 떠 있는 모양 같아서 부의주, 나방이 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부아주’라고도 한단다. 그러나 지금은 막걸리처럼 탁한 술에 밥알이 떠 있는 것도 통상 동동주라 한다. 한창 민속주점이 유행하던 2000년대 초반, 찹쌀을 넣어 왠지 입에 짝짝 붙는 것 같은 ‘찹쌀동동주’, 더덕 향이 혀를 감싸는 ‘더덕동동주’ 등을 기억하는지. 그때 그것이 막걸리냐 동동주냐를 구분 못했던 것은 당신이 취한 탓이 아니었다. 이 둘의 경계 역시 불분명했던 것이다.
다시 막걸리 열풍이 불면서 전국 여기저기에 세련된 막걸리 전문점이 많이 생겼다. 그러나 ‘막 걸러낸 술’이라는 태생적 요소를 그대로 적용한 그 거친 이름처럼 막걸리는 전 부친 기름 냄새 빠지지 않는 허름한 술집에서, 등받이 없는 불편한 의자에 앉아 먹어야 가장 맛이 좋을 것 같다. 막걸리처럼 뽀얀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라면 더 좋겠다. 물론 천상병 시인처럼 밥으로 대용하고 싶다면 장소 불문, 계절 불문이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대통령 거부권? 우리에겐 저항권”…채상병 특검법을 원한다

채 상병 특검 거부권으로 끝? 재의결 파고가 몰려온다

성역 김건희, 고발 5달 뒤 수사…‘검찰 쇼’로 끝나지 않으려면

강풍이 몰고온 비, 일요일 오전 그쳐…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정부, ‘의대 증원’ 자료 49건 법원에 제출…다음 주 까지 결론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이 왔다
![[사설] 대법 “월성원전 감사 위법” 판결, 검찰·감사원 어떻게 책임질 건가 [사설] 대법 “월성원전 감사 위법” 판결, 검찰·감사원 어떻게 책임질 건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510/53_17153329367124_20240510502260.jpg)
[사설] 대법 “월성원전 감사 위법” 판결, 검찰·감사원 어떻게 책임질 건가
![“마이너스 50점 기자회견...리더십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공덕포차] “마이너스 50점 기자회견...리더십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공덕포차]](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511/53_17154253120636_9417154253036388.jpg)
“마이너스 50점 기자회견...리더십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공덕포차]

일요일 차차 맑아지지만…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나쁨’

70여명 총살 거부한 독립운동가, 문형순 경찰서장 호국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