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근의 원동력, 초코바. <한겨레21> 류우종 기자
식탐(食貪), 언제나 이게 문제다.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면 늘 음식량이 적다고 생각한다. 먹기 전엔 “비싼데 음식량이 적다”며 투덜대고, 먹고 나선 “보는 것과 달리 많네” 하며 남은 음식을 아까워한다. 여러 사람과 식사할 땐 전략적으로 밥을 먹는다. 내 몫은 온전히 내 것이니까 놔두고, 함께 먹는 음식부터 공략한다. 배가 불러도 남이 먹는 음식을 탐한다. 의 황정음처럼 “한 입만”이라고 외치며 끼어든다.
식탐은 끊임없는 허기에 닿아 있다. 끼니를 굶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대로 된 밥 한 그릇은 아니어도 뭔가를 먹어 늘 배를 채운다. 공복 상태가 되면 불안함이 엄습한다. 조용한 실내에서 주책없이 꼬르륵 소리가 날 것만 같다. 또 바빠서 끼니를 건너야 할 땐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왜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나’ 싶어 화도 난다. 일에 집중도 어렵다. 마감 시간에 쫓겨 밥 먹을 시간도 아까울 땐 미칠 지경이다. 매끄러운 기사 마감을 위해 식사하러 나가는 동료의 등 뒤로 “김밥 한 줄만”을 안타깝게 외칠 뿐이다.
저녁 7시에 먹은 김밥 한 줄은 밤 10시면 뱃속에서 흔적도 없다. 기사 마감에 다시 제동이 걸린다. 배를 채워줘야 움직이는 내 뇌는 건전지 빠진 시계처럼 멈춘다. 기사 한 줄 쓰기도 어려워진다. 비상식량이 필요할 때다. 책상 서랍에서 초콜릿바를 꺼낸다. 한 입 베어 무니 부드러운 누가와 고소한 땅콩이 입안에서 오도독 씹힌다. 달달한 초콜릿이 혀를 감싸며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치던 위로 흘러 들어간다.
뱃속이 허전하면 얼마나 예민해지는지를 잘 아는 나는 초코파이, 초콜릿바, 치즈가 들어간 소시지, 양갱 따위를 서랍이나 가방 속에 간식거리로 챙겨두는 편이다. 초콜릿바 하나는 늦은 밤까지 기사를 쓸 수 있는 힘이 돼준다. 옆자리에 앉은 임지선 기자, 최성진 기자에게도 초콜릿을 나눠준다. 스트레스 해소에 단것이 좋다는데 기사 쓰느라 눈이 빨개진 이들에게도 나의 초콜릿은 쓸모가 있겠지.
생각해보니 초콜릿이 내 주된 야식이 된 건 에 입사한 2003년부터다. 회사 근처에 24시간 편의점이 없다 보니 밤에 일하다가 먹을 야식이 마땅치 않았다. 기껏해야 프라이드치킨과 맥주가 전부다. 기름진 포만감이 기사 쓰는 데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그때부터 늘 배고픈 나를 위해 초콜릿을 비상식량으로 챙기기 시작했던 것 같다. 초콜릿은 먹기 편하고 포만감도 적당하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잠을 못 자 피곤할 때, 입맛이 없을 때도 좋다. 초콜릿바 하나와 따뜻한 녹차 한 잔이면 늦은 밤까지 기사를 쓸 때도 든든하다.
하지만 내 야근 파트너인 초콜릿이 야식으로는 좋지 않은 모양이다. 각종 건강 기사를 보면 칼로리 높은 초콜릿 대신 요구르트 같은 저칼로리 간식을 먹는 게 좋다고 나온다. 그러고 보니 초콜릿이 내 뱃속만 든든하게 해준 건 아닌 것 같다. 벨트 위로 올라온 뱃살도 두둑하다. 초콜릿 대신 허기를 달래줄 다른 야식을 찾아봐야 할지 모르겠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뺑소니 혐의 김호중, 공연 강행…“모든 죄와 상처 내가 받겠다”

신입사원 절반이 사표냈다…‘광주형 일자리’ 3년 만에

성심당 대전역점 월세 4배 올려서 폐점?…유인촌 “방법 찾겠다”
![2.5달러에 산 고장난 라디오…8년 뒤 소리를 들었다 [ESC] 2.5달러에 산 고장난 라디오…8년 뒤 소리를 들었다 [ESC]](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518/53_17160223979699_20240515502766.jpg)
2.5달러에 산 고장난 라디오…8년 뒤 소리를 들었다 [ESC]
![한동훈, 전대 출마? “내공 없음 들킨다” [공덕포차] 한동훈, 전대 출마? “내공 없음 들킨다” [공덕포차]](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518/53_17160392750006_20240517502941.jpg)
한동훈, 전대 출마? “내공 없음 들킨다” [공덕포차]

‘김호중 음주 본 것 같다’ 경찰 진술 확보…강남 주점 압수수색

일본책 통째로 베껴 저서로 둔갑?…오욱환 변호사 표절 논란

‘여고생 열사’ 5·18 기념식 영상에 엉뚱한 사진…보훈부 “착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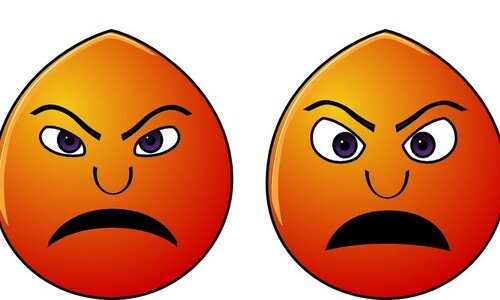
화난 마음 다스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

과학예산 날렸던 윤 대통령, ‘R&D 예타’ 돌연 폐지 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