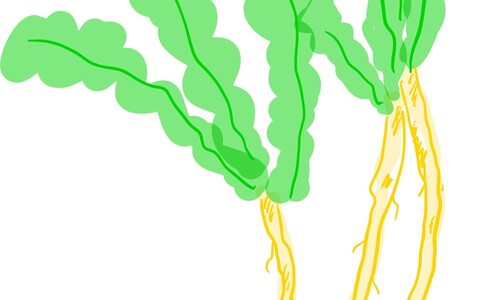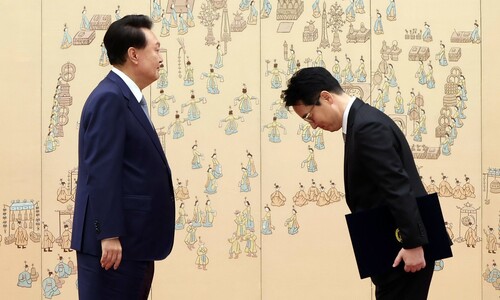는 외계인이 난민처럼 보이는 영화다. 여기에 외계인은 침략하는 외부인이 아니라 통제당하는 이방인(혹은 소수자)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상공에 불시착한 우주비행체. 고장난 물체에서 내려온 외계인은 지구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지구의 지역민, 요하네스버그 주민들에게 그들은 혐오스런 존재다. 대규모 난민처럼 대책 없이 지구에 불시착한 그들은 요하네스버그 인근의 ‘디스트릭트 9’에 집단 수용된다. 주변에 철조망이 쳐진 그곳은 딱 보기에 게토다. 그곳에 사는 외계인은 마치 난민처럼 영양실조 상태로 지구로 내려오고, 인간이 먹지 않는 음식인 고양이 먹이에 환장하고, 고무를 간식으로 즐기는 야만적 존재다. 집은 허물어지고 쓰레기는 쌓여 있는 ‘디스트릭트 9’는 빈민촌과 다름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계인을 거지란 뜻의 ‘프런’으로 부른다. 이렇게 는 외계인을 난민으로 은유하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한다.

〈디스트릭트 9〉
그렇게 28년이 흐르는 동안 외계인은 180만 명으로 늘어난다. 는 난민촌과 전쟁터를 보여주는 화면의 구성을 따른다. 주인공의 주변인물 인터뷰로 시작해서, 그가 현장에 투입돼 카메라를 보면서 설명을 덧붙이는, 모큐멘터리(가짜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여기엔 정부 관료, 지역 주민의 인터뷰도 더해진다. 인근 주민들은 외계인이 신발도 가져가고 아내도 뺏어갔다고 투덜댄다. 원성이 높아지자, 외계인 관리국 MNU는 하얀 천막이 줄지어 늘어선 난민촌 같은 곳으로 외계인을 퇴거하는 격리작업에 돌입한다. MNU의 직원인 비커스(샬토 코플리)가 퇴거작업의 책임을 맡아 용병들과 함께 ‘디스트릭트 9’에 투입된다.
이렇게 국제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극단의 이방인이 거주하는 곳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란 설정은 은유도 아니고 직유다. 영화의 제목부터 악명 높은 인종분리 정책(아파르트헤이트) 당시에 백인 거주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수만 명의 흑인들이 쫓겨났던 ‘디스트릭트 6’을 살짝 뒤집어놓았다. 더구나 요하네스버그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규모의 빈민촌이 존재하는 곳이 아닌가. 영화엔 외계인을 착취하는 나이지리아 갱단도 나와 실감을 더한다. 게토의 참혹한 일상과 게토에 대한 편견이 외계인을 통해서도 현실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렇게 의 제작진은 공상과학(SF) 영화가 가진 우화의 힘에 신선한 상상력의 날개를 달았다.
광고
이제 어수룩한 비커스는 퇴거 통지서에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 그러나 사람도 아니고 외계인에게 서명을 받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똑똑하진 못하지만 성실한 인물인 비커스는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 이런 비커스의 작업을 카메라는 마치 다큐처럼 쫓아간다. 일부러 거칠게 찍어서 현장감을 살리는 것이다. 게토에서 탈출을 꿈꾸는 이들이 있게 마련이다. 지구인이 지능이 떨어지는 존재로 여기는 외계인 가운데도 자신의 행성으로 돌아갈 꿈을 꾸는 이들이 있다. 비커스는 우연히 이들이 탈출을 위해 모아온 유동체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다 사고를 당한다. 실수로 유동체가 몸에 튄 비커스는 서서히 외계인으로 변해간다.
비커스의 비극은 MNU에 기회가 된다. 세계 2위 군수산업체이기도 한 MNU는 외계인의 무기를 얻고도 사용할 방법이 없었다. 오직 외계인만이 외계 무기를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외계인의 팔로 변한 비커스의 팔은 수십억달러의 산업적 가치를 지닌 황금의 손이 된다. MNU는 비커스를 외계인 유전자와 지구인 유전자의 결합을 연구하는 생체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그들이 비커스의 가슴을 열어 심장을 꺼내는 수술을 시도하는 순간에 그는 도망친다. 이제 비커스가 숨을 곳은 ‘디스트릭트 9’밖에 없다.
피터 잭슨이 남아공 감독에게 상상력 날개를 달다
는 다양한 영화를 떠올리게 한다. 빈민가에 퇴거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장면은 을 비롯한 한국 조폭영화들을 떠올리게 하고, 어수룩한 사나이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오인 때문에 정부에 체포돼 생체실험 위기에 처했다가 탈출하는 이야기는 과도 맞닿아 있다. 여기에 감옥 같은 게토에서 탈출을 모색하는 외계인 부자의 존재는 나치 수용소에서 희망과 유머를 잃지 않았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담은 로베르토 베니니의 를 얼핏 떠올리게 한다. 물론 인간이 파리로 변해가는 도 있다. 이렇게 는 다양한 맥락의 해석이 가능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SF 영화다. 의 감독인 피터 잭슨이 제작자로 나서 남아공 출신 닐 블롬캠프 감독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마이너리티 감성을 불어넣어온 잭슨 감독의 온기가 느껴지는 영화다.
다만 발상의 기발함에 견줘 이야기는 허술하다. 우연이 남발되고, 의문도 남는다. 예컨대 외계인과 평범한 지구인 비커스의 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같은 질문이다. 그래도 새로운 상상력으로 무장한 SF 시리즈의 탄생으로 손색이 없다. 실제 영화는 후속편을 염두에 둔 것처럼, 3년 뒤를 기약하는 여운을 남긴다. 10월15일 개봉. 지난 8월 미국 개봉 당시에 개봉 첫 주 흥행 1위를 기록했다.
광고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광고
한겨레21 인기기사
광고
한겨레 인기기사

“사랑하는 이들 지키려”…다시 모인 100만 시민 ‘윤석열 파면’ 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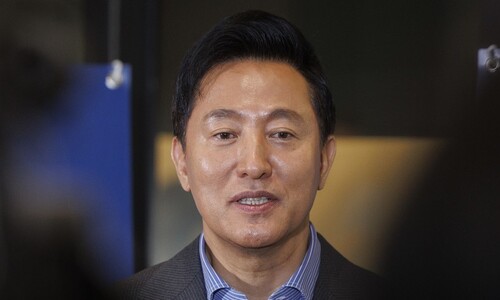
오세훈 “헌재 앞 야권 천막은 불법…변상금 부과 검토”

트럼프 “우크라이나군 살려달라” 요청에…푸틴 “항복하면 생명 보장”

박찬대 “영구집권 시도한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될 것”

김건희 개인송사 지원한 대통령실…대법 “근거규정 공개해야”

상속세 안 내려 집 팔고 현금 빼돌려도…국세청 추적에 ‘덜미’

“헌재도 한동훈도 밟아”…선고 임박에 윤 지지자들 위협 구호

“윤석열 즉각 파면”…노동자·영화인·노인·청년 시국선언 잇따라

“김건희 수사 적절했나 의문”…헌재가 의심한 이유

인천공항 주차타워서 20대 직원 추락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