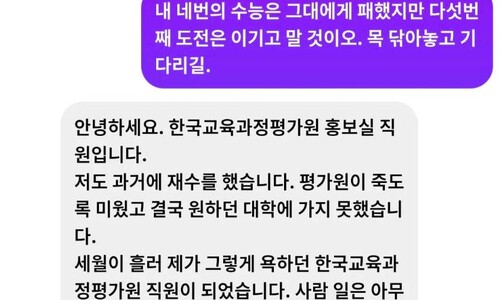“내 삶은 곧 세계인, 나는 세계의 시민으로 살아왔다.”
칼 폴라니는 1958년 1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격동의 시대, ‘세계인’의 삶은 유목민의 삶이었다.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했고, 쫓기듯 대륙과 대륙을 넘나들었다. 생계는 불안정했지만, 사상은 풍요로웠다. 말하자면, 시대를 앞서 산 게다.
루카치·만하임과 교류하며 인문학 섭렵
폴라니는 1886년 10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수도이던 비엔나에서 태어났다. 엔지니어 출신인 아버지는 철도사업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자산가였고, 문학과 예술에 조예가 깊던 어머니는 비엔나 사교계의 중심인물로 꼽혔다. 제국의 또 다른 수도였던 부다페스트에서 보낸 대학 시절엔 마르크스주의 미학의 대가로 성장할 죄르지 루카치와 ‘지식사회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될 카를 만하임과 교우하기도 했다. 급진적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한편 인문학 전 분야를 두루 섭렵한 그는 1912년 변호사 자격을 따냈지만, 법조인의 안정적인 삶에는 애초 관심이 없었다. 그는 1914년 헝가리 급진당을 창당해 서기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제국군의 기병장교로 참전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세계대전’을 목격한 그는 1924년 비엔나로 활동 무대를 옮겨 저명한 경제주간지 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폴라니 필생의 ‘맞수’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의 질긴 인연은 이 무렵 싹텄다. 당시 비엔나에선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 사회주의의 대두로 상처 입은 시장론자들이 ‘자본의 자유’를 부르짖고 있었다. 대표적인 이론가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였고, 그의 수제자가 바로 하이에크였다. 폴라니는 의 지면을 통해 미제스가 이끄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이 시기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휘청이고 있었다. 19세기 자본주의의 발달을 지탱해온 금본위제도 무너지고 있었다. 이내 대공황이 닥쳐왔다. 이 모든 혼란을 자양분 삼아 파시즘이 독버섯처럼 퍼지기 시작했다. 비엔나도 안전하지 않았다. 영국으로 거처를 옮긴 폴라니는 1937년부터 옥스퍼드와 런던대학이 개설한 ‘노동자교육협회’(일종의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시작하는 한편 당시 ‘세계의 공장’이던 영국 경제에 대한 연구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뉴딜 정책이 대공황의 어둠을 걷어내기 시작할 무렵 절정에 이른 파시즘은 또 다른 세계대전을 불렀다. 폴라니는 두 차례의 전쟁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믿었다. 시장을 우상으로 떠받든 자본주의의 출현이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사회적 관계의 일부에 불과했던 경제활동(시장)이 자본주의의 도래와 함께 모든 사회적 관계를 복속시키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미 버몬트주 베닝턴대학에서 ‘방문 연구원’ 신분으로 집필에 몰두한 폴라니는 58살이 되던 해인 1944년 마침내 을 세상에 내놓는다.
노작 출간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를 부른 것은 미 명문 컬럼비아대학이었다. 이번엔 미국행이 쉽지 않았다. 열혈 사회주의자였던 그의 부인 일로나 두친스카의 ‘전력’이 문제였다. 때는 1947년, 바야흐로 냉전이 막을 올렸고 미국 사회는 매카시즘 광기에 눈이 먼 채였다. 두친스카의 입국사증(비자)은 거부됐고, 폴라니 가족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외곽의 피커링에 터전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폴라니는 배편으로 피커링과 뉴욕을 오가는 생활을 이후 6년여 이어갔다.
하이에크와의 질긴 악연
‘방문교수’란 불안정한 신분으로 컬럼비아대에서 그가 가르친 과목은 경제제도의 기원을 탐구하는 ‘일반경제사’였다. 1953년 67살의 나이에 은퇴할 때까지 그의 ‘신분’엔 변화가 없었다. 강단을 떠난 뒤에도 그의 연구열은 식을 줄 몰랐고, 1957년엔 또 다른 노작 을 펴냈다. 말년엔 대안 학술지인 창간 준비에 정열을 기울이기도 했다. 칼 폴라니는 1964년 4월 피커링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풍 같던 삶을 조용히 마감했다.
이 출간된 1944년, 하이에크도 자신의 대표작 을 펴냈다. “모든 집단주의는 전체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력 비판한 이 책은 훗날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됐다. 하이에크는 1974년 화폐와 경기변동에 관한 연구를 인정받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고, 그의 후예인 밀턴 프리드먼도 2년 뒤 같은 상을 받았다. 1992년 4월 숨질 때까지 그는 냉전의 종말과 소비에트의 붕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이 지구를 뒤덮는 모습을 지켜보는 호사를 누렸다. 그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다. ‘거대한 변형’이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방탄 연꽃 [그림판] 방탄 연꽃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208/53_17651908742176_20251208503349.jpg)

![쿠팡, 갈팡질팡 [그림판] 쿠팡, 갈팡질팡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207/53_17651042890397_2025120750201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