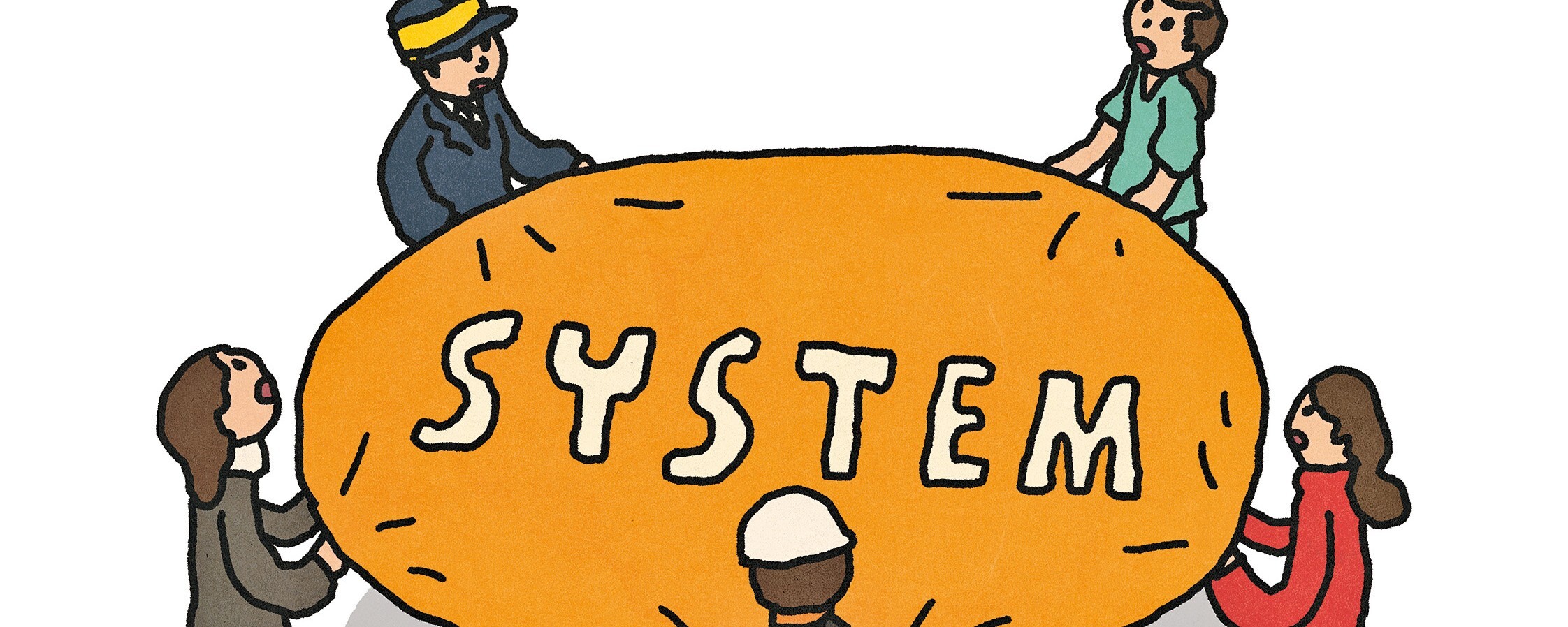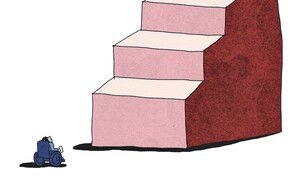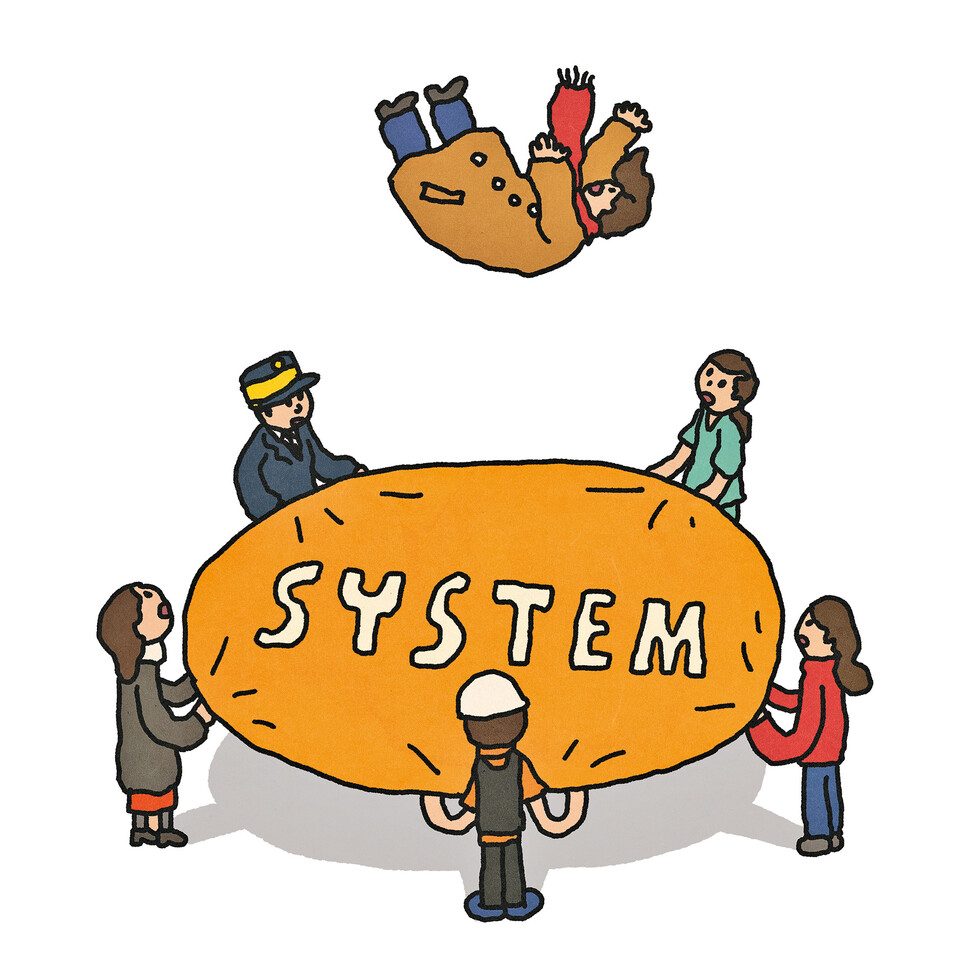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깜박. 정신을 차려보니 내 몸이 구르고 있었다. 아… 내가 에스컬레이터를 반대로 탔구나. 친구들과 회포를 풀고 택시비 아끼려고 지하철 끊기기 전에 일어선 건 기억나는데 왜 여기서 데굴거리고 있지. 슬로모션으로 바닥에 얼굴을 박았을 때쯤 생각이 끝났고, 잠든 건지 의식을 잃은 건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피 흘리며 누워 있는 나를 한 여성분이 발견했다는 걸 나중에 들었다. 그분은 119에 신고하고 역무원과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한참을 내 곁에 있어줬다고 한다. 부모님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해준 것도 그분이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은인이다. 한밤중에 전화받고 놀란 부모님은 함께 사는 친구와 동생에게 전화해 내가 실려간 응급실에 얼른 가보라고 일러줬다.
또 깜박. 기억은 조각조각으로 남아 있다. 나를 흔들어 깨운 구급대원에게 신분증을 주고, 들것에 실려가며 연신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진심이었다. 내 부주의로 공적 자원을 낭비했다는 자괴감이 드는 동시에, 돌봄받고 보호받는다는 안도감이 밀려와서 눈물이 났다.
서너 시간 뒤 새벽출근을 해야 하는 동생이 응급실에 왔다. 직장 내 ‘긴급돌봄휴가’(가족 및 반려동물을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에게 긴급한 조력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휴가)를 쓸 수 있는 내 생활동반자 대신에 동생이 왔던 건, 혹시나 내가 의식이 없을 때 필요할지 모를 수술동의서 등의 서류에 서명할 사람이 현재로선 혈연가족인 동생뿐이었기 때문이다. 천만다행히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 밤 동생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수차례 답했다고 한다.
경증환자 응급실에는 다양한 사유로 다친 사람들이 가득했다. 밤에도 느려지지 않는 손발로 이들을 응대하고 돌보고 필요한 처치를 하는 의료노동자들을 만났다. 한 간호사는 내 발목에 컴퓨터단층촬영(CT)용 조영제를 주입할 혈관을 확보할 때 고무줄 묶는 걸 깜박하더니, 깔끔하게 혈관을 확보해낸 자신에게 감탄하며 “저 완전 명간호사죠?”라며 동의를 구했다. 병원에 오고서 처음 웃음이 났다. 여러 검사를 하느라 휠체어에 실려 불 꺼진 복도를 달리는데, 휠체어를 밀어준 간호사는 운전을 어찌나 잘하던지 부드러운 코너링이 완벽했다. 환자는 많고 인력은 적어 대기시간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덕분에 병원의 야간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다고 하자, 간호사인 동생이 최근 이슈가 되는 ‘간호법 제정’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했다.
진료비계산서를 받아든 아침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존재에 감사했다. 안경이 사라져 다음날 아침 6시 지하철역에 전화했더니 나를 도와준 역무원이 한참을 걱정해줬다. 그런데 왜 그 시간까지 퇴근을 안 했는지. 서울교통공사의 역무원 인력 감축이 또 한 번 걱정되는 순간.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안경은 겉옷 안주머니에 고이 들어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세심하게 챙겨준 거다. 가방에는 누가 넣어준 건지도 모르는 꿀물이 있었고, 집에 오니 비혼동거가족 간에도 쓸 수 있는 긴급돌봄휴가를 받은 친구가 대신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내 상태도 살펴줬다.
세밑 길었던 그 밤에 나를 구한 건 여성 시민, 구급대원, 의료노동자, 가족과 친구, 그들 직장의 긴급돌봄휴가 정책처럼 사적 돌봄과 공적 돌봄이 얽히고설켜 만든 그물망이었다. 그 밤에 마주친 사람 하나하나가 시스템이고, 안전망이고, 사회적 돌봄이었다. 정부의 노동정책 개편안, 각종 복지예산 감축과 공공영역 인력 감축, 그리고 의료민영화 시도가 실질적인 위험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국가의 최우선이자 궁극적인 책임은 지속가능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는 <돌봄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속 문장을 되새기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김주온 BIYN(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활동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검찰청 술판 회유’ 폭로한 이화영, 검사·쌍방울 임직원 고발

특위 “내년 의대 정원 다루지 않겠다”…의협은 불참 고수

민희진 “빨아먹고 찍어 누르기”…하이브 “무속인 코치받아 경영”

경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압수수색

헌재, 형제자매·패륜가족에 ‘무조건 유산 상속’ 제동

날짜 또 못 잡은 ‘윤-이 회담’…민주 “의제 검토 결과 못 들어”

‘자두밭 청년’ 향년 29…귀농 7년은 왜 죽음으로 끝났나

대법 “일용직 노동자 월 근로일수 산정…20일 초과 안 돼”

이재명-조국, 첫 회동서 고량주 한 병씩…“자주 만나 대화할 것”

하이브, 민희진 오늘 고발…“‘뉴진스 계약 해지’ ‘빈껍데기 만들자’ 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