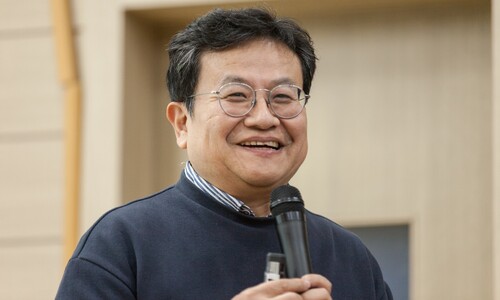북한 개성 교외 만수산 기슭 언덕에 있는 고려 8대 임금 현종의 선릉. 병풍석이 묻힌 채 민묘처럼 퇴락한 무덤을 훼손된 석물들이 쓸쓸히 지키고 서 있다. 무덤 바로 앞에 옥수수밭이 펼쳐져 있다. 장경희 한서대 교수(문화재보존학) 제공
19살 왕은 즉위하자마자 도망쳤다. 1011년 1월1일 고려의 8대 국왕 현종(顯宗)은 거란(요나라)이 불태우는 수도 개경의 모습을 경기도 광주(廣州)에서 전해들어야 했다. 현종의 피란은 온전히 그의 책임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1009년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선대임금 목종(穆宗)을 쫓아낸 뒤 목종의 사촌 동생 현종을 왕위에 올렸다. 그 전까지 태자의 신분이기는커녕 승려 신세로 북한산 안의 절에 숨어 있던 현종을 찾아 ‘바지사장’으로 삼은 셈이다. 당시 동북아시아의 세력국가로 크던 거란의 왕 성종은 강조의 이 정변을 문제 삼아 대군을 이끌고 고려로 남하했다.
강조는 대군을 편성해 평안도로 올라가 요나라와 싸우지만 통주 전투에서 패배했다. 요나라 성종의 대군은 강조를 죽인 뒤 평양을 지나 개경으로 돌입했다. 현종이 피란을 간 직후인 1011년 1월1일이라는 때를 골라 개경에 입성해 수도를 빼앗았다.
피란길에 나선 현종의 심정은 어땠을까. 자신을 왕위에 올리고 보호해주던 강조가 죽었으니 현종은 생애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현종은 항복을 선택하는 대신 왕조의 명운을 걸고 피란을 택했다. 후삼국시대인 견훤과 궁예의 시절에서 채 100년이 지나지 않던 때였다. 지방을 호령하는 세력이 개경의 왕실을 인정하리라는 기대는 아예 없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현종으로선 자신의 운명을 불확실성에 맡긴 결정이었다.
실제 현종은 전라도 나주까지 가는 피란길에서 온갖 고초를 겪는다. 개경의 조정에서 같이 피란을 결정했을 신하들은 모두 도망갔다. 그를 호위하는 군사는 채 50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방세력은 왕을 보호하기는커녕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다. 도적과 호족의 사병들이 여러 차례 왕을 공격했다. 이들을 ‘적’이라고 기록은 전한다. 한 지방관리는 왕에게 “나의 얼굴을 기억하느냐”고 이죽거렸다. 그들이 현종을 공격할 때마다 신하, 궁녀, 내관들은 왕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 시기 현종은 경호대장이던 지채문과 목숨을 걸고 요나라 성종을 찾아 협상한 하공진 등 소수 신하의 도움만으로 거란과 지방세력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두 달에 걸친 피란을 마치고 가까스로 돌아온 도성 개경은 약탈로 폐허가 돼 있었다. 현종은 묵묵히 궁궐을 수리하고, 공훈을 세운 장수들과 관리들에게 포상했다. 그리고 말했다. “외람되게 왕위를 계승해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을 두루 겪었다. 밤낮으로 부끄러움과 다투며 그 허물에서 벗어날 것을 생각한다. 신하들은 나의 부족함을 도와달라. 면전에서 좋은 소리만 하지 마라.”
‘나는 잘못이 없다’ ‘다 신하들의 잘못이다’라고 말해도 무방한 사람이 거꾸로 ‘다 내 탓이니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라고 했다. 왕이 이렇게 자신을 책망했을 때, 왕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슬금슬금 돌아온 신하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자신을 책망한 현종은 강감찬을 비롯한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재건했다. 다시 쳐들어온 거란을 물리치며 귀주대첩을 이끌었다. 이후 펼쳐진 11세기 동북아 평화의 한 축이 바로 그였다. 고려 후기의 대신 이제현은 현종에 대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분”이라고 했다.
정치적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최고 권력을 쥐었다는 점에서 현종과 윤석열 대통령은 비슷한 면이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퇴임 1년 만에 대통령이 됐다. 의회정치를 경험해보지 않았고, 한때 지금의 여당과는 ‘적’으로 지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러 차례 자신을 “불려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40여 일이 된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설픈 국정운영과 여러 차례 빚어진 정책적 실수, 무엇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에서 상징되는 ‘정치적 역량 부재’가 결정타로 작용했다.
정책적 실수는 고쳐나가면 되고, 전 여당 대표와의 갈등은 당을 재정비하면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많은 비판을 받은 ‘만 5살 입학’ 정책을 수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준석 체제’를 ‘정진석·주호영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처럼 권력 운영 방식은 ‘시간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권력’을 이해하는 태도다. 윤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권력을 어떻게 써야 하고,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
최근 미국 뉴욕 방문에서의 발언 논란을 보자. 논란 15시간 뒤 기자들 앞에 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대통령 발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고 했다. 김 수석은 ‘비속어’ 지칭 대상은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를 의미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비속어도 불분명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리고 발언을 보도한 언론 탓을 한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조차 비속어를 썼는지 기억하기 어렵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은 잠잘 때만 빼고 자신의 말이 노출되는 직업이다. 이를 몰랐단 말인가.
이해되지 않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윤 대통령의 ‘말’은 지금껏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관련 논란이 커지자 “전 정권 인사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고 했고, 박 전 장관에게 임명장을 줄 때는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았다”고 했다. 수도권 집중호우가 내린 다음날에는 “퇴근길에 아파트 침수 광경을 봤다”며 그대로 집에 갔다고 말했다.
1천 년 전 자신을 책망한 한 젊은 고려 왕이 있었다. 역사 기록은 왕이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도와달라 말했다고 전한다. 곱씹어볼 대목이다. 결국 정치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하는 행위다. 윤 대통령은 지금 ‘나를 이해해달라’고 말할 때가 아니다.
이도형 <세계일보> 기자
*역사와 정치 평행이론: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언론사 정치부에서 국회와 청와대 등을 8년간 출입한 이도형 기자가 역사 속에서 현실 정치의 교훈을 찾아봅니다. 3주마다 연재.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자두농사 청년’ 향년 29…귀촌 7년은 왜 죽음으로 끝났나

‘도로 친윤’ 국힘…이철규 원내대표 밀며 “욕먹어도 단일대오”

민희진, 1년 전 “어도어는 내 음악·사업 위한 회사” 인터뷰 재조명

용산 국가안보실·공직기강실 동시다발 전화…‘채상병 기록’ 회수됐다

“세빛섬 ‘눈덩이 적자’ 잊었나”…오세훈, 한강 토건사업 또?

후쿠시마 농어·가자미…오염수 방류 뒤 ‘세슘137’ 껑충 뛰었다

“사단장께 건의했는데”…‘해병 철수 의견’ 묵살 정황 녹음 공개

‘학생인권조례’ 결국 충남이 처음 폐지했다…국힘, 가결 주도

의대교수 집단휴진에 암환자들 “죽음 선고하나” 절규

4월 25일 한겨레 그림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