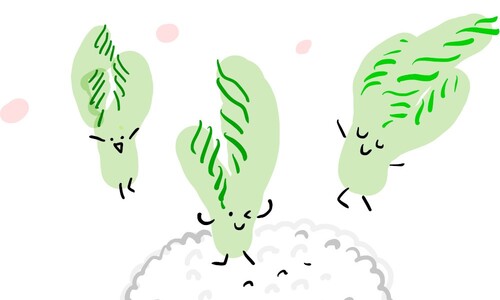할아버지 납골당 앞에 선 동환이. 죽음의 의미를 동환은 알까.
“여보세요. 어, 형. 지금? 어, 알았어.” 어느 수요일의 이른 아침, 형과 통화하는 남편 목소리를 들으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죽음의 무게는 크고 깊었다. 남편을 꼭 껴안아준 뒤 장례 준비에 들어갔다. 남편은 앞집에 사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갔고 나는 아들을 어디에,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고민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코로나가 뭔지, 우정이 뭔지, 종교가 뭔지도 모르는 아들에게 ‘죽음’을 이해시키는 건 어려운 과제다. “아들을 어째야 할까?” 시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다 큰 아들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걱정부터 하는 게 발달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 현실이다.
먼저 아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에 연락했다. 봄방학이라 긴급돌봄은 중단됐지만 맞벌이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교실은 운영 중이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오기 전까지 오전 3시간만이라도 돌봄교실에 있을 수 있다면 나는 안심하고 장례식장에 갈 수 있으리라.
하지만 규정이 없어 난감해하는 학교 쪽 입장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학부모가 부모 연수에 참여할 때는 돌봄이 가능하지만 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이나 이전 사례가 없다고 했다. 아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가장 좋은데…. 익숙하니까. 공간도, 사람도.
“아이고, 선생님. 부모 연수 그런 거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지만 정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건 이런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학생이 가족 상을 당했을 때도 한시적이나마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 수칙을 개정해달라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으로 알아본 건 발달장애인을 위한 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이 같은 처지에 있는 발달장애인의 부모이기도 해서일까. 한 번에 오케이. 집으로 와서 봐줄까, 센터에 같이 있을까, 밖에 데리고 다닐까. 아들이 가장 편한 방식으로 긴급돌봄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활동지원사와 시간을 맞춘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들은 가족지원센터 도움을 받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나 센터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낼 게 눈에 훤히 보였기 때문이다. 왜 이곳에 와야 하는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엄마가 처음 보는 낯선 사람, 낯선 공간에 자기를 맡기고 홀연히 사라져버리면 아들의 불안감은 하늘 끝까지 치솟을 터였다. 그래, 너도 그냥 장례식장에 같이 가자. 그렇게 아들은 이틀 동안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다.
사실 아들을 오랜 시간 장례식장에 머물게 하는 건 모험 같은 일이었다. 어떤 행동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문 중인 하객에게 같이 놀자고 돌진하진 않을지, 할아버지 영정사진 만지겠다고 다가갔다 재단을 망가트리진 않을지, 집에 가자고 울면서 떼쓰진 않을지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그럼에도 아들과 장례식장에 함께 있기로 결정한 건 이번 기회를 통해 아들이 ‘죽음’에 대해 배우길 바랐기 때문이다.
‘어? 하얀 꽃이 있고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 낯선 곳 한가운데 할아버지 사진이 있네. 어? 그런데 이곳에 다녀간 다음부턴 할아버지 집에 가도 할아버지가 안 보이네. 할아버지 어디 있지? 할아버지 왜 없어?’
아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된다. 그것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래에 외할아버지와 양가 할머니의 장례식장을 또 가게 되면 그 반복된 경험을 통해 아들은 배울 것이다. 이런 분위기(장례식장)에 사진(영정사진)이 놓이면 그다음부턴 사진 속 사람을 다신 볼 수 없다는 것을. 죽음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진 못해도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은 알게 될 것이다.
알아야 한다. 그래야 아주 먼 훗날 나와 남편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아들은 다시 오지 않을 엄마와 아빠를 하염없이 기다리느라 지치지 않을 것이다. 혹여나 버림이라도 받은 줄 알고 엄마 아빠가 언제 오나 기다리며 울지 않을 것이다. 그때를 위한 대비다.
걱정과 달리 아들은 장례식장에서 잘 지냈다. 재단 옆에 마련된 방에서 또 다른 어린이 친척들과 함께 휴대전화를 갖고 뒹굴었고, 끼니때가 되면 육개장에 보쌈과 전으로 배부르게 밥을 먹었으며, 심심하면 조문객이 없는 틈을 타 상제들이 앉는 의자에 앉아 상제 흉내도 냈다.
에너지가 넘쳐흐를 땐 장례식장 복도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왔다 갔다 했다. 나는 상복을 입은 채 열심히 그 뒤를 따라다녔는데 꽃도 많고 사람도 많은 분위기가 좋았던 아들은 연신 웃기만 했다. 죽음의 무게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장례식장 안에서 까르르 웃으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아들이라니.
고마웠던 건 이웃 장례식장의 모두가 처음 보는 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했다는 점이다. 남의 장례식장 앞에서 고인 사진을 보며 노래 비슷한 걸 흥얼거려도, 남의 근조 앞에서 꽃을 쓰다듬고 있어도, 사람들은 “뭐 하는 짓이냐”고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한다.
더불어 모두에게도 부탁하고 싶다. 앞으로 장례식장에서 발달장애인을 만나면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아들이 이해받았듯 그들도 이해해주길 바란다. 죽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라도 해서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만 언젠가 미래에 돌아오지 않을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는다. 가족의 노력만으론 어렵다. 하지만 장례식장이나 납골당에서 모두가 이해하고 배려하면 이들은 직접 경험함으로써 죽음을 나름의 방식으로 배울 수 있다. 그럴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글·사진 류승연 작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인적 쇄신 막는 ‘윤의 불통’…‘김건희 라인’ 비선 논란만 키웠다

이화영 “이재명 엮으려고”…검찰 ‘술판 진술조작’ 논란 일파만파
![이승만·박정희를 국립묘지에서 파묘하라 [왜냐면] 이승만·박정희를 국립묘지에서 파묘하라 [왜냐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18/53_17134316400177_20240418503354.jpg)
이승만·박정희를 국립묘지에서 파묘하라 [왜냐면]

22대 국회 기선제압 나선 민주 “법사위·운영위 모두 가져야”

‘의대 증원분 절반 모집’도 허용해달라는 대학들…정부 받아들일까

멤버십 58% 올린 쿠팡, 해지 방어에 쩔쩔

‘똘레랑스’ 일깨운 홍세화 별세…마지막 당부 ‘성장에서 성숙으로’

“15살 이하는 영원히 담배 못 사”…영국, 세계 최강 금연법 첫발

검사실서 사기범 통화 6번 방치…징계받은 ‘이화영 수사’ 지휘자

“물 위 걸은 예수, 믿느냐”…신앙 검증해 교수징계 밟는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