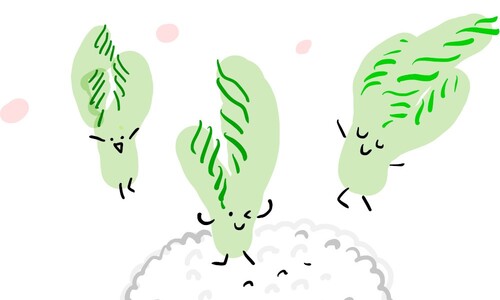김창룡 경찰청장이 2021년 1월6일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년이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은 분노와 슬픔이 뒤엉키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었다. 16개월 정인이가 학대로 죽음에 이른 과정이 다시 조명됐기 때문이다. 아이의 환한 웃음이 어른의 몰지각한 폭력 속에 점점 사라지는 현장이 바로 내 옆에 있었다. 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평범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평범해 보였던’ 엄마 아빠를 둔 아이.
한 지인은 그 사건이 일어난 동네에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언론 보도에서 아파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 동네였어.” 지인의 말에는 안타까움이 잔뜩 묻어 있었다. “혹시 내가 보고도 지나친 건 아닐까, 혹시 우리 병원에 왔는데 내가 몰랐던 걸까. 1년치 차트를 다 훑어봤어.” 그러고 보니 동네 시장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붙인 펼침막이 이미 걸려 있었다. “16개월 입양아 학대 살인 공범자에 대한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한 대로 ‘내가 아이를 봤다면’ ‘내가 학대 정황을 감지했다면’ 학대 신고는 쉬울까. 여러 지표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7월 연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신고한 건수는 2016년 216건으로 등록 의료진 가운데 0.8%에 불과했다. 의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정한 신고의무자다. 학대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교사는 어떨까. 실천교육교사모임이 2021년 1월6~10일 5일 동안 유·초·중·고·특수 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실시한 아동학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의심할 만한 사례를 목격한 교사는 318명으로 조사 대상의 40%에 이르는데, 신고 경험이 있는 교사는 154명으로 목격한 교사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교사 역시 법이 정하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해 학대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인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60%에 이르렀다.
이들이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 밝힌 것은, 신고 이후 받게 되는 여러 절차적 부당함과 위협이다. 학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신고한 의사에게 있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 등에 의해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고 그 때문에 피신고 부모에게서 폭언과 협박을 듣는 일이 허다하다. 실제 최근 한 공중보건의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했는데 경찰이 ‘병원 신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바람에 2시간 동안 폭언과 욕설에 시달렸다.
교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앞의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신고 뒤 아동의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33.8%)였지만, ‘가해 주양육자의 위협’(14.1%), ‘신고 이후 소송에 시달릴까봐’(8.7%)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 10명 중 7명이 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책으로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꼽았다.
딜레마는 이미 ‘신고자의 신변 보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은 의사, 교사, 어린이집 교사는 물론 아동복지시설·청소년시설 종사자, 심지어 학원 강사까지 아동학대 정황을 인지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의무를 부여하는 만큼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도 범죄 신고자들에게 취하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다.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서나 신고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또 신고자 등이 보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청할 때는 검사나 경찰이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다.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 법이 있어도 사각지대다.
‘누가 신고했는지’ 술술 알려주는 경찰은 “몰랐다” “고의가 없었다”고 말하기 일쑤다. 이미 존재하는 법제도를 담당 업무를 하는 경찰은 위반하고서는 ‘고의성이 없다’며 처벌받지 않는다.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는 ‘공익신고’에도 해당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여러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내가 이 재미없고 따분한 법을 구구절절 늘어놓는 이유는 법이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있는데 알려지지도 않고 지켜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신고의무자도 모르고 업무 담당자도 잘 모른다. 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센터에 전화했는데 “아동학대는 공익신고가 아니다” “아동학대 신고센터가 따로 있다”라는 상담사의 부정확한 답변을 받았을 뿐이다.
2015년 <한겨레>에서 기자 5명이 2008~2014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의 숫자를 다시 세고 그중 112명의 죽음을 심층 분석했다. 보도는 당연히 ‘신고의무자의 신고 외면’이 발생하는 이유, 줄어드는 아동학대·아동복지 관련 예산 등 해결책에 대한 제언도 담았다. 그러나 이들이 책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을 펴내던 2016년 또다시 경기도 평택에서 학대에 시달리던 7살 남자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16개월 아이가 사망하는 등 유사한 분노와 절망이 반복되고 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학대 가해자 처벌 중심의 법 개정안 목록만 쌓이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법을 만들기만 해서는 소용없다. 법을 고치더라도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 이를 보정하고, 아이들을 학대 가정에서 분리해도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책정한 뒤 아이들 쉼터를 확보하고, 아동학대 조사 업무와 학대아동 돌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양질의 인력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분노’는 개선의 연료이지만, 연료 소진만 반복되는 현실에 좌절할 뿐이다.
박수진 경기도 공익제보지원팀장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윤 “국정철학 흔들리지 않는다”…총선 당선자 일부에 전화 [단독] 윤 “국정철학 흔들리지 않는다”…총선 당선자 일부에 전화](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18/53_17134162229486_20240418501758.jpg)
[단독] 윤 “국정철학 흔들리지 않는다”…총선 당선자 일부에 전화

이화영 수사 지휘자, 검사실서 ‘사기범 통화 6번 방치’ 징계받았다

‘똘레랑스’ 일깨운 홍세화 별세…마지막 당부 ‘성장에서 성숙으로’

“죽기 직전까지 약 먹이며 돌고래쇼”…거제씨월드 처벌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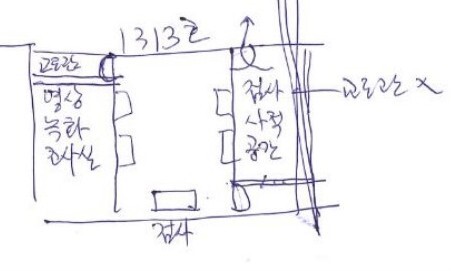
‘술판 진술조작’ 허위라는 검찰에 이화영 쪽 “출입기록 공개부터”
![[단독] 특검법 임박하자 이종섭 ‘수사자료 회수, 내 지시 아니다’ [단독] 특검법 임박하자 이종섭 ‘수사자료 회수, 내 지시 아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17/53_17133466788152_20240417503131.jpg)
[단독] 특검법 임박하자 이종섭 ‘수사자료 회수, 내 지시 아니다’

“15살 이하는 영원히 담배 못 사”…영국, 세계 최강 금연법 첫발

“주중대사, 갑질 신고자 불러 ‘끝까지 갈지 두고 보자’ 위협”

멤버십 58% 올린 쿠팡, 해지 방어에 쩔쩔

‘통산 홈런 1위 예약’ 최정, 골절 피했다…단순 타박 소견




![[제보자들] 쓰레기 버렸다, 주차선 어겼다… 쪼잔한 학교](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114/53_16053529038616_471605352893195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