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족한 아빠가 주 양육자였는데도 아이가 한 해 동안 잘 자라줘 얼마나 고마운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라.
‘아빠가 키우는 아기도 잘 자랄까?’ 올해 1월, 1년짜리 육아휴직을 시작하면서 들었던 질문이자 가장 걱정이었던 의문이다. 휴직 10개월이 넘어가면서 그 걱정은 이제 조금 내려놨다. 첫돌을 맞은 아이는 고맙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자신의 속도로 잘 자라고 있다. 벌써 태어난 지 1년이 지나 10월에 돌잔치를 했다. 돌잔치를 끝낸 엄마를 ‘돌끝맘’이라 한다는데, 준비가 힘든 돌잔치를 끝낸 걸 자축하는 뜻으로 쓰는 말일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에 돌잔치를 조촐하게 할 수 있었다. 양가 딱 열두 명만 모여서 하니 부담도 적었다.
휴직으로 가장 좋았던 건,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건 평범한 문장으로는 그 의미를 다 담기 어려운, 인간만이 누리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일이 아닐까 싶다. 특히 태어난 직후 한 해는 인간의 일생 중 가장 극적으로 성장하는 기간이다. 뒤집지도 못하고 누워 있기만 하던 아기가 이젠 손을 잡아주면 성큼성큼 걷는다. 웃거나 옹알이밖에 못하다가 지금은 또랑또랑한 발음으로 “압빠!” “엄마!” 하고 소리친다. 내가 “만세!”라고 말하면 손을 번쩍 드는 듯한 개인기도 몇 개 가능해졌다. 물론 아이가 할 때가 되니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놀람과 기쁨, 성취감으로 가득했다.
복직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니 슬슬 그 이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베이비시터와 함께 돌보는 방식을 알아보고 있다. 잘들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아이 옆에 부모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동네에서 평일 낮에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를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직장일도 걱정이다.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일을 놓고 있었는데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일과 육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며 회사에서 요구받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사실 돌봄 노동에서 열외인 건 오랜 세월 남성들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비결’이었고, 성공을 거두는 ‘조건’이었다. 존경하는 언론인 리영희 선생도 자신이 분투한 삶과 지적 성취가 “보살핌 노동에서 면제된 남성의 특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정희진)이란 지적에 수긍했다고 하니, 리 선생은 그 세대에서 ‘남성의 특권’을 솔직하게 인정한 드문 사람일 것이다.
육아의 세계에서 대체로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중력의 세기가 다르기에, 아빠와 엄마에게 다가오는 육아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도 다를 수밖에 없다. 아빠는 육아에 조금만 참여해도 칭찬받지만, 엄마는 아무리 해도 당연하게만 여겨진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돌봄 노동을 여성 영역으로만 떠밀 수 없다.
나 자신을 돌아본다. ‘아빠’가 가사와 육아를 한다는 걸 아내에게 생색내진 않았나. ‘아빠 육아 휴직자’를 보는 시선에 우쭐하진 않았나. 관습적 성차별에 동조하진 않았나. 육아휴직이 끝나가면서 드는 질문이자, 가장 큰 과제다.
글·사진 김지훈 <한겨레> 기자 watchdog@hani.co.kr
* 김지훈의 ‘아빠도 몰랑’ 연재를 마칩니다. 김지훈 기자와 칼럼을 사랑해주신 독자께 감사드립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자두농사 청년’ 향년 29…귀촌 7년은 왜 죽음으로 끝났나

‘도로 친윤’ 국힘…이철규 원내대표 밀며 “욕먹어도 단일대오”

후쿠시마 농어·가자미…오염수 방류 뒤 ‘세슘137’ 껑충 뛰었다

민희진, 1년 전 “어도어는 내 음악·사업 위한 회사” 인터뷰 재조명

“세빛섬 ‘눈덩이 적자’ 잊었나”…오세훈, 한강 토건사업 또?

‘학생인권조례’ 결국 충남이 처음 폐지했다…국힘, 가결 주도

류현진, 통산 100승 달성 실패…내야 실책에 대량 실점

의대교수 집단휴진에 암환자들 “죽음 선고하나” 절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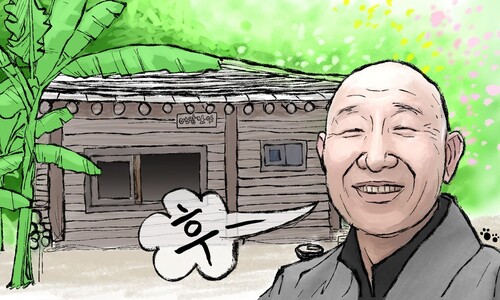
5평 토굴의 스님 “편하다, 불편 오래되니 ‘불’ 자가 떨어져 버렸다”

전국 대중교통 환급 ‘K-패스’ 발급 시작…혜택 따져보세요

![[아빠도 몰랑] 아이의 마음을 읽게 해주소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016/53_16028373851812_5816028373319175.jpg)
![[아빠도몰랑] 만 10개월 아들의 ‘코로나 인생’](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921/53_16006148602018_8516006148510021.jpg)
![[아빠도 몰랑] 술잔과 젖병, ‘환상의 콜라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724/53_15955750680599_3815955750557836.jpg)
![[아빠도 몰랑] 나의 하루는 밤 9시에 시작된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703/53_15937837176792_1115937837064651.jpg)
![<span> [아빠도 몰랑] 사흘간 같은 이유식도 잘만 먹더라</span>](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612/53_15919456630931_7115919456357493.jpg)
![<span>[아빠도 몰랑] 나는 왜 그때 안도했을까</span>](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515/53_15895285392378_5015895285227403.jpg)
![<span>[아빠도몰랑] 그래도 까꿍은 잘해</span>](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12/imgdb/original/2020/0504/851588519769214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