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밥하는 게 괴롭다. 나 혼자 사는데도 그렇다. 코로나19 탓에 삼 주째 집에 처박혀 세끼 밥을 해 먹으려니 내 허기가 ‘웬수’다. 점심은 빵으로 때워야지 하고 식빵 봉지를 열었는데 푸른곰팡이가 피었다. 곰팡이를 떼어내니 빵이 5분의 1도 남지 않았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울고 싶었다. 또 뭘 먹나. 달걀이 있다. 삶아 먹고 프라이해 먹고 비벼 먹다 다시 삶아 먹다 질렸다. 배가 호통친다. 내 몸인데 봐주는 게 없다. 밥을 물에 말아 무장아찌를 놓고 허겁지겁 먹었다. 배달음식은 쓰레기를 쏟아낸다. 양심에 찔리고 쓰레기 치우는 것도 일이다.
밥하는 게 뭐가 힘드냐는 사람
갈 데가 없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곳은 휴업에 들어갔다. 마트엔 가면 안 된다. 수입이 줄었다. 돈 쓸 때가 아니다. 개가 깨워 일어난다. 매일 똑같은 추리닝을 입고 개를 데리고 산책하러 나간다. 개가 보채지 않으면 신발 신을 일도 없을 거 같다. 가을이 오니 매미들이 배를 까고 죽어 있다. 이 개는 어마어마한 발견이라는 듯 매미 사체에 대고 짖다가 발로 눌러봤다가 10여 분을 탐구한다. 오늘이 어제인지 내일인지 삶의 자극을 잃은 나는 개의 탐구생활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또 배가 고프다. 집에 오자마자 밥을 물에 말아 먹는다. 졸음이 쏟아진다. 졸고 나면 또 배가 고프다. 허기는 의욕을 먹어치우고 부실한 밥상은 무기력으로 복수한다. 밥하는 게 뭐가 힘드냐 말하는 사람은 삼시 세끼 책임져본 적 없다는 데 돈 건다.
봄에 재택근무하다 “이중노동에 병날 뻔했다”는 친구는 이번엔 출근하려 했으나 결국 재택근무를 하게 됐다. 애들이랑 놀지 못하고 학교도 못 가는 11살 딸이 엄마가 출근하고 나면 컵라면만 먹어댔기 때문이다. “30분 자리를 비우면 사유를 입력해야 해. 점심시간 한 시간 동안 애 먹이고 하려면 아침에 세팅을 다 해놔야 해. 빨래통에선 빨래가 기어나올 지경이야. 원래 혼자 잘 놀던 앤데 요즘엔 자꾸 안아달래. 애 혼자 두면 주야장천 유튜브를 봐. 놀 사람이 없으니까.”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2020년 여성의 삶’을 보면, 맞벌이하는 경우 여성의 가사 시간은 하루 3시간7분, 남성은 54분이다. 5년 전보다 여성의 가사 시간은 겨우 3분 줄었다(<한겨레> 9월3일치 보도). 돈이 받쳐준다면 가사 노동은 더 가난한 여자들 차지가 된다.
친구 여동생도 아이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는데, 이 자매는 70살 엄마를 놓고 한동안 쟁탈전을 벌였다. 두 딸의 ‘바깥일’은 노인의 노동 없인 흔들리지만 이 노인은 통계에서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양짐’으로 잡힌다. 김도현은 책 <장애학의 도전>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에 대가가 주어지는 게 노동 규범인데 이제는 대가가 곧 가치가 됐다고 썼다. 그 책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다. 2009년 영국 신경제재단 소속 연구원들이 분석해보니, 월급 1만3천파운드를 받는 보육 노동자는 임금 1파운드당 7~9.5파운드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지만 연간 소득 50만~1천만파운드를 받는 투자은행가는 임금 1파운드당 7파운드의 사회적 가치를 파괴했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한 동창이 우스개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집에 갔더니 엄마가 나보고 나물을 무치래. 나 같은 고급 인력한테.” 그 동창이 외국계 기업에서 공동체를 위해 무슨 가치를 생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물을 무치면 여러 사람이 한 끼는 먹을 수 있다.
밥 못 먹었으면 그런 막말을 했을까
밥 안 먹고 ‘큰일’은 할 수 없으니 ‘큰일’은 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정지우 감독이 1996년 만든 단편영화 <생강>에서 아내는 두 아이를 키우며 밥을 하고 술상을 차린다. 노동운동을 하는 남편과 그 동지들이 받을 술상이다. 이들은 술상만 받고 문을 닫는다. 아내는 문밖에서 인형 눈을 붙인다.
정리해고 칼바람이 불던 1998년 현대자동차 노조가 36일 동안 총파업을 벌인다. 그때 ‘구내식당 아줌마’들은 시위대 앞줄에서 냄비를 두드리며 함께 싸웠다. 시위만 한 게 아니라 천막농성 중인 시위대가 먹을 밥을 한다. 집에서도 밥을 한다. 총파업은 277명만 정리해고하기로 노사가 합의하면서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 277명엔 ‘구내식당 아줌마’ 144명 전원이 포함됐다. ‘아줌마’들은 이후 3년간 복직 투쟁을 벌였다. 밥 짓는 이들은 밥을 끊고 단식 투쟁도 벌였지만 정규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임인애·서은주 감독은 이들의 이야기를 3년간 좇아 다큐멘터리영화 <밥·꽃·양>에 담았다. “밥하는 동네 아줌마”는 2017년 학교급식 노동자 파업 때 이언주 전 의원이 한 말인데, 그도 밥을 못 먹으면 힘없어서 그런 막말도 못했을 거다. 당시 그에 대한 비판은 “(동네 아줌마와 달리) 학교급식 담당자는 기술자이며 노동자”라는 것이었는데 돌봄 노동에 시달리는 “동네 아줌마”들은 왜 노동자가 아닌가?
밥을 못 먹으면 마음도 허기진다. 위로는 언제나 촉감과 미각을 타고 왔다. 가장 편안했던 기억은 콩국수 맛이 난다.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이면 할머니가 시골집에서 콩국수를 해줬다. 투명한 우무묵이 들어간 콩국수다. 우무묵을 씹으면 입안이 시원해졌다. 콩국수 먹고 누우면 할머니가 참빗으로 머릿니를 잡아줬다. 그러다 잠이 들었다.
그 위로의 밥을 먹는 시간은 위계를 배우는 때이기도 하다. 명절은 밥하는 사람과 밥상을 받는 사람이 평등하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때다. 성차별을 바탕으로 한 밥하기는 헌신의 허울을 쓴 모멸이 된다. 책 <남자의 탄생>을 쓴 전인권은 어릴 때 밥 먹는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남자들은 네모난 밥상을 받고 여자들은 상다리가 부러진 둥그런 밥상을 펴놓고 밥을 먹었다. 어머니는 맨 아래엔 보리, 중간엔 감자, 그 위에 쌀을 얹은 삼층밥을 지었는데 항상 아버지 밥부터 펐다. 아버지는 쌀밥, 어머니는 보리밥 차지였다. 밥을 먹으며 위계도 함께 먹었다. 전인권은 이 책에서 위계의 질서를 내면화해 평생 신분 투쟁을 벌이다 허비해버린 자신의 40년 삶을 통렬하게 성찰한다.
나도 사료로 끼니를 때우고 싶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면서, 밥하는 사람은 찬밥 취급을 당한다. 닭을 삶는 사람은 닭다리를 먹을 수 없다. 딸 둘인 집에서 맏딸로 유사 ‘아들’처럼 자란 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밥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 엄마의 노동에 빌붙었으면서 그 노동을 은근히 무시했다. 중요하긴 뭐가 중요한가? 또 배가 고프다. 나도 사료로 끼니를 때우고 싶다.
김소민 자유기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봄 맞아 물오른 버드나무 40그루 벤 뒤…5만평 모래톱 쑥대밭으로

윤, G7 정상회의 초청 못 받았다…6월 이탈리아 방문 ‘불발’

의대 증원 1000~1700명으로 줄 듯…물러선 윤 정부

‘제4 이동통신’ 드디어 출범…“가입자를 ‘호갱’에서 해방시킬 것”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로 입건

“누구든 선한 길로 돌아올 것”…자유인 홍세화의 믿음

윤 대통령-이재명 통화, 다음주 단독 회담…고물가 논의할듯

자유인 홍세화의 ‘고결함’…외롭고 쓸쓸해 아름다웠다

멤버십 58% 올린 쿠팡, 해지 방어에 쩔쩔

“봄인데 반팔...멸종되고 싶지 않아” 기후파업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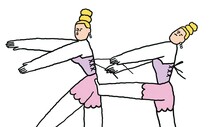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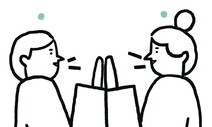


![[아무몸] 아홉 살 여자가 말했다 “여자애라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121/53_16059651125192_9116059651015046.jpg)
![[아무몸] 자유는 몸으로 만질 수 있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004/53_16018177874382_6916018177743424.jpg)
![[아무몸] 나의 깨끗함을 위해선 남의 더러움이 필요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829/53_15986906788614_5915986906570301.jpg)
![[아무몸] 더럽게 외로운 나를 구한 ‘개 공동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724/53_15955756306094_5615955756190329.jpg)
![[아무몸] 어쩔 수 없는 나여도 괜찮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710/53_15943674064803_1415943673955014.jpg)
![[아무몸] 누가 나를 돌볼까, 나는 누굴 돌볼까](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626/53_15931545419299_2415931545291646.jpg)
![<span>[아무몸] 쓰레기 자루 속 레몬 빛깔 병아리</span>](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616/53_15922336150495_9615922336026842.jpg)


![“나는 민주시민인가 고객인가, 스스로 묻자”[홍세화 마지막 인터뷰] “나는 민주시민인가 고객인가, 스스로 묻자”[홍세화 마지막 인터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19/53_17134545443068_2024041850383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