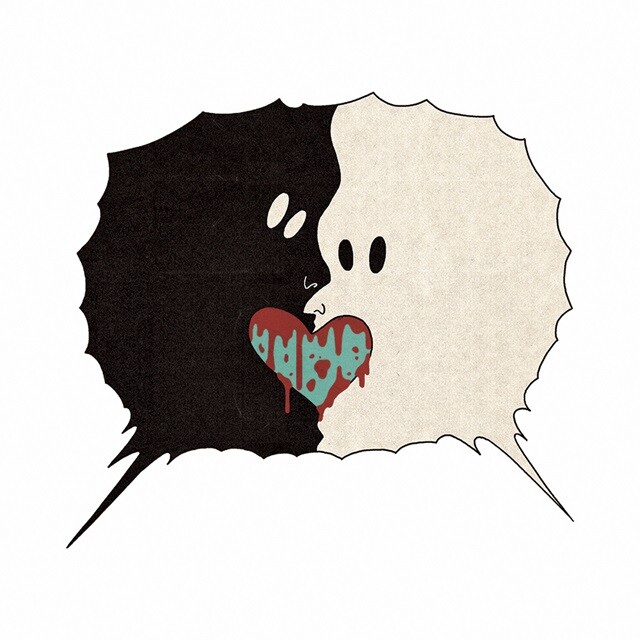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아이가 6학년이던 해 참관수업을 갔다. 교실은 토론수업을 위해 두 팀으로 나뉘어 있었다. 부모들은 교실 뒤에 서고 아이들은 상기된 얼굴로 토론을 시작했다. ‘컴퓨터게임 사용을 규제해야 하는가 아닌가’라는 주제였다.
오! 토론은 살벌했다. 감정이 격해진 아이들은 상대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번쩍 들고 얼굴이 빨개지고 목에 핏대가 서도록 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부모들은 이토록 자발성 넘치고 힘차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아이들 모습에 흐뭇해했다. 나중에 집에 온 아이가 말했다. 부모들이 돌아간 뒤 아이들끼리 대판 싸웠다는 것이다. 반대편 입장의 친구들이 자신을 한심한 게임 중독자라고 놀렸다며 눈물까지 글썽였다. 사실 이날만이 아니었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학교에서 토론수업만 하고 오면 아이는 한참을 속상해했다.
“상대편에게 유리한 근거는 숨겨요”
최근 도덕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 언급한 글을 읽었다. 친구·지인·적·타인이 모두 지켜보는 상황에서 의견을 주고받게 되면, 구경꾼의 마음을 얻으려는 경쟁심이 발동해 점점 더 강한 발언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결국 SNS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친밀감을 얻으려는 목적은 사라진다고 했다. 이 글을 읽으며 격한 논쟁을 도리어 만족해하던 학부모들과 자신들을 보러 온 부모와 진행하는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려 점점 더 과해지던 아이들 모습이 떠올랐다.
이런 문제만이 아니다. 민주시민의 소양을 기르기 위해 장려하는 토론수업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 어느 혁신학교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입장을 정할지는 자유에 맡겨요. 하지만 입장부터 정하고 그 뒤 입장에 맞는 근거를 찾는 과정이 이루어져요. 나에게 유리한 근거만 찾고, 상대편에게 유리한 근거는 심지어 숨기게 되죠. 상대의 입장에 반박하느라 바쁘지, 상대의 말을 듣지는 않아요.”
몇 년 전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경쟁 토론’이라는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비경쟁 토론은 찬반식 토론에서 벗어나, 주제를 정하면 그 주제를 논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게임’이 주제라면 ‘지금 컴퓨터게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게임에 중독성이 있다는 게 사실인가?’ ‘게임을 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뽑고, 학생들이 각각의 질문에 답을 찾고 공유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비경쟁 토론 같은 방식이 어른들의 세계에도 널리 퍼지면 좋겠지만 그럴 리 없다. 사람들은 의문을 갖는 걸 창피해하고, 신념을 택하는 것을 그럴듯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조지 오웰이 1946년에 쓴 ‘타원형 지구론자와의 토론’이라는 기사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보통의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믿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단 하나도 대지 못하면서, 그게 20세기적 사고방식에 맞는 듯하기 때문에 그냥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 오웰은 이를 ‘경솔한 신념’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이런 경향을 띠는 이유는 사실/지식/진실을 입증하는 일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했다.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질문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데, 언제부터 주변 사람들과 토론하는 일이 부담스러워졌을까. 토론수업에서 대판 싸웠던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같이 한판 뛰어놀고 나면 다시 친구로 돌아가 수다를 떨기라도 한다. 그러나 사실이 무엇이냐는 물음마저 찬반 입장 중 어느 하나로 밀어붙이는 분위기에서 많은 사람이 입을 다문다. 이토록 신념에 가득 찬 시대라니.
김보경 출판인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봄 맞아 물오른 버드나무 40그루 벤 뒤…5만평 모래톱 쑥대밭으로

윤, G7 정상회의 초청 못 받았다…6월 이탈리아 방문 ‘불발’

의대 증원 1000~1700명으로 줄 듯…물러선 윤 정부

‘제4 이동통신’ 드디어 출범…“가입자를 ‘호갱’에서 해방시킬 것”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로 입건

“누구든 선한 길로 돌아올 것”…자유인 홍세화의 믿음

윤 대통령-이재명 통화, 다음주 단독 회담…고물가 논의할듯

자유인 홍세화의 ‘고결함’…외롭고 쓸쓸해 아름다웠다

멤버십 58% 올린 쿠팡, 해지 방어에 쩔쩔

“봄인데 반팔...멸종되고 싶지 않아” 기후파업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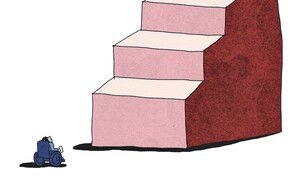














![“나는 민주시민인가 고객인가, 스스로 묻자”[홍세화 마지막 인터뷰] “나는 민주시민인가 고객인가, 스스로 묻자”[홍세화 마지막 인터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19/53_17134545443068_2024041850383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