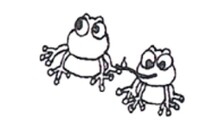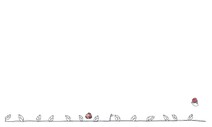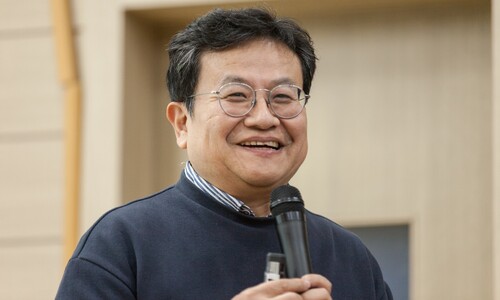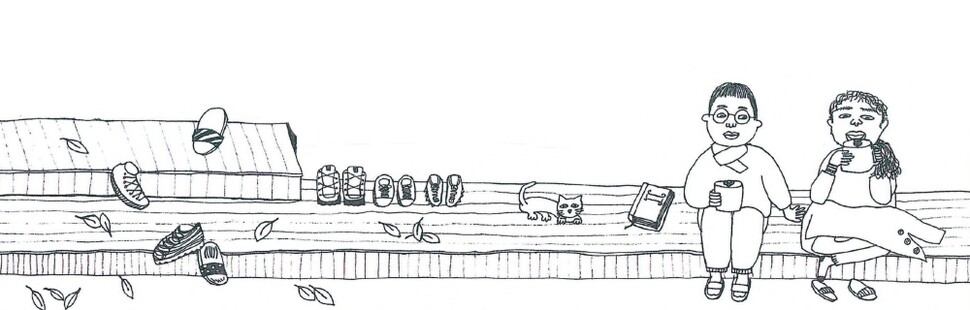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 제천간디학교 이담
나는 열일곱 살이다. 우리 언니는 스무 살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대던 시기를 거쳐, 내 나이만큼의 햇수를 함께한 역사가 있다. 언니가 고등학생이 된 뒤에는 학교생활이 너무 바빠 마주치는 시간이 점점 줄었다. 서로 물리적 거리가 생기니 멀리서 바라볼 여유가 생긴 것 같다. ‘쟤 왜 저래?’보다 그냥 ‘아, 쟤는 저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고도 할 수 있겠다. 관심이 멀어진 것 아니냐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지만.
내가 병을 진단받은 2019년 9월, 언니는 수능을 두 달 앞둔 고3이었다. 그즈음 나는 병원을 자주 다녔다. 밤 10시쯤, 거의 매일 아빠 차를 타고 언니를 데리러 갔다. 그날의 새로운 소식-알고 보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신장이 아니라 심장인 것 같대 등-을 짧게 이야기하고 언니의 평범한 일과에 대해 듣는 것이 좋았다. 여러 해 동안 계속 이야기를 들어온 언니 친구들은 성격과 행동이 눈앞에 그려질 만큼 친숙했다. 어떤 상황이었겠구나, 어떻게 반응했겠구나, 정말 그 언니(혹은 오빠)답다, 이런 내용을 상상했다.
나에게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의 일상을, 언니를 통해 엿본다는 사실이 재미있었다. 온종일 내 몸의 문제를 알려주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다가 언니의 특별할 것 없는, 내가 반쯤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은 사건들로 가득한 하루에 대해 들으면 긴장이 풀렸다. 온통 잿빛이고, 너무 심각하던 내 주변 공기가 알록달록한 현실의 총천연색으로 물드는 기분. 지치고 점점 외로워지는 내 몸에 언니의 말들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보따리씩 챙겨주는 언니를 기다렸다.
병원에 줄기차게 다닐 때도, 진단명이 나왔을 때도 언니는 안절부절못하며 걱정하는 티를 내지 않았다. 내 수축기 혈압이 160~210 정도를 웃돌 때도 “채윤이 혈압이 키면 농구선수 하겠다, 채윤이 혈압이 키면 배구선수 하겠다”며 운율에 맞춰 노래를 개사해서 불렀다. 약을 한 움큼씩 먹을 때도 주변의 “아이고… 고생이 많구나” 하는 반응 속에서도 언니는 독보적으로, 익살맞은 어투로 “약쟁이!” 하고 외쳤다. 덕분에 유쾌하게 넘길 수 있었다. 그래, 맞아. 내 몸에 이상이 있지. 어쩌면 심각한 일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우울함에 잠겨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구나! 병은, 아픔은 내 즐거움을 막을 수 없었다. 내가 ‘난 아파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하며 절망케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반드시 절망에 짓눌려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언니와 시답잖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을 수 있었다. 이제는 아픔조차 웃음 소재로 나눌 수 있었다. 물론 그것은 언니와 내가 많은 시간과 감정과 정서를 공유해서 서로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걸 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언니는 나를 걱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나와 가까운 사이고, 내가 아프다는 사실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병’ 자체와 약 부작용 때문에 생활에서 나를 고려해줘야 할 상황이 많아진 것, 대부분의 심부름에서 내가 열외가 된 것, 부모님 관심이 나에게 더 기울어지게 된 것(이건 다소 즐기는 것도 같다) 등 변한 게 많아서 미안하기도 하다.
나는 아프기 전에도 후에도 변함없이 언니의 동생이었다. 대화를 나누면 서로 너무 잘 알아서 편하고, 가끔 투덕거리며 다투는. 우리 언니는 나에게 그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사람이다. 내가 부탁하면 조금은 짜증 내면서라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알려줄 사람이다. 필요한 만큼 진지하고 단호한 어조로. 그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가끔 생각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언니가 나에게 가지는 의미만큼의 크기를 차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신채윤 고1 학생
*‘노랑클로버’는 희귀병 ‘다카야스동맥염’을 앓고 있는 학생의 투병기입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자두농사 청년’ 향년 29…귀촌 7년은 왜 죽음으로 끝났나

‘도로 친윤’ 국힘…이철규 원내대표 밀며 “욕먹어도 단일대오”

민희진, 1년 전 “어도어는 내 음악·사업 위한 회사” 인터뷰 재조명

용산 국가안보실·공직기강실 동시다발 전화…‘채상병 기록’ 회수됐다

“세빛섬 ‘눈덩이 적자’ 잊었나”…오세훈, 한강 토건사업 또?

후쿠시마 농어·가자미…오염수 방류 뒤 ‘세슘137’ 껑충 뛰었다

“사단장께 건의했는데”…‘해병 철수 의견’ 묵살 정황 녹음 공개

‘학생인권조례’ 결국 충남이 처음 폐지했다…국힘, 가결 주도

의대교수 집단휴진에 암환자들 “죽음 선고하나” 절규

4월 25일 한겨레 그림판

![길 뒤의 길, 글 뒤에 글 [노랑클로버-마지막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212/53_16762087769399_202302035000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