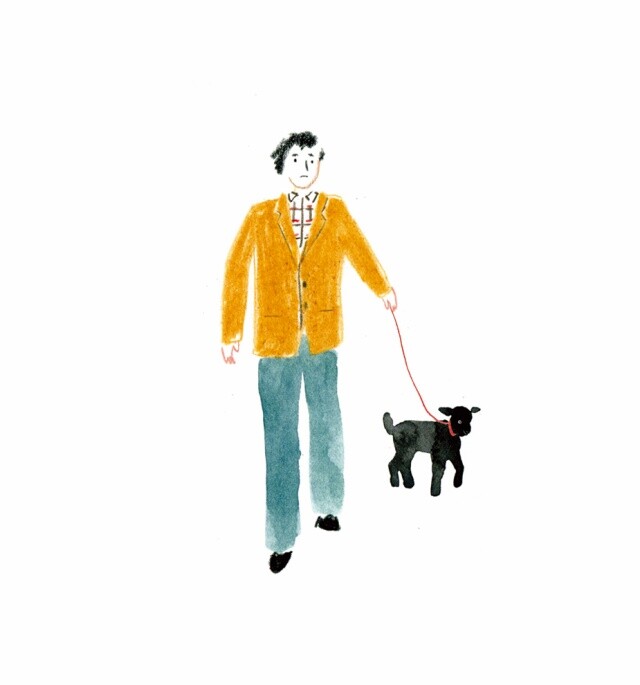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 방현일
1970년대 초 강원도 평창읍에서 문구점을 하고 살 때였습니다. 기관이나 개인이 사무용품을 외상으로 쓰고 대개 월말에 결제했습니다. 큰오빠 친구 중에 키다리 오빠가 있었습니다. 키가 188㎝여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늘 우리 문구점에서 사무용품을 가져갔는데 몇 달이 돼도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외상을 쓰기 시작한 지 한 1년쯤 되는 어느 날입니다. 키다리 오빠는 까만 흑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별다른 이야기도 없이 그냥 염소를 키워보라고 주고 갔습니다.
서점에 흑염소 산다고 소문이 나자
아마 외상값으로 퉁치자는 얘기 같습니다. 황당했지만 흑염소는 무척 예뻤습니다. 염소는 한 번도 키워본 적 없었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가겟집도 다 한옥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게를 중심으로 양쪽에 대문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집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오른쪽 대문 안은 더 좁고 왼쪽 대문 안으로 안마당과 가겟방에 딸린 부엌이 있었습니다. 안마당에 말뚝을 박고 새까맣고 탱글탱글한 흑염소에게 고삐를 길게 매어놓았습니다.
바빠졌습니다. 종부 다리를 건너가서 칡덩굴을 뜯어다 주었습니다. 시장 가서 채소잎도 구해다 주었습니다. 감자나 뿌리채소도 잘 먹습니다. 입은 소처럼 쉴 새 없이 우물거립니다. 염소는 똥을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싸고 냄새도 많이 나지 않아 다행입니다.
안마당에 수도가 있어 물을 받거나 부엌으로 들어가려면 꼭 염소 앞을 지나야 합니다. 이놈은 사람만 보면 달려들어 떠받는 버릇이 있습니다. 잘 계산해 사방으로 누가 갑자기 들어와도 피해를 보지 않을 만큼 고삐를 조절해 매어놓았습니다.
저녁때 큰오빠가 퇴근하고 돌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큰오빠가 집 앞을 지나갈 때 우리 집에 흑염소를 구경하고 가라고 붙들었습니다. 큰오빠가 대문 안에 들어서자 염소가 떠받으려고 달려들어 깜짝 놀랐습니다. “웬 염소냐?” 큰오빠가 물어서 키다리 오빠가 외상값으로 줬다고 하니 “싱거운 놈!” 하며 박장대소합니다. 큰오빠는 “하긴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더라” 하며 갔습니다.
서점에 흑염소가 산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풀을 뜯어와서 날마다 염소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것도 하루이틀이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니 아이들이 대문 밑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들여다봅니다. 풀도 뜯어다가 문 밑으로 밀어넣고 갑니다. 살구실에 사는 할머니는 풋콩 팔다 남은 것을 대문 위로 던져넣고 가셨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방현일
보자마자 이름 붙여준 엄마
가게를 볼 때는 돈을 책상 서랍에 그냥 받아 넣었다가 저녁에 정리했습니다. 우리 집은 본업인 서점 외에 문구점과 신문지국, 일일공부도 병행했습니다. 여러 일을 하다보니 일하는 아이를 여러 명 썼습니다. 그중 열세 살 먹은 남자아이 하나가 간식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항상 뭔가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잠깐 가게를 비운 틈을 타 서랍에서 돈을 한 움큼 쥐고 부엌문으로 빠져나갔는데 염소가 사정없이 떠받아버렸습니다. 가게에 딸린 방은 마당으로도 문이 나 있고, 부엌으로도 문이 나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방으로 들어가 부엌문으로 나가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나갈 수 있었는데, 아이가 미처 염소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비명 소리가 나 쫓아가보니 아이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흙바닥이어서 놀라기는 했어도 다친 데는 없었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그 와중에도 “용서해주세요, 처음이에요” 합니다. 미처 뭐라 할 새도 없이 실토해서 처음인지 아닌지 믿을 수는 없지만 “이 돈 갖다 쓰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 보냈습니다. 나도 떠받으려는 염소한테 그날은 도둑 잡은 상으로 특별히 좋아하는 사과를 먹였습니다.
가을이 되자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걱정돼 흑염소를 친정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용달차를 불러 염소와 같이 짐칸에 탔습니다. 자꾸만 떠받으려는 염소의 목을 안고 그러지 말고 잘 지내보자고 달래며 갔습니다. 친정에 가려면 옥고재를 넘어야 합니다. 옥고재 정상에 오르자 지붕 없는 차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까마득하게 내려다보이는 강물로 금방이라도 날아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철없는 염소는 눈을 반짝거리며 고개를 바짝 쳐들고 사방을 살핍니다. 내 몸은 자꾸만 산 쪽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옥고재를 넘어 친정에 갔더니 식구들은 나보다 염소를 더 반가워하셨습니다. 짐승을 좋아하는 어머니는 갑자기 “까망이가 왔나!” 하며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염소라고 불렀는데 어머니는 보자마자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름을 부르자 염소가 어머니한테로 달려가서 아차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받으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염소는 어머니 품에 아기처럼 파고들며 안겼습니다.
참 별일입니다. 사람만 보면 떠받더니 어머니를 자기 엄마처럼 반가워합니다. 목줄을 풀어줘도 어머니만 졸졸 따라다니며 어디 도망갈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만 보면 떠받던 버릇도 없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심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날씨가 가물 때는 물이 줄어 강을 건너 앞산으로 나물 뜯으러 다니셨습니다. 까망이는 헤엄쳐서 강을 건너 어머니를 따라 앞산에도 나물 뜯으러 같이 갔습니다. 집 안에서는 너무 따라다니니 귀찮을 때도 있었는데 산에까지 따라와주니 든든하다 하십니다.
산에까지 따라가주는 든든한 염소
키다리 오빠가 큰오빠와 함께 친정에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까망이는 키다리 오빠를 보자 냅다 들이받았습니다. “허허, 이놈이 오랜만에 만났으면 반가워해야지. 무슨 짓이냐!” 까망이는 혼자 살던 키다리 오빠의 외할머니가 키우던 염소였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자 키다리 오빠가 데려왔답니다. 짐승을 키워본 일이 없는 키다리 오빠는 우리 집에 외상값도 있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갖다주었답니다. 친정어머니가 자기네 외할머니와 많이 닮아서 잘 따르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전순예 1945년생 <강원도의 맛> 저자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윤석열은 생각하지 마’…한동훈 총선 메시지 ‘폭망’ 이유

윤, G7 정상회의 초청 못 받았다…6월 이탈리아 방문 ‘불발’

홍세화의 마지막 인사 “쓸쓸했지만 이젠 자유롭습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이재명 회담, 날짜·형식 정해지지 않았다”

봄 맞아 물오른 버드나무 40그루 벤 뒤…5만평 모래톱 쑥대밭으로
![‘보수 재편’ 시나리오, 윤석열에 더 큰 위기? [시사종이 땡땡땡] ‘보수 재편’ 시나리오, 윤석열에 더 큰 위기? [시사종이 땡땡땡]](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20/53_17135896461194_20240419502743.jpg)
‘보수 재편’ 시나리오, 윤석열에 더 큰 위기? [시사종이 땡땡땡]

“남자가 되게 해주세요” 부처에게 빌었던 이유

조국 “윤 대통령, 내가 제안한 만남도 수용하길”

‘제4 이동통신’ 드디어 출범…“가입자를 ‘호갱’에서 해방시킬 것”

의대 증원 1000~1700명으로 줄 듯…물러선 윤 정부

![[내가 사랑한 동물] 어머니 따라 집에 온 네눈박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807/53_15967800908117_9215967800781525.jpg)
![[내가 사랑한 동물] 동생 태평이를 입양한 임평씨](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719/53_15951657243293_4815951657066571.jpg)
![[내가 사랑한 동물] 이름이 여럿인 길고양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703/53_15937822836439_2515937822732627.jpg)
![<span>[내가 사랑한 동물] 아버지 방을 들여다보던 고양이</span>](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525/53_15903870420721_2615903870014601.jpg)
![<span> [내가 사랑한 동물]방문을 똑똑 두드리던 개</span>](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508/53_15889174929805_1815889174699695.jpg)

![[전순예의 내가 사랑한 동물] 울타리 넘어 도망친 돼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0/0415/4815869625620068.jpg)










![“나는 민주시민인가 고객인가, 스스로 묻자”[홍세화 마지막 인터뷰] “나는 민주시민인가 고객인가, 스스로 묻자”[홍세화 마지막 인터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19/53_17134545443068_2024041850383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