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내가 힘든데, 힘내라고 하면 힘이 납니까?” 펭수가 말했다. 직장인에게 열렬한 호응을 얻은 ‘펭수 명언’ 중 하나라고 한다. 나도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한 동료에게 “힘내!”라고 했다가 크게 후회한 적이 있었다. 힘은 이미 최대한으로 내고 있는데, 오히려 너무 힘내서 일하다가 소진됐는데, 거기다 대고 또 힘을 내라고 하다니. 이불킥으로도 부끄러움이 덜어지지 않아, 빨리 그를 다시 만나 다른 인사를 건네서 내 실수를 덮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무슨 인사말이 좋을까. 물색없는 소리가 아니면서 마음을 전할, 상투적이지 않은 말이 뭘까. 최고의 인사말을 떠올리려 끙끙대는 사이, 만회할 타이밍은 지나가버렸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헤어질 때 우리는 인사말을 나눈다. 가장 흔하고 무난한 인사는 “안녕하세요?”, 관계가 있을 때는 “안녕하셨어요?”로 좀 바꾸기도 하고, 더 가까운 사이에서는 “어떻게 지냈어?” 묻고 상대방의 답을 기다리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인사 한마디가 난망하다. 힘들 때 하필 가장 부적절한 말을 듣는 일도 많아서, 이상한 인사를 듣고 불쾌해진 날이면 온종일 내가 건넨 인사는 어땠나 곱씹어보게 된다.
인사말의 정치경제
다른 말과 마찬가지로, 인사말도 그저 무해하거나 중립적이지는 않다. “부자 되세요”는 대표적인 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한국 사회를 휩쓸고 지나간 2001년, 카드회사 광고 카피였던 이 말은, 한동안 ‘덕담’인 양 인사말로 널리 쓰였다. ‘부자가 되라’니.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 노동조건 악화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하던 시기였음을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는 인사다. 그다음에는 “행복하세요”가 대세가 됐는데, 사회구조나 경제체제 변화 같은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게 된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은 (겨우) 개인의 행복 정도뿐이라는 반증 같았다. 그 행복은 작을 때만 확실한 것이었다(‘소확행’). 같은 시기 콜센터 등에서 일한 서비스노동자들은 고객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해야 했다.
더 오래된 권력구조를 반영하는 인사말도 있다. “얼굴 좋아 보이네!”부터 “동안이시네요”까지, 우리는 외모 품평 없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예뻐졌네, 살 빠졌네, 남자다워졌네 등등, 한마디 더 할수록 사이가 멀어지는 인사말은 역사가 유구하다. 성별규범뿐 아니라 젊게 살아야 한다는 연령규범, 유능하고 쓸모 있어야 한다는 건강규범까지 재생산하는 인사말이다. 서서히 시력을 잃다가 40대에 완전히 실명한 신학자 존 헐은 “다음에 봐!”(See you again)라는 인사의 부적절함에 대해 쓴 적이 있다.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를, 적어도 암 투병 중인 친구에게는 할 수 없다. 좋은 인사를 건네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 거꾸로 말하면, 거대한 권력관계나 사회구조는 우리 인사말에까지 스며들어 있다.
지금, 안부를 묻고 싶은 사람들
요즈음 특히 더 안부를 묻고 싶어지는 이들이 있다. 2심에서 무려 감형된 정준영, 최종훈의 피해자들과, 느린 시간을 살아내고 있을 ‘엔(n)번방 사건’ 피해자들. 자주 싸잡아 매도당하는 공익활동가들. 그리고 지난 5월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거리로 나온 간호사들. (간호사의 노동 현실과 공공의료원 적자 현황을 알면, 우리는 더는 ‘#덕분에’라고 쓰는 것에서 그칠 수 없다.) 울고 싶은 심정이지만 웃으며 싸우는 사람들, 혐오의 쓰나미에 맞서 함께 바위가 되려는 사람들의 안부 말이다. 화이팅? 괜찮아요? 힘냅시다? 간절히 어떤 인사말을 건네고 싶지만 다 부적절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말이 부족해지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 어쩌면 그때야말로 진정 안부 인사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전희경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옥희살롱 공동대표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윤, G7 정상회의 초청 못 받았다…6월 이탈리아 방문 ‘불발’

‘윤석열은 생각하지 마’…한동훈 총선 메시지 ‘폭망’ 이유

의대 증원 1000~1700명으로 줄 듯…물러선 윤 정부

“나는 장발장, 홍세화 선생은 등대였다”…빈소 찾는 발길들

봄 맞아 물오른 버드나무 40그루 벤 뒤…5만평 모래톱 쑥대밭으로

‘제4 이동통신’ 드디어 출범…“가입자를 ‘호갱’에서 해방시킬 것”

홍세화의 마지막 인사 “쓸쓸했지만 이젠 자유롭습니다”

전국에 황사 씻는 비…제주는 호우·강풍주의보

“봄인데 반팔...멸종되고 싶지 않아” 기후파업 나섰다

이스라엘 공격 받은 이란 “추가 공세 없으면 대응 안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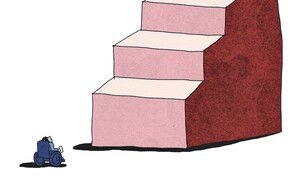













![“나는 민주시민인가 고객인가, 스스로 묻자”[홍세화 마지막 인터뷰] “나는 민주시민인가 고객인가, 스스로 묻자”[홍세화 마지막 인터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19/53_17134545443068_2024041850383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