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2기의 출범, 불행 중 다행이다. 오바마 1기 때의 ‘전략적 인내’라는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한반도 정책에 실망한 이들은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네오콘에 둘러싸인 밋 롬니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한반도 평화의 측면에서 한 고비는 넘긴 셈이다. 중국에선 11월8~14일 제18차 공산당대회를 거쳐 시진핑 체제가 공식 출범한다. 시진핑이 이끌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명분으로, 북한 정권의 안정을 우선시해온 현상 유지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동북아는 신냉전의 격랑에 휩싸여 있다. 첫째, 미-중 관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양국은 겉으론 협력을 다짐한다. 하지만 경제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과, 패권적 이익을 잃지 않으려 ‘아시아로의 귀환’을 선언하고 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하는 미국의 힘겨루기가 불꽃을 튀긴다. 둘째, 한·중·일 3국 간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외양은 ‘영토분쟁’인데, 밑둥치에선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3국 간 역사 인식의 균열과 미-중 갈등이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MB 정부 5년을 거치며 남북관계가 냉전시대의 적대로 퇴보했다.
한반도와 동북아도 탈냉전의 흐름을 타던 때가 있었다. 1998~2000년 김대중-클린턴 파트너십은 냉전의 외딴섬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훈풍을 불어넣었다. 1998년 북한의 첫 장거리미사일 발사라는 도발을 ‘페리 프로세스’(DJ 프로세스)로 감싸안으며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 북-미 공동선언 채택과 북-미 정상회담 추진으로 풀어갔다. 2001년 부시가 아니라 고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한반도 정세가 지금과 질적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촉발한 2차 북핵 위기로 동북아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2005년 ‘9·19 공동성명’이라는 동북아의 탈냉전 청사진을 이끌어낸 핵심 주체는 한-중 양국이었다. 노무현-후진타오 파트너십이 네오콘의 영향력 약화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압박해 ‘결단’을 이끌어낸 결과다. 한국전쟁에서 서로 총을 겨눴던 한-중의 극적인 협력은 국제사회에선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격언을 되새기게 한다. 김대중-클린턴, 노무현-후진타오 파트너십의 선례는 한국이 자기 힘으로 평화의 한반도를 열어가는 데 한-미 및 한-중 협력이 모두 필요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웅변한다. 편식이 몸에 나쁘듯, 편중 외교도 해롭다.
요컨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한국은 미·중·일·러 4강에 둘러싸인 상대적 약소국이다. 한국의 외교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단순화하면, 그 힘은 대북 영향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외교정책의 자율성과 주도성은 대북 영향력의 크기에 비례한다. 대북 영향력은 적대가 아닌 교류·협력,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상호 의존의 심화를 통해서만 만들어낼 수 있다. 미-중의 협력과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누가 오바마-시진핑과 3각 파트너십을 구축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몰아올 수 있을까.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다자협력을 목표로한 6자회담 체제가 복원돼야 한다. 2008년 12월 이후 가동 중단 상태인 6자회담을 재개해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러려면 남북관계 개선이 절실하다. 누가 평화와 공존의 선순환에 시동을 걸 것인가. 12월19일 대선에선 그런 역량과 비전을 갖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분단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 모두의 역사적 의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자두농사 청년’ 향년 29…귀촌 7년은 왜 죽음으로 끝났나

후쿠시마 농어·가자미…오염수 방류 뒤 ‘세슘137’ 껑충 뛰었다

‘도로 친윤’ 국힘…이철규 원내대표 밀며 “욕먹어도 단일대오”

민희진, 1년 전 “어도어는 내 음악·사업 위한 회사” 인터뷰 재조명

“세빛섬 ‘눈덩이 적자’ 잊었나”…오세훈, 한강 토건사업 또?

‘학생인권조례’ 결국 충남이 처음 폐지했다…국힘, 가결 주도

윤 대통령 “남은 임기 3년 도와달라”…낙선 의원들 격려 오찬

의대교수 집단휴진에 암환자들 “죽음 선고하나” 절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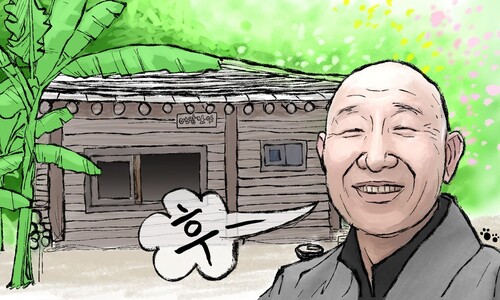
5평 토굴의 스님 “편하다, 불편 오래되니 ‘불’ 자가 떨어져 버렸다”

전국 대중교통 환급 ‘K-패스’ 발급 시작…혜택 따져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