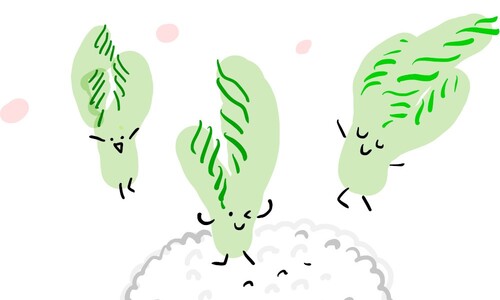변지민 기자
한겨레신문사 앞 점심 저녁으로 한겨레 직원들로만 붐비는 구내식당 같은 곳이 있다. 차림표보다 밑반찬이 인기 많은 곳, 해 질 녘 석양주를 기울이는 기자부터 마감에 쫓겨 숟가락을 뜨는 둥 마는 둥 하는 수습기자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그곳, ‘해피포차’. 유미자(51)씨가 3년8개월간 해온 일을 접는다. 평일에 그동안 쉰 날은 장염으로 고생했던 딱 이틀이다. 아침 7시30분에 출근해 점심을 준비하고, 저녁 8시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됐지만 “많이 찾아주셔서 힘들지 않았다”고 했다. 처음 통성명한 기자의 이름(이재명 현 탐사1에디터)을 기억할 정도로 에 애정이 유별났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을 펼쳤다는 유씨를 찾았다.
가장 반응이 좋았던 음식은. 분홍색 소시지랑 두부부침이었다. 특히 분홍색 소시지는 늘 저녁 일찍 떨어졌다.
비결이 있나. 부침을 미리 해놓지 않고, 오는 사람 수대로 그 자리에서 기름을 둘러 부쳐냈다. 그게 비결이었을까.
특별히 기억나는 손님은. 시작하고 한동안 손님이 없어 오후에 텅 비어 있었다. 그렇게 멍하니 혼자 앉아 있으면 이인우 기자가 와서 청국장에 막걸리를 시켰다. 그때 그게 그렇게 고마웠다.
기자 중에는. 변지민 기자. 올 때마다 직접 말하고 싶었는데 변 기자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말을 못했다. 기억나는 기사도 있다. 식당은 여름이 힘들다. 그중에서도 지난해는 가장 힘들었다. 이쪽 사람 모두가 지난해 여름을 기억할 것이다. 그때 기사(제1224호 ‘누가 폭염으로 숨지는가’)를 읽고 너무 고마웠다. 땀을 닦으면서 감사해하며 꼼꼼하게 읽었다.
아쉬운 점도 있었을 듯한데. 아쉬움보다 바라는 게 있다. 폭염 보도처럼 삶의 고단함을 담는 기사를 더 보고 싶다.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살기 어렵다.
지난 3년여 중학생 아들은 대학에 가고, 딸은 대학을 졸업했다. 가족 얘기가 나오자 머뭇거렸다. “여행 한번 가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뭐랄까,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식당을 그만둔 뒤 여행이라도 가느냐고 물었다. 쉴 계획은 아직이다.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는 일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맛도 맛이지만 눌어붙은 설거지를 어찌 다 하는지 궁금했던 돌제육비빔밥, 구린내를 덜어내고 깔끔하게 끓여내는 청국장, 여름에 그만인 아삭한 열무비빔밥, 국물국수 생각을 잊게 하는 비빔국수, 그중에서도 집밥처럼 자르르한 윤기와 쫀득함을 뽐내던 한 그릇의 밥, 모두 생각날 것이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특검법 임박하자 이종섭 ‘기록 회수, 내 지시 아니다’ [단독] 특검법 임박하자 이종섭 ‘기록 회수, 내 지시 아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17/53_17133466788152_20240417503131.jpg)
[단독] 특검법 임박하자 이종섭 ‘기록 회수, 내 지시 아니다’

국힘 원로들 “윤 대통령 불통 국민 심판 받아…당이 직언해야”

‘갤럭시’ 조립하다 백혈병 걸린 21살 노동자…“원청 삼성전자 책임져야”
![[단독] 박영선·양정철 떠본 뒤…‘장제원 비서실장’ 유력 검토 [단독] 박영선·양정철 떠본 뒤…‘장제원 비서실장’ 유력 검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17/53_17133496881016_20240417503396.jpg)
[단독] 박영선·양정철 떠본 뒤…‘장제원 비서실장’ 유력 검토
![대통령님, 하고 싶은 것 빼고 다 하세요 [뉴스룸에서] 대통령님, 하고 싶은 것 빼고 다 하세요 [뉴스룸에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18/53_17133925305185_20240418500154.jpg)
대통령님, 하고 싶은 것 빼고 다 하세요 [뉴스룸에서]

호텔 결혼식 ‘축의금’ 더 내야 해?…1만명한테 물어봤다

‘양평고속도로 대화’ 공개하자 의원직 제명…법원 “취소해야”

한계 왔지만 의정 갈등 평행선…‘해결 의지’ 안 보이는 윤 정부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부하를 증인 신청…재판장 “무죄 만들려고?”

김건희 여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