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칭을 한 밭 위로 호스를 깔아 급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서울 촌놈의 계획은 처참히 실패했다.
경기도 포천에서 농사짓기 전, 2년 정도 텃밭을 가꿨다. 회사 선배들이 하던 농장에 한 이랑을 얻어 겪은 농사의 맛은 썼다. 제일 쓴맛은 역시 잡초였다. 풀과의 전쟁. 멀칭(Mulching·농작물을 재배할 때 땅 표면을 덮어주는 일) 없이 짓기 시작한 농사는 그야말로 ‘풀투’였다. 작열하는 땡볕 아래서 풀을 뽑다보면, 내가 작물을 기르는 게 아니라 작물이 아닌 풀들을 애써 살려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혼이 비정상’이 되는 혼돈에 휩싸였다. 다시 농사짓거든 풀 잘 먹는 염소를 함께 키우거나 꼭 멀칭을 하리라, 다짐했다.
두 번째 쓴맛은 물과의 전쟁이었다. 처음에 농사를 지었던 텃밭은 수도시설이 잘돼 있지 않았다. 펌프를 이용해 지하수를 끌어올려 받아두었다가 쓰는 방식이었다. 펌프에서 밭이 멀어 호스를 길게 이어야 했다. 물을 주는 게 뭔가 매번 번거로웠다. 그해 여름은 더웠다. 많은 작물이 속절없이 타서 바스라졌다. 내 밭이 생겼을 때, 가장 감격한 일이 밭 바로 옆에 든든한 수도시설이 있다는 점이었다. 물을 끌어오지 않아도 되는 밭, 저장된 물을 누구와 공유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는 밭은 얼마나 편리할 것인가.
기가 막힌 계획이 떠올랐다. 언제까지 손으로 물을 줄 것인가. 서빙도 로봇이 하는 시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자. 동네 불광천을 떠올렸다. 불광천 입구에는 미세한 물줄기가 안개처럼 뿜어나오는 터널이 있다. 한여름 5㎞를 달리고 그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청량하고 상쾌하고 시원하고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촉촉함에 전율한다. 내 전율을 초록 작물에도 전파해야겠다. 스스로에게 탄복하며 굳은 다짐 속에 작업 계획을 세웠다.
계획은 이랬다. 밭을 두르고도 남을 호스를 산다. 어느 밭도 수분의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게 호스로 밭을 칭칭 돌려 압박한다. 그러곤 바늘이나 송곳을 이용해 호스에 작은 구멍을 낸다. 수도꼭지를 튼다. 대지를 적실 생명수가 호스를 타고 흐르며 촘촘히 밭으로 퍼져나간다. 밭이 젖는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볼 나는 캠핑의자에 앉아 맥주 한 캔 혹은 시원한 아이스아메리카노나 한잔 한다.
흐뭇했다. 호스 구매, 호스로 밭을 압박하기까지는 순조로웠다. 구멍 뚫는 일이 간단치 않았지만, 앞으로 펼쳐질 편리한 신세계를 생각한다면 반나절 노동은 감내해야 했다. 물론 버거웠다. 뭘 하는지 혼자 낑낑거리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아니면 하찮았는지 아내, 처제, 장모님이 각자의 장비를 들고 호스에 간격을 맞춰 구멍을 냈다. 도와주면서도 그들은 의심했다. 이게 될 것인가. 뭐든 시골에서 부족한 완성도를 보여온 서울 촌놈의 책상머리 기획이 작동할 것인가.
수도꼭지를 틀었다. 포천 포세이돈의 심정이랄까. 투명 호스를 미끄러져간 물은 첫 번째 이랑을 무사히 돌았다. 적당량의 물줄기가 작은 분수가 되어 밭에 꽂혔다. 두 번째 이랑에 도착한 물은 사뭇 다른 기세로 졸졸졸 흩어져갔다. 그리고 물은 세 번째 이랑에 도달해 더 이상 작은 구멍을 밀고 나오지 못했다. 처참한 실패였다. 우리의 모든 작업을 말없이 지켜본 ‘농달’이 말했다. “삼촌, 그거 수압이 약해서 수돗물로는 밭에 못 돌려. 농수로에 펌프 넣어서 뽑아올려야 그게 돌지.” 왜 그걸 지금 말해주시나요. 아까부터 보셨으면서. 포세이돈 실험은 아직 걷어내지 못한 호스의 추억으로 남았다.
글·사진 김완 <한겨레> 기자 funnybone@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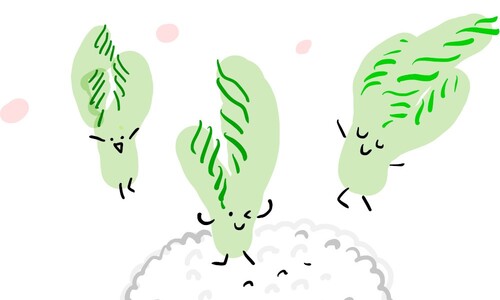

![[단독] 선방위 정당·단체 민원 100%, 국힘·공언련이 냈다 [단독] 선방위 정당·단체 민원 100%, 국힘·공언련이 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19/17134778819525_20240418503993.jpg)



![이승만·박정희를 국립묘지에서 파묘하라 [왜냐면] 이승만·박정희를 국립묘지에서 파묘하라 [왜냐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18/53_17134316400177_2024041850335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