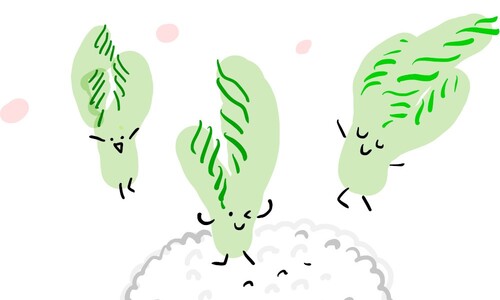농군 의도와 상관없이 밭이 종종 피워 올리는 예쁜 꽃들을 보는 즐거움도 작은 낙이다. 맨 위 밭 전경부터 시계 방향으로 쑥갓꽃, 고수꽃, 아욱꽃, 무꽃.
삶은 때로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른다. 인생에서 계획하고 욕망한 대로 얻는 성취는 짜릿한데, 내 뜻과는 무관하게 어느 날 갑자기 축복처럼 다가온 것들은 달콤하고 향기로운 때가 있다. 내겐 농사가 그렇다.
애초 농사를 지으려 중부 지방 소도시로 주거지를 옮긴 건 아니다. 젓국 달일 때 나는 냄새보다 더 비릿하기 그지없는 서울의 법과 자본의 논리가 지긋지긋했다. 고작 철근과 콘크리트를 버무린 것에 불과한 아파트를 한 평(3.3㎡)당 수천만원에 사고파는 기이한 행태,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대출받아 평생 그 빚을 갚느라 허덕이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 이른바 명문대에 내 새끼 보내려 입시학원 밀집 지역으로 이사하고는 “교육 여건 좋은 곳으로 옮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타락한 입이 싫었다. “우린 이런 광기가 지배하는 도시를 벗어나자”고 가족을 꼬드겼다. 2015년 세종시 조치원읍으로 삶터를 옮겼다. 우린 그렇게 읍민이 됐다.
서울 마포에 있는 회사까지 매일 편도 120㎞ 거리를 기차 타고 통근하는 내 모습이 마치 천일염을 잔뜩 뿌려 항아리에 몇 달은 절인 오이지처럼 쭈글쭈글하다고 느끼던 4년 전 이맘때쯤 축복이 나를 덮쳤다. 집에서 자동차로 10여 분 거리의 시골 산자락에 있는 150여 평(495㎡) 밭이 내게 다가왔다.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조용할뿐더러 오염물질이라곤 코빼기도 내비칠 일 없는 깨끗한 곳, 나의 엘도라도!
안타깝게도 내 땅은 아니다. 이 비싼 행정도시의 땅값을 치를 능력이 내겐 없다. 대신 나라 땅을 비롯해 각종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빌렸다. 누구나 ‘온비드’ 애플리케이션을 깔면 나처럼 매각이나 임대로 나온 국가의 물건을 사거나 빌릴 수 있다. 내가 부치는 밭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기획재정부가 그 땅의 소유주다. 1년마다 11만여원을 주고 캠코 사장과 나는 계약을 맺는다.
내 것이 아니면 어떠랴. 밭에서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평소 흘리지 못하는 굵은 땀방울의 쾌감을 맛보는 한편, 직장인으로서 분업의 고도화 과정에 닥치는 노동의 소외 대신 내가 생산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노동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데 말이다. 그 충만함은 나이 쉰에 이르는 동안 구멍이 숭숭 뚫린 삶의 여러 빈자리를 메우고도 남을 정도다. 금요일 밤만 되면 저 멀리서 밭이 나를 부른다. “전씨 농부님, 제가 일주일 새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어서 와서 보셔야죠”라는 환청이 들린다. 예부터 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큰다고 했다. 자주 가서 보살펴주지 못하는 게 미안할 뿐이다.
갓 7월에 들어선 밭은 중력의 반대쪽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생명을 밀어올린다. 심은 지 두 달밖에 안 된 옥수수는 이미 내 키를 훌쩍 넘어섰다. 꽃이 진 자리엔 열매를 방울방울 맺는다. 방울토마토와 고추, 애호박이 그렇다. 빛은 연두색에서 짙은 녹색으로 무섭게 타들어간다. ‘녹음이 짙어진다’는 진부한 표현은 실물이 주는 그 매력적 아름다움에 견주면 누추한 언어에 불과하다. 삶이 그렇듯 밭도 때로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을 마치 축복처럼 보여준다. 꽃으로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지만 예쁘기 그지없는 무꽃, 고수꽃, 아욱꽃, 쑥갓꽃이 밭에 한가득이다. 그 치명적 유혹에 풍덩 빠지려 이번 주말에도 나는, 토시를 끼고 호미를 들 테다.
글·사진 전종휘 <한겨레> 사회에디터 symbio@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인적 쇄신 막는 ‘윤의 불통’…‘김건희 라인’ 비선 논란만 키웠다

이화영 “이재명 엮으려고”…검찰 ‘술판 진술조작’ 논란 일파만파
![이승만·박정희를 국립묘지에서 파묘하라 [왜냐면] 이승만·박정희를 국립묘지에서 파묘하라 [왜냐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18/53_17134316400177_20240418503354.jpg)
이승만·박정희를 국립묘지에서 파묘하라 [왜냐면]

22대 국회 기선제압 나선 민주 “법사위·운영위 모두 가져야”

‘의대 증원분 절반 모집’도 허용해달라는 대학들…정부 받아들일까

멤버십 58% 올린 쿠팡, 해지 방어에 쩔쩔

‘똘레랑스’ 일깨운 홍세화 별세…마지막 당부 ‘성장에서 성숙으로’

“15살 이하는 영원히 담배 못 사”…영국, 세계 최강 금연법 첫발

검사실서 사기범 통화 6번 방치…징계받은 ‘이화영 수사’ 지휘자

“물 위 걸은 예수, 믿느냐”…신앙 검증해 교수징계 밟는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