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빨치산 할머니 고계연의 말, 김서령 지음, <여자전>, 푸른역사 펴냄, 42쪽, 2017년
자식들은 하나같이 책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셨지만 엄마의 취미는 독서가 아니었다. 책을 보면 눈이 아파, 하셨다. 엄마가 좋아하는 건 노래 부르기. 일주일에 두 군데 노래교실에 다니면서, 아흔 나이에도 새로운 노래를 배워서 가사를 외워 불렀다. 예전에 불렀던 노래조차 가사를 보지 않곤 못 부르는 나와는 차원이 달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노래교실이 문을 닫으면서 엄마의 취미 생활은 막을 내렸다.
엄마는 낮잠을 자기 시작했고 멍하니 시무룩했다. 혼자서 지내는 긴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새 취미가 필요했다. 나는 엄마에게 어르신용 큰글씨책을 갖다드렸다. 박완서의 <흑과부>, 김소운의 <가난한 날의 행복>, 하나둘 목록이 늘었다. 더는 눈이 아프단 말을 안 하셨다.
그즈음 김서령의 인터뷰집 <여자전>을 읽었다. 엄마 또래 여성 일곱 명이 자신의 놀라운 인생사를 들려주는 그 책을, 한 번은 울면서 읽고 한 번은 밑줄 치면서 읽었다. 그러고 엄마에게 읽어보라 했다. 눈이 좀 아플지 모르지만 조금씩 쉬엄쉬엄 읽어보라고. 그다음에 만났을 때 엄마가 쑥스러운 듯 말했다. “네가 준 책을 읽다가 나 혼자 막 웃었다. 아이고, 책을 보다가 큰 소리로 웃었어, 나 혼자.” “엄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난 막 울었어.” “그래? 너도 그랬어?”
나는 엄마에게 도서관에서 책 보다가 큰 소리로 웃거나 훌쩍이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책을 읽다보면 주변 세상이 다 잊히고 책하고 나만 있는 것 같아서 사람이 좀 이상해진다고, 그게 책읽기의 재미라고 얘기했다. 엄마는 웃었다. 그러면서 <여자전>에 나오는 여자들이 남 같지 않아, 그래서 재미있어, 하셨다.
엄마는 지금 그 책을 다섯 번도 넘게 읽었다. 처음 읽었을 땐 웃음이 났는데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니까 다르다고 하면서 잠시 먼 데를 보셨다. 그 여자들은 정말 대단하다, 똑똑한 여자들이야 하고 눈을 반짝였다. 나를 만날 때마다 그 책 이야기를 했다. 당신이 겪은 식민과 전쟁, 분단과 독재와 가부장의 지독한 세월을 당차게 살아낸 여자들, 당신처럼 가난하고 당신보다 더 신산한 삶을 살아야 했던, 하지만 당신처럼 기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아주 똑똑한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동상으로 발가락 다섯 개를 잃고도 빼어난 장사 수완으로 식구를 건사하고 가난한 이웃들까지 거둔 빨치산 고계연, 배가 고파 만주로 갔다가 팔로군이 되어 중국내전 한국내전 모두 참전한 군인 윤금선, 월북한 남편을 기다리며 자식도 없이 평생 시집살이를 한 안동 종부 김후웅, 피란지에서 우연히 창문 너머로 춤을 배워 ‘선무’를 창시한 춤꾼 이선옥….
집안도 학력도 성격도 다 다르지만 ‘같은 시대 같은 나라 같은 젠더로 태어난’, 그래서 비슷한 운명으로 외로운 엄마의 벗이 되어준 그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다 문득 깨달았다. 지금 내 앞에 한 역사가 있는데 나는 그걸 읽지 않았구나. 나는 물었다. “엄마는 왜 어려서부터 돈을 벌었어? 할아버지는?” “그야 아버지가 책만 보다가 돌아가셔서….”
수없이 들었으나 한 번도 귀담아듣지 않았던 이야기를, 엄마가 눈을 반짝이며 말한다. ‘한 여자가 한 세상’이고 한 세상 건너는 일이 역사임을, 나는 무지개 같은 일곱 삶에 또 한 삶을 읽으며 배운다.
김이경 작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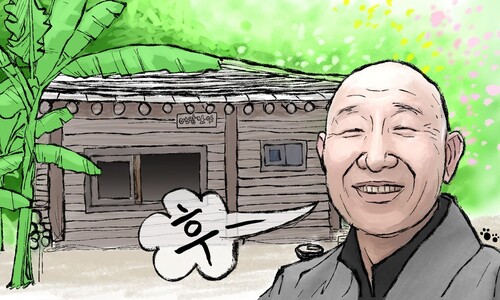
스님의 집은 5평 토굴…“편안함이란 마음과 몸이 같이 있는 거요”

‘자두농사 청년’ 향년 29…귀촌 7년은 왜 죽음으로 끝났나

서울대병원 교수들 30일 일반진료 중단…“의사 정원 다시 추계”

고소득층 감면액, 저소득층 25배인데…정부 또 유류세 인하 연장

선방위는 윤 대통령처럼…그들의 길은 역사가 된다

이재명 대표연임 ‘추대’ 군불…원내대표 ‘찐명’ 박찬대로 정리중

윤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에 야당 “악수하자며 따귀 때려”

테라 권도형, 미국 송환 피하려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에 재항소

거짓진술 국방부 법무관리관, ‘대통령실 개입’ 덮으려 했나

4월 24일 한겨레 그림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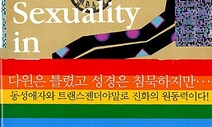



![[여자의 문장] 오늘은 남은 날들의 첫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226/53_16089104864529_3816089104598297.jpg)
![[여자의 문장] 긴즈버그가 살아 있다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107/53_16046788066306_4016046787948322.jpg)
![[여자의 문장] 이이효재 선생님의 사랑 덕분에](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016/53_16028376100073_3316028375771239.jpg)
![[여자의 문장] ‘말해야 알지’에서 ‘말하면 뭐 해’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918/53_16004060688722_7416004050542492.jpg)
![[여자의 문장] 온몸이 담덩어리였던 여자](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831/53_15988548501725_9015988548343815.jpg)
![[여자의 문장] 끝까지 사는 것, 내 의무이고 책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724/53_15955930226408_18159559299991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