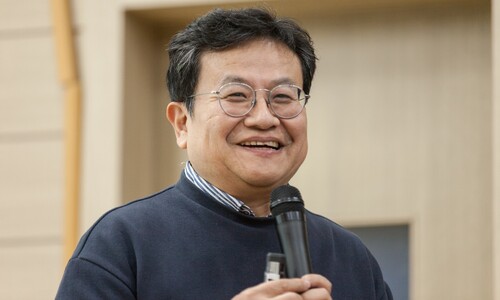오랜만에 집 앞 공원에 나간 아이. 마스크를 쓰려고 하지 않아 걱정이다.
출근한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메시지를 읽는데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나랑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새벽에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검사받고 결과 기다리고 있대요. 어떡하지, 나 밀접 접촉자인데.”
난 태연한 척 기다려보자고, 괜찮을 거라고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만약 안 괜찮으면? 아내가 자가 격리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하나, 나도 감염됐다면 아이는 누가 돌볼까, 만약 아이가 감염됐다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지난주에 만난 문화센터 육아모임 사람들한테는 뭐라 말해야 하나. 두 시간 뒤, 아내의 직장 동료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이 올 때까지 참 많은 생각을 했다. 지난 9개월을 통틀어 코로나19가 가장 가깝게 느껴졌던 순간이다.
8월30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됐다. 이런 때가 다시 오리라고 전문가들이 여러 번 경고해 마음의 준비야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치니 쉽지 않았다. 몇 달 만에 다시 사회적 거리를 두려니 느슨해진 몸이 잘 따르지 않는다. 아이와 다니던 문화센터에선 “새 학기 개강을 2주 늦춘다”고 알려왔다. 바로 이틀 뒤에 다시 한 달 뒤로 개강을 더 연기한다는 공지가 왔다. 문화센터 육아모임 단체대화방에선 곡소리가 나왔다.
집 안에서 버티다 정 답답하면 인근 공원에 간다. 집 앞이라도 신경은 쓰인다. 만 10개월인 아이는 마스크를 씌우려 하면 손으로 밀쳐낸다. 아내는 “엘리베이터 같은 좁은 공간에선 감염될 수 있다”며 불안해하지만, 어떻게 하나.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안심시키는 것 외엔 방도가 없다.
집 밖에 나오니 선선한 가을바람에 기분이 조금 나아진다. 기분이 좋은지 연신 팔을 흔드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짠해진다. 공원에 도착하니 놀이터나 정자처럼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엔 모두 테이프를 둘러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들어갈 수 없는 놀이터 옆에서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멀리서 마흔 명은 돼 보이는 50~60대 무리가 줄지어 지나갔다. 여행을 온 건지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떻게 저리 대놓고 방역 지침을 무시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없었다.
확진자가 조금 줄어 9월1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낮춰졌다. 하지만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인터뷰 기사를 보니 올해 가을이나 겨울에 감염병 재유행이 올 수 있고, 이런 상황이 2~3년은 갈 거란다. 숨이 탁 막힌다. 당장 아이를 돌 직후인 11월부턴 어린이집에 한두 시간이라도 보내 적응시키려 했는데,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내년 1월에 복직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인데, 만약 어린이집이 휴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은 안 나오고 답답하기만 하다.
고민은 꼬리를 문다.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는 날이 언제 올까? 두려움 없이 친구들과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같이 뛰어노는 날은? 나중에 아이가 큰 다음, 내가 여행했던 나라들을 갈 수 있을까? 왜 앞선 세대가 풍족하게 살며 누린 대가를 다음 세대가 치러야 할까? 이 모든 질문에 당장 답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답이 나와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하는 지침에 잘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세상 모든 아이가 마스크 없이, 두려움 없이 뛰어놀 수 있는 날이 더 빨리 오도록.
글·사진 김지훈 <한겨레> 기자 watchdog@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생존 해병 “임성근, 가슴장화 신고 물에 들어가라 지시했다”

진성준 “윤, ‘망나니 칼춤’ 류희림 해촉하고 언론탄압 사과해야”

나는 시골 ‘보따리상 의사’…평범한 의사가 여기까지 오려면

미 국무 부장관 “윤 대통령·기시다 놀라운 결단…노벨평화상 자격”

‘자두밭 청년’ 향년 29…귀농 7년은 왜 죽음으로 끝났나

하이브, 민희진 오늘 고발…“‘뉴진스 계약 해지’ ‘빈껍데기 만들자’ 모의”

“열 사람 살리고 죽는다”던 아버지, 74년 만에 백골로 돌아왔다

스페인 총리, 부인 부패 혐의로 물러날까…“사퇴 고심”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에 황운하…10분 만에 만장일치로

해병 녹취엔 “사단장께 건의했는데”…임성근 수색중단 묵살 정황

![[아빠도 몰랑] ‘돌끝파’ 그리고 앞으로 오랫동안](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107/53_16046794126048_4316046794017103.jpg)
![[아빠도 몰랑] 아이의 마음을 읽게 해주소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016/53_16028373851812_5816028373319175.jpg)
![[아빠도 몰랑] 술잔과 젖병, ‘환상의 콜라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724/53_15955750680599_3815955750557836.jpg)
![[아빠도 몰랑] 나의 하루는 밤 9시에 시작된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703/53_15937837176792_1115937837064651.jpg)
![<span> [아빠도 몰랑] 사흘간 같은 이유식도 잘만 먹더라</span>](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612/53_15919456630931_7115919456357493.jpg)
![<span>[아빠도 몰랑] 나는 왜 그때 안도했을까</span>](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515/53_15895285392378_5015895285227403.jpg)
![<span>[아빠도몰랑] 그래도 까꿍은 잘해</span>](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12/imgdb/original/2020/0504/85158851976921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