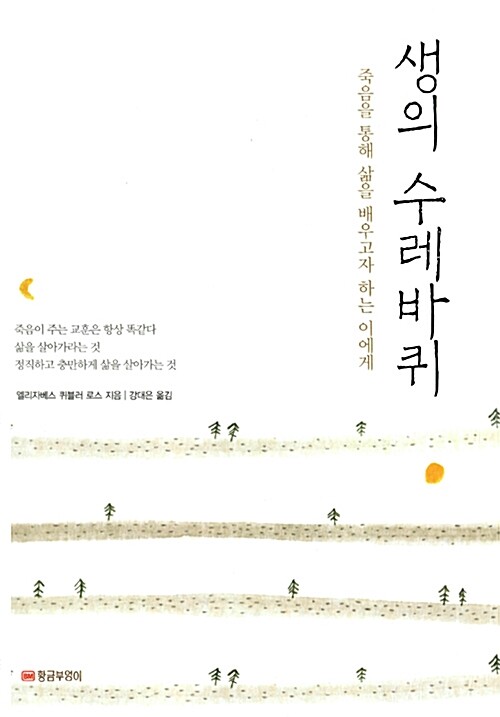
“죽음만큼 쉬운 일은 없다. 오히려 삶은 가혹하다. 삶은 어렵고 힘든 싸움이다. 삶은 학교에 다니는 것과 같다. 많은 숙제가 주어진다. 배우면 배울수록 숙제는 더 어려워진다. 가장 힘든 과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생의 수레바퀴>, 황금부엉이, 13쪽, 2009년
스무 해 동안 틈만 나면 죽음에 관한 책을 읽고 공부했다. 이 정도면 죽음이 뭔지 알 만한데 오히려 하면 할수록 모르겠다. 맥 빠지겠다고? 아니다. 죽음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공부의 보람은 충분하다. 성급한 판단을 자제하게 되니까. 더 큰 보람도 있다. 죽음을 통해 삶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다. 예전에 내가 그랬듯 뻔한 얘기라 할지 몰라도, 지금 나는 20년 삽질의 보람을 여기서 찾는다. 그래서 삶이 흔들리고 의심스러워질 때마다 죽음 책을 펼친다. 이번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자서전 <생의 수레바퀴>다.
E. 퀴블러 로스는 죽음학의 선구자로, 그가 1969년에 발표한 <죽음과 죽어감>은 이 분야의 고전으로 꼽힌다. 세상엔 무수히 많은 책이 있지만, 세상을 바꾼 책은 극히 적다. <죽음과 죽어감>은 그 드문 책, <종의 기원>이나 <자본론>처럼 세계를 바꾼 극소수의 책 중 하나다. 죽어가는 환자 500여 명을 인터뷰하고 쓴 이 책 덕분에 세상은 비로소 죽음이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며,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환자를 대상화하는 의료에서 벗어나 환자 중심 의학에 눈뜨게 되었다. 한마디로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으로 죽을 수 있게 되었다. 책 한 권이, 한 여성이 이런 변화를 열었다.
쓸쓸하지만, 위인전을 읽고 인생의 좌표를 설정할 나이는 오래전에 지났다. 그래도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궁금하다. 혹시 그의 대단한 삶이 지리멸렬한 내 삶을 일신할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기대를 안고, 그가 일흔이 넘어, 여섯 차례의 뇌졸중 발작으로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온 힘을 다해 쓴 자서전을 읽기 시작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책을 읽고 나는 잘 살기로 결심했다. 잘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끝까지 사는 것 그것이 내 의무이고 책임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언제나 죽음을 하나의 선택지로 가슴에 품고 있던 내게는 무거운, 무서운 결론이었다.
저자가 말한 사후생을 믿어서는 아니다. 수호령을 만나고 요정을 목격하고 유체이탈까지 했다는 경험담은 놀랍고 신기하지만, 내 마음을 움직인 건 따로 있다. 세쌍둥이의 맏이이자 900g의 미숙아로 태어나서 비서가 되라는 가부장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길을 찾아간 그 뚝심, 죽어가는 환자와 만나지 말라는 의사들 말을 거부하고 흑인 여성 청소부를 스승으로 삼아 죽음학을 일군 대담한 겸손이 나를 흔들었다.
나도 그처럼 펄펄 뛰는 생을 살고 싶다. 비록 그는 열일곱 살에 이미 자신의 선택대로 살기 위해 가족을 떠나 가정부로 나설 만큼 용기가 있었고, 나는 아직도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책을 읽은 지금, 나는 그게 바로 나의 숙제고 어려움은 곧 성장의 기회임을 안다. 그가 말했듯, 사람은 누구나 고통에 의해 연결되고, 오로지 고난에 견디고 성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존재의 본질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에 있다”. 죽음이 뭐냐고 묻는 이들에게 그는 “정말 멋진 것”이라 답했다. 부디 내가 숙제를 다 마치고 이 멋진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어쩌면 있을지 모를 수호천사여 도우소서.
김이경 작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의대 정원 1000~1700명 줄 듯…결국 물러선 윤 정부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로 입건

“누구든 선한 길로 돌아올 것”…자유인 홍세화의 믿음

윤 대통령-이재명 통화, 다음주 단독 회담…고물가 논의할듯

봄 맞아 물오른 버드나무 40그루 벤 뒤…5만평 모래톱 쑥대밭으로

자유인 홍세화의 ‘고결함’…외롭고 쓸쓸해 아름다웠다

대마도 인근 규모 3.9 지진…영남권서 진동 감지

‘제4 이동통신’ 드디어 출범…“가입자를 ‘호갱’에서 해방시킬 것”

조국·이준석·장혜영 등 야6당…‘채 상병 특검 촉구’ 첫 야권연대

이란-이스라엘 공격 주고받기, 체면 살리고 피해는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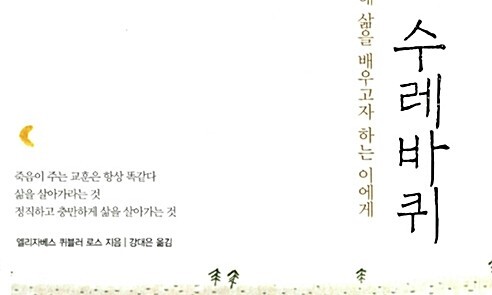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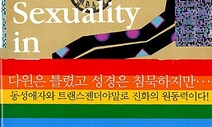



![[여자의 문장] 오늘은 남은 날들의 첫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226/53_16089104864529_3816089104598297.jpg)
![[여자의 문장] 지금 내 옆에 한 역사가 있구나](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205/53_16071542872292_5316071542603478.jpg)
![[여자의 문장] 긴즈버그가 살아 있다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107/53_16046788066306_4016046787948322.jpg)
![[여자의 문장] 이이효재 선생님의 사랑 덕분에](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016/53_16028376100073_3316028375771239.jpg)
![[여자의 문장] ‘말해야 알지’에서 ‘말하면 뭐 해’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918/53_16004060688722_7416004050542492.jpg)
![[여자의 문장] 온몸이 담덩어리였던 여자](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831/53_15988548501725_9015988548343815.jpg)


![“나는 민주시민인가 고객인가, 스스로 묻자”[홍세화 마지막 인터뷰] “나는 민주시민인가 고객인가, 스스로 묻자”[홍세화 마지막 인터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19/53_17134545443068_2024041850383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