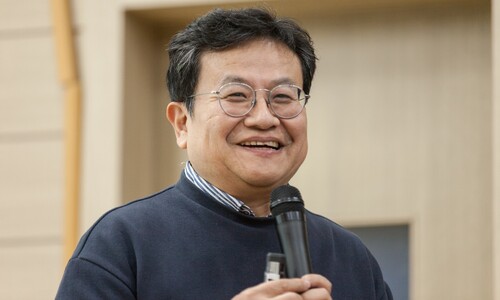유전자조작으로 형광을 띠게 한 글로피시들. 최초의 형질전환 반려동물이다. 글로피시 개발 업체인 요크타운테크놀로지는 2017년 스펙트럼브랜즈에 인수됐다. 스펙트럼브랜즈 제공
인간은 동물을 지배했다. 지배의 극단은 동물 유전자를 바꿔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이다. 늑대에게서 개를 만들었고, 마당에서 알을 낳는 닭을 만들었고, 밭을 가는 소를 만들었다. 18~19세기 인위적인 교배로 다양한 품종의 개를 만드는 열풍이 불었다. 현재 400여 품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때 만들어졌다. 당시만 해도 ‘종의 창조’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오븐에 이것저것 넣어서 만드는 요리와 비슷했다.
20세기 중반, 비밀의 일단이 밝혀졌다. 프랜시스 크릭과 제임스 왓슨은 1953년 과학전문지 에 유전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물질인 디엔에이(DNA)의 구조가 이중나선형이라는 사실을 보고했다. DNA는 단순한 구조의 집합이었다. 아데닌(A), 티민(T), 구아닌(G), 사이토신(C)이라는 뉴클레오타이드 분자 네 개가 각각 다르게 결합해 이중나선 줄에 매달려 있었다.
‘우리가 생명의 비밀을 발견했다’는 두 과학자의 외침이 허세가 아니었다. DNA는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라고 명령하는 것이 일이었고, 그 ‘어떻게’는 이 네 분자의 결합에 달렸던 것이다. 쉽게 말해, 생명의 설계도가 이 작은 DNA 안에 들어 있었다. DNA 설계도에 따라 개가 되기도 인간이 되기도 하고, 인간 중에서도 프랜시스 크릭이 되기도 제임스 왓슨이 되기도 했다.
평생 실험당하다 죽는 온코마우스동물을 만드는 일은 이제 새로운 차원에 놓이게 되었다. 눈이 크거나 다리가 짧거나 하는 등 특정 형질의 암컷과 수컷을 선별해 번식시키는 ‘재래식 방법’은 비효율적일 게 뻔했다. 반면 네 분자 중 일부를 바꾸면, 단백질을 만드는 공정을 변화시키면서 형질을 바꿀 수 있었다. 이렇게 만드는 동물을 점잖게 말해 형질전환동물(Transgenic Animals)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유전자조작동물(Genetically Modified Animals)이다.
18~19세기 개 품종 교배 열풍이 분 것처럼, 과학계에선 새로운 생물체를 창조하려는 붐이 일었다. 처음 유전자조작으로 태어난 동물은 쥐였다. 애완쥐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쥐의 몸을 하나의 실험실로 만들어 관찰하는 게 목적이었다. 미국 하버드대학 과학자들은 1980년대 정상적인 쥐의 암 발현 조절 유전자를 암 유발 확률이 높은 유전자로 바꾼 쥐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이를 ‘온코마우스’로 이름 짓고 특허를 받았다. 이 쥐는 암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났다. 성장하면서 결국 암에 걸리고야 마는 이 쥐는 평생 인간에게 실험당하다 죽는다.
많은 동물이 실험실에서 인간의 조작으로 태어났다. 대체로 의학 목적에서였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목표 유전자를 넣으면 그게 잘 삽입됐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해파리에서 형광을 내게 하는 녹색형광단백질(GFP·Green Fluorescent Protein)이 발견됐다. 과학자들은 이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를 해파리에서 분리해 복제했다. 이 유전자를 다른 동물에게 넣자, 그 동물 또한 형광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유전자는 생명의 범용 설계도인 것처럼 보였다. 놀라운 발견이었다! 과학자들은 목표 유전자를 삽입하면서 GFP 유전자도 함께 넣으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 개체가 형광을 띤다면 목표 유전자도 기능한다는 뜻이니 이보다 편한 식별 장치가 어디 있으랴.
1990년대 정보기술 기업 거품의 직격탄을 맞고 실의에 빠져 있던 두 청년 사업가 리처드 크로켓과 앨런 블레이크에게 괜찮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GFP 유전자를 넣은 형질전환 물고기를 관상어로 팔면 어떨까? 기술은 이미 나와 있었다. 싱가포르국립대학 연구진이 수질이 나빠지면 ‘네온사인’을 켜는 수질 경보용 물고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제브라피시의 배아에 GFP 유전자를 쏘아 ‘형광 제브라피시’를 만드는 단계까지 나아가 있었다.
글로피시가 번식해도 소유주는 글로피시두 청년은 ‘요크타운테크놀로지’라는 업체를 만들고 이 기술을 가져온다. 그리고 ‘글로피시’(GloFish)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장에 내다 판다.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물고기를 탈색해 염색하는 기존 방법보다 훨씬 고통을 적게 주었고 색깔도 더 예뻤다.
온라인쇼핑 아마존에선 ‘글로피시 라이브 컬렉션’이 전용 물고기 밥과 함께 85달러에 팔린다. ‘일상에 색채를!’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다음과 같은 말이 이어진다.
“글로피시는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색소를 주입하거나 염색한 물고기가 아닙니다. 글로피시는 죽을 때까지 가는 화려하고 건강한 비늘을 부모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글로피시는 가정과 사무실, 교실에 놔두기 좋습니다!”
나이키가 나이키인 것처럼, 글로피시는 글로피시다. 지금 바로 구글에 쳐보면 알겠지만, 글로피시 옆에는 특허 상품임을 표시하는 Ⓡ 기호가 항상 따라다닌다. 글로피시가 번식해도 그것은 반려인 소유가 아니다. 글로피시를 만든 회사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동물 유전자에 손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것은 아주 장기적이고 우연적인 방식이었다. 알프스 목장의 양치기 개나 북극의 썰매견은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았다. 근대사회가 되면서 축산업이 발전해 동물 유전자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긴 했다. 하지만 그때는 유전자조작이 전통적 방식, 즉 특정 형질을 지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으로 이뤄졌다. 인공수정도 이런 점에서 여전히 전통적이다.
그러나 유전자편집은 새로운 차원의 일이다. 온코마우스의 경우는 의학 목적이라 치더라도, 글로피시처럼 인간의 미적 가치를 충족하기 위해 동물 유전자를 바꾸어도 되는 것일까. 지금은 괴이하게 여기지만, 독특한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형광 고양이와 형광 개를 판다면? (둘은 이미 실험실에서 완성됐다. 형광 개 ‘루피’는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작품이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없앤 저자극성 고양이는 또 어떤가? 인간은 편리함에 쉽게 항복하는 습성이 있다. 저자극성 고양이는 초기 감정적 저어함을 극복하고 인기를 끌 것이다.
알레르기 프리 고양이, 꼬리 없는 돼지이런 경우도 있다.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는 돼지의 꼬리를 자른다. 다른 돼지들이 뒤에서 꼬리를 무는 것을 막기 위해 새끼일 때 미리 꼬리를 자르는 것(단미)이다. 동물보호 운동가들이 대표적인 동물복지 저해 행위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형질전환으로 꼬리 없는 돼지를 만든다면?
유전자편집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유전자조작이 동물의 고통을 일정 부분 해소해준다면, 타 생명체의 고통에 공감하는 전통적 생명윤리도 도전받을 것이다. 어쩌면 죄의식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 그것이 인간과 동물에게 이상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자두농사 청년’ 향년 29…귀촌 7년은 왜 죽음으로 끝났나

‘도로 친윤’ 국힘…이철규 원내대표 밀며 “욕먹어도 단일대오”

민희진, 1년 전 “어도어는 내 음악·사업 위한 회사” 인터뷰 재조명

용산 국가안보실·공직기강실 동시다발 전화…‘채상병 기록’ 회수됐다

“세빛섬 ‘눈덩이 적자’ 잊었나”…오세훈, 한강 토건사업 또?

후쿠시마 농어·가자미…오염수 방류 뒤 ‘세슘137’ 껑충 뛰었다

“사단장께 건의했는데”…‘해병 철수 의견’ 묵살 정황 녹음 공개

‘학생인권조례’ 결국 충남이 처음 폐지했다…국힘, 가결 주도

의대교수 집단휴진에 암환자들 “죽음 선고하나” 절규

4월 25일 한겨레 그림판

![[세상 바꾼 동물] 코코넛 따는 원숭이를 아시나요](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731/53_15961785058402_861596178492177.JPG)
![[세상바꾼동물] 군인 194명을 구한 비둘기](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626/53_15931540490478_4315931540358268.jpg)
![<span>[세상을 바꾼 동물] 낭만으로 시작해 비극으로 끝난 사랑</span>](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12/imgdb/original/2020/0525/3415903432012537.jpg)

![[남종영의 세상을 바꾼 동물들] 치킨과 닭의 차이…인간의 죄의식 삭제해버린 공장식 축산](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0/0416/581586963033409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