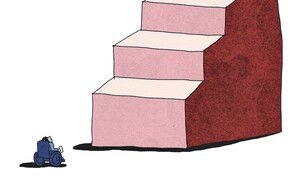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어려서는 서른 넘게 살아 있을 거란 생각만으로 아득해지지만 서른에 다다랐거나 훌쩍 넘긴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서른은 뭔가 시작도 못한 기분이 들게 만드는 숫자라는 걸. 그런 서른도 넘기지 못하고 어떤 이들이 하늘의 별이 되면, 이제 인생에는 아득함 따위는 사라지고 마음 둘 데라고는 없는 황량한 빈터나 맹수가 들끓는 정글에서 살아간다는 두려움만이 밀려든다. 이토록 견디기 힘든 세상이 어떤 이들에게는 어째서 저토록 서슴없을까.
단식, 우리 편을 인질 삼은 암중모색겨울 초입, 단식을 감행하다 병원으로 실려간 한 정치인의 ‘행보’를 가늠할 순 없었지만, 몸져누웠던 그 시간 속에선 실 한 오라기만큼의 진실도 느껴지지 않았다. 일말의 공감도 일지 않는 냉정한 마음 때문에, 이것이 인간인가? 나를 돌아보기까지 했다. 나는 진실로 곡기 끊던 그의 비장함과 엄중한 현실 인식을 비하할 맘이 없지만, 삭발 다음 순으로 그가 택한 단식은 같은 행위를 하는 이들과 달리 어째서 절박하게 가닿지 않는지 궁금하다. 가닿기는커녕 왜 더 무참한 기분이 들게 하는지도.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륭전자 파견직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10원 많은 64만1840원이었다. 잔업 100시간을 일해야 100만원의 임금을 손에 쥘 수 있던 나날.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고 그해 10월 기륭전자는 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는 여봐란듯이 생산라인을 도급으로 전환하고 80여 명을 해고했다. 노조는 그 뒤 긴 세월을 불법 파견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철야농성과 단식투쟁을 오간다. 그러던 2008년, 노조원 김소연은 단식 94일째 탈진하고 만다. 영화 을 보면, 당시 동료들이 그런 자신을 둘러싸고 “사람 하나 죽고 우리가 들어가면 뭐 하겠냐”고 엉엉 울었다는 김소연의 회고가 나온다. 그러니 단신(單身)이 아니라면 단식은, 사랑하는 우리 편을 인질 삼아야만 하는 가슴 아픈 암중모색이다. 십수 년 전 일이라 역시 아득해진다면 물어야 한다. 이제 ‘기륭전자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냐고.
한 해의 끝자락마다 나만의 10대 뉴스를 꼽아보곤 했지만, 어느 해부턴가 사적인 뉴스는 사회적 뉴스와 겹쳤고 기억해야 하지만 기억하기 힘든 사건들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무정하고 부정한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내면 어딘가가 허물어진다. 소중한 사람이 떠나버렸는데도 멀쩡하게 굴러가는 세상을 크리스 마틴(콜드플레이 보컬)은 (Everglow)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어떻게 세상은 계속되고 차들은 멈추지 않을까. 내 세상은 끝나버린 느낌인데.” 허물어지던 그 순간, 인생이 영원히 멈춰버린 사람들이 늘어만 간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가끔 깊은 새벽, 내 안에서 의미와 무의미가 싸우는 소리를 듣는다. 내전이 걷히고 마침내 잠잠해졌을 때 무의미가 이겼다는 소식이 날아들면 눈시울이 붉어진다. 붙들 게 없다고 여겼는데도 여전히 자주 우는 나는 아직은 삶 애착형인 걸까.
모든 바람을 실어 보내길오래전 새해 꿈이 여행 자금 모으기, 새로운 언어 익히기, 애인 발견 따위였다면 이루었든 아니든 그 시간을 지나왔음을 이제는 감사한다. 10대 뉴스의 겉감과 안감의 구분이 사라져 위태롭게만 느껴지는 지금,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그믐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던 이문재 시인(‘오래된 기도’ 중)의 모든 것은 기도라는 마음에 기대어 두 손 모은다. 누구도 일터 때문에 곡기 끊지 않길, 모든 사람에게는 존재하려는 권리가 있음을 알길(몰랐다면 배우길), 누구도 기계적 평등을 부르짖으며 약자를 괴롭히지 않길, 이 밖에도 자꾸 꼬리를 물지만, 이 모든 바람을 부질없어 보여도 한 ‘표’에 실어 보내길.
김민아 저자한겨레 인기기사

거짓 진술 국방부 법무관리관, ‘대통령실 개입’ 덮으려 했나

의성군 ‘자두 청년’ 향년 29…귀농 7년은 왜 죽음으로 끝났나

“새만금 잼버리, 한국 정부 개입으로 여러 문제 발생”

날짜 못 잡은 윤-이 회담…대통령실 ‘민생 위주로’-민주 ‘사과도’

윤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에 야당 “악수하자며 따귀 때려”

“예정대로 25일 병원 떠나겠다”…압박 수위 높이는 의대 교수들

울산동백, 400년 전 일본 건너간 고향꽃 아니었다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

윤석열과 박근혜, 그 불길한 도돌이표

목소리 키우는 조국, ‘야권 투톱 경쟁’ 마뜩잖은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