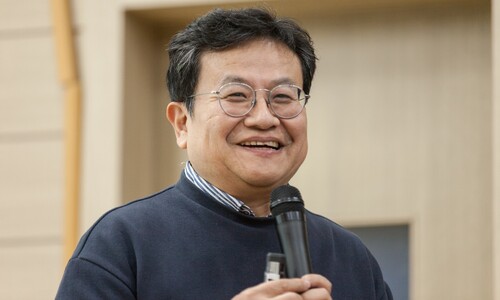독거노인 령은 얼마 전 타투 전문가를 찾아갔다. 령은 그동안 폐지를 주워서 모아놓은 돈을 내놓았다. 자신의 앞가슴에 DNR(Do Not Resuscitate)라는 글씨를 새겨 넣어달라고 주문했다. 얼마 전 령은 전세계에 자신처럼 가슴에 이런 문신을 한 노인이 많다는 것을 양로원에서 알았다. DNR는 의학용어로 심폐소생술을 거부한다는 의사다.

한겨레 이정우 기자
그녀는 오랫동안 심장판막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했다. 령은 갑작스런 심정지가 찾아올 때마다 병원에서 응급 심폐소생술로 자신을 살려온 것을 거부하기 위한 로고를 가슴에 표기해놓고 싶은 것이다. 멀리 있는 자식들에게 또 소식이 날아들어 짐이 되는 게 싫었다. 보호자들 입장에서도 막막한 병원비와 수술비는 부담이었다. 심장이 멈추면 의사들은 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을 살려놓았다. 눈을 뜨면 삶이 짐이 된 자식들이 안쓰럽고 불편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령은 다시 심장이 정지되어 쓰러진다면 의료법에 의거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그만하고 싶었다. 령은 문신을 가슴에 파넣은 뒤 집으로 돌아왔다. 웬만하면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령은 방에서 혼자 조용히 눈을 감고 싶었다. 언제 올지 모를 심장정지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로 사느니 아무도 모르게 방구석에서 지내다가 죽어서 썩은 채 발견되어 화장되는 편이 나았다. 령은 매일 밤 잠들기 전 곱게 화장을 한다. 매번 마지막 화장일지 모르기 때문에 예쁘고 곱게 하고 싶었다. 령은 방의 벽에 돌아누워 화장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눈물을 흘렸다.
40년 전 령의 남편이 산으로 가서 사라진 뒤 령은 그리움으로 평생을 살았다. 령의 남편은 산악인이었다. 남편은 산에 미쳐 있었다. 갓난아기인 둘째딸을 등에 업은 채 남편이 히말라야의 산으로 떠나는 것을 본 것이 마지막이었다. “여길 만져보세요. 당신과 내가 만든 아기의 심장이에요.” 남편은 꼭 돌아온다는 말을 남겼지만 몇 달 뒤 산사태로 소식이 끊겼다. 령은 두 딸을 키우며 혼자 살았다. 아빠를 그리워하는 딸에게 령은 말해주었다. “그래도 네 심장 속엔 아빠의 숨이 섞여 있단다. 우리가 나누어주었잖니….” 사춘기가 지나자 딸들은 그런 말로 더 이상 자신들의 심장은 뛰지 않는다고 했다. 령은 두 딸을 키우며 열심히 살았다. 아이들이 자라 결혼할 즈음에 령의 심장은 망가지기 시작했다. 령의 머리에도 언제 흰 눈이 내려앉기 시작했는지 어느덧 머리칼이 흰 폭설처럼 하얗게 변했다. 남자를 만나 결혼한 뒤 딸들이 찾아와 가끔 령의 가여운 손을 잡아주었지만 령은 짐이 되기는 싫었다. 혼자 집을 나와 살았다. 열심히 삶을 속여도 늙는 건 못 막았다. 밤이면 발이 차가워졌다. 밤이면 별이 차가워졌다. 그리고 눈물이 차가워졌다. 령은 이불 속에 누워 삶이 가여워서 웃어주었다. 다시 아침이 오면 살아서 웃음이 날 것이다.
령의 주검은 방에서 발견되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마지막 화장은 곱고 단정했다. 마른 쇄골은 빗물이 가득 고일 만큼 파여 있었다. 의사는 오열하는 가족에게 사람이 만들어질 때 심장이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니 심장이 자연스럽게 멈추어 죽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자연사라고 말해주었다. “보통 심장마비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희미하게 뛰는 것을 마지막까지 느끼며 갑니다. …행운이죠.” 딸들은 령을 화장하고 돌아와 유품을 정리했다. 그리고 얼마 뒤 히말라야 산에서 아버지를 발견했다는 편지를 한 통 받았다. 딸들은 털썩 주저앉아 그 자리에 멍하니 있었다. 얼음 속에서 아버지의 주검을 찾았다는 소식이었다. 40년 전, 령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떠날 때 그 모습으로 돌아온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딸들은 심장이 아파서 멈출 뻔했다.
김경주 시인·극작가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자두농사 청년’ 향년 29…귀촌 7년은 왜 죽음으로 끝났나

후쿠시마 농어·가자미…오염수 방류 뒤 ‘세슘137’ 껑충 뛰었다

‘도로 친윤’ 국힘…이철규 원내대표 밀며 “욕먹어도 단일대오”

“세빛섬 ‘눈덩이 적자’ 잊었나”…오세훈, 한강 토건사업 또?

민희진, 1년 전 “어도어는 내 음악·사업 위한 회사” 인터뷰 재조명

‘학생인권조례’ 결국 충남이 처음 폐지했다…국힘, 가결 주도

의대교수 집단휴진에 암환자들 “죽음 선고하나” 절규
![[사설] 세수 비상인데, 민생토론회 약속 이행이 우선이라니 [사설] 세수 비상인데, 민생토론회 약속 이행이 우선이라니](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23/53_17138642179283_20240423503260.jpg)
[사설] 세수 비상인데, 민생토론회 약속 이행이 우선이라니

‘빅5’ 병원, 주1회 휴진 대열 서나…서울대·아산병원 첫 줄에

이재명 “채상병 특검 수용” 공개 압박…‘윤-이 회담’ 최대 화두 됐다